-

-
셜록 홈즈 - Sherlock Holmes
영화
평점 :

상영종료

0. 숙취
신년회때문에 술에 진탕 빠진채 날을 넘기고 겨우 집에 들어왔다. 눈을 뜨니 아침 7시. 머리는 숙취에 띵하고 속은 메슥거리는 상황. 이럴 때 집에 있으면 하루종일 반사상태로 누워있으며 괴로워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에, 하여 움직이기로 했다. 해장국 대신에 영화로 속을 풀리라. 아내와 같이 보려했으나 아내는 어제 내 뒤치닥거리때문에 피곤하다며 혼자 보라고 한다. 아내의 TTL카드를 챙기고 홀로 극장에 가 영화를 봤다.

1.19세기말 런던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볼 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이다. 얼마만큼 그 분위기를 잘 표현했는가. 이야기의 밀도는 물론 캐릭터의 깊이 또한 영화는 활자를 따를 수 없다. 재현보다는 각색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영화는 활자로 질질 끌다시피 하는 시대 묘사를 화면으로 보여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면에서 내가 『셜록 홈즈』에 기대한 것은 캐릭터도, 추리도 아닌, 19세기 말(영화에선 타워 브리지가 거의 완성 직전이었던 걸로 보아 1890년 전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난 지저분한 런던의 분위기였다. 안개와 공장의 매연이 가득찬, 잦은 비가 내리며 하수구로 썩은 물이 흐르는 그 지옥같은 풍경. 물론 이런 거리묘사는 소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영화에서는 충분히 구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블랙우드경이 벌이는 그 초자연적인 공포는 세기말과 런던의 지옥같은 분위기와 겹쳐져 더 그럴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의 런던은 너무나 깨끗하고 게다가 맑기까지 하다.
1-1. 19세기말의 런던을 느낄 수 있는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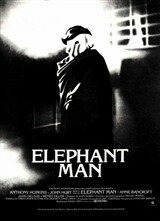
데이빗 린치 감독의 『엘리펀트 맨(The Elephant Man)』. 미국의 감독들에게 유럽의 이미지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데이빗 린치는 19세기 말의 영국을 공장의 매연과 증기가 뿜어져나오는 지저분한 거리,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갈고리에 매달린 돼지고기를 썰어 파는 생경한 곳으로 묘사했다. 그런 지옥도에서 희귀병을 앓고 있는 존 메릭의 절규 "난 동물이 아니에요! 난 사람이라고요!(I'm not an animal! I'm a human being!)"라고 외치는 것은 감동을 넘어 숭고함을 느끼게 한다.

또 다른 영화로는 팀 버튼 감독의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Sweeney Todd: The Demon Barber Of Fleet Street)』가 있다. 권력자의 음욕으로 부인과 아이를 잃고 복수심만 남은 스위니 토드. 그의 복수극 역시 지옥에서 행해져야만 한다. 팀 버튼이 그리는 런던은 '시체'와 '식인'이 가족을 잃은 한 가장의 복수심으로 한데 버무러진 지옥이다. 살이 발라진 희생자들의 피와 시취는 런던의 하수구를 흐른다. 영화는 시종일관 창백하고 음울하며 어둡다.
2. 셜록 홈즈와 왓슨
영화를 보고 신촌역을 지나 이대쪽으로 걸어올라왔다. 여전히 골치는 아프고 빈속에 힘이 겨워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와 머핀을 시켰다. 커피를 홀짝거리며 근처에 있는 Take-Out 잡지를 꺼냈다. <씨네21 736호>. 『셜록 홈즈』에 대한 글이 있다. 대충 훓어보다가 김연수 작가가 쓴 글에서 멈췄다. 긴 글을 감히 한 줄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이렇다. '나의 셜록은 이렇지 않아!' 영화를 보고 소설을 읽은(비록 전권을 다 읽지는 못했지만) 입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글이었다. 내가 책에서 읽은 셜록 홈즈 역시, 몸 보다는 머리로, 직감보다는 증거로 행동하는 '중후한' 캐릭터였으니까.
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닥 불만족스럽지는 않았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하는 셜록 홈즈가 지나치게 '알 파치노'스러워 보여 그렇지, 매사에 잘난척하고, 자신감 넘치지만 사랑 앞에선 한없이 조심해지는 멋진 캐릭터였다고 생각한다. 소설에서는 거의 내레이터에 불과했던 나약한 왓슨 또한,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파트너의 위치로 격상되었다(심지어 왓슨이 홈즈의 면상을 한 대 치기도 한다). 아이린의 등장은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홈즈의 책상에 그녀의 사진이 있는 것(아마 「보헤미아 왕국의 스캔들」에서 받았을!!), 그리고 그녀가 홈즈의 최대의 숙적(이자 2편의 악당으로 내정된) 모리아티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영화를 보는 동안 찾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었다. 대신에 악당 블랙우드 경은 카리스마가 부족해 아쉬웠고(히치콕 감독의 말을 인용하자면, "악당은 주인공보다 매력적이어야 한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너무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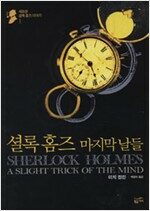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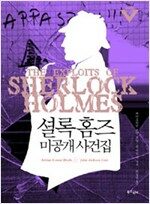
오히려 이 영화를 코난 도일 원작과 비교하기보다는 셜록 홈즈의 사후(?)에 붐처럼 출간되었던 안작소설(pastische)의 한 갈래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국내에 출판된 미치 컬린의 『셜록 홈즈의 마지막 날들』, 칼렙 카의 『셜록 홈즈 이탈리아인 비서관』, 존 딕슨 카와 에이드리언 코난 도일이 지은 『셜록 홈즈 미공개 사건집』에 이은 가이 리치의 『셜록 홈즈 영상소설』!!
2-1. 셜록 홈즈 파스타시

21세기의 셜록 홈즈가 (김연수 작가의 표현을 빌려) '성룡'이라면, 80년대의 셜록 홈즈는 '인디아나 존스'였다. 베리 레빈슨 감독의 『피라미드의 공포(Young Sherlock Holmes)』는 '만일 왓슨과 홈즈가 학창시절에 만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오직 팬픽에서나 볼 수 있을법한 이야기를 실제로 스크린에 옮겼다. 어린 시절 풋풋한 홈즈와 왓슨의 활약은 그당시 인기있었던 『구니스』와 『인디아나존스』의 영향력 아래 있어서 셜록 홈즈를 기대했던 사람들에겐 황망함을 안겨준 경우였을 것이다. 난 이 영화를 『영 셜록 홈즈』란 제목으로 86년엔가 봤는데(당연 비짜 비디오) 국내 개봉은 그보다 한참 늦었고, 제목도 셜록 홈즈와는 상관없는『피라미드의 공포』로 개봉했었다.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은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튀어나온 기사의 살인 장면! 가히 충격이었다. 한가지 특별한 것은 홈즈의 첫사랑 엘리자베스가 죽는다는 사실. 물론 엘리자베스는 영화에서 가공된 인물이지만, 이런 아픔때문에 후에 홈즈가 사랑도 결혼도 없이 홀로 사는 게 아닐까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데 써놓고 보니 제임스 본드 이야기같기도 하다. 하긴 인디아나 존스는 루카스와 스필버그의 007 이야기이기도 하니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7080 세대들에게 셜록홈즈, 왓슨, 모리아티 교수 그리고 허드슨 부인의 이미지를 완전히 각인시킨 작품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기획한 『명탐정 번개(名探偵ホームズ)』일 것이다. 『루팡 3세』, 『미래소년 코난』등에서 보인 삼각 구도를 셜록 홈즈, 허드슨 부인, 모리아티 교수로 펼쳐놓은 것도 신선했고, 미야자키 감독 특유의 액션 활극 또한 손에 땀을 쥐게 할 정도로 뛰어났다. 추리물은 아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해석이 신선했던 작품이다.
3. 감독
그런데 왜 하필 가이 리치가 감독했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더 재밌게 더 전복적으로 그릴 수 있는 영화가 너무 안전하게 그려진 느낌은 그의 연이은 실패 때문은 아니었을까? 속편은 좀 더 나가길 바랄 뿐이다.
4. 그리고 집
추운날 일찍 일어나 돌아다니니 술이 깨긴 커녕 외려 피곤하다. 들어와서 씻고 바로 잠들다.
5. 덧붙임
리뷰에도 알라딘 상품 넣기 기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갖다 붙이기 하려니 정말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