蝕
1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의 편이다. 아닌 척 할 수는 있어도 아닐 수는 없다. 모두를 위로할 순 있어도 결국 곁에 가서 함께 서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나를 둘로 쪼개 두 어깨를 다 결을 순 없다. 사실 우리는 이미 선명하고 벌써 명백하다. 그냥 그 위에 이런저런 덧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을 흐리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보존의 기술이고 동시에 사회보존의 기술이다. 꼭 필요한 아름다운 셈법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법은 아니다. 다음 장소로 가기 위해, 다른 장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발을 떼면, 반드시 그 발은 어느 한 군데로 디뎌지게 되어 있다. 그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 망설일 이유가 없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명백하고 벌써 선명하다. 충분하다.
2
가장자리부터 말라가는 것이 아니다. 말라가는 곳부터 가장자리다.
3
그 곁에 서고 싶다.




계속 살아가기로 했으니까요. 세상에 사랑이 부족하다고 살기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저는 다른 사랑을 발명했어요. 사랑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람이 적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혐오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혐오하는 사람들한테 우린, 소음이나 먼지나 비닐 같은 것밖에 안 되겠죠.
_ 윤이형, 「님프들」
새 길을 여는 시도는 항상 어떤 다른 길은 닫거나 잊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떤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항상 현실을 단순하게 만들 위험 또한 안고 있다. 그래서 분석하고 글을 쓴다는 것은 사유의 폭을 넓힘으로써 현실의 좁은 돌파점을 찾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돌파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세상은 꽉 짜여 있는지를 세밀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겹처진 시간의 리듬 속에서 다시 쌓아보고, 거기서 균열의 틈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_ 백승욱, 『생각하는 마르크스』
이런 잡문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순간의 열기로 휘갈겨 쓴 글들이 잠깐 동안은 그럴 듯하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내일이 되면, 아니 오늘밤에 벌써 상하고, 밍밍하고, 낡아 보인다. 그리고 항상 버려지고 마는 불에 익힌 붉은 대하 껍질과는 달리, 그 껍데기가 길을 가는 당신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_ 헨리 데이비드 소로, 『소로의 일기』
니체는 "다른 사람의 피를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 피로 쓰고 피로 말한 것을 책장을 넘기는 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책장이나 들춰보고 화면이나 스크롤하는 나 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다. 진리에 베인 적도 없으면서 진리란 날카로운 것이라고 폼 잡으며 말하는 사름들. 문구용 칼에 베여본 아이도 그것을 기억할 때는 얼굴을 찡그리는데,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아무런 통증도 없이 말해왔다.
_ 고병권, 『묵묵』
--- 읽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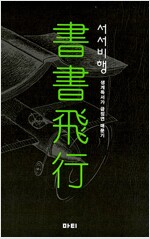


+ 작심 3일 파이썬 / 황덕창 : ~ 259
+ 서서비행 / 금정연 : 258 ~ 394
+ 타자와 욕망 / 문성원 : 77 ~ 168
+ 작은마음동호회 / 윤이형 : 233 ~ 354
--- 읽는 ---






- 생각하는 마르크스 / 백승욱 : ~ 107
- 왜 칸트인가 / 김상황 : ~ 153
- 프랑스 혁명에서 파리 코뮌까지, 1789~1871 / 노명식 : ~ 56
- 돈이란 무엇인가 / 에릭 로너건 : ~ 74
- 개념과 논쟁으로 배우는 통계학 / 심규박 외 : 169 ~ 311
- 지그문트 프로이트 콤플렉스 / 파멜라 투르슈웰 : ~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