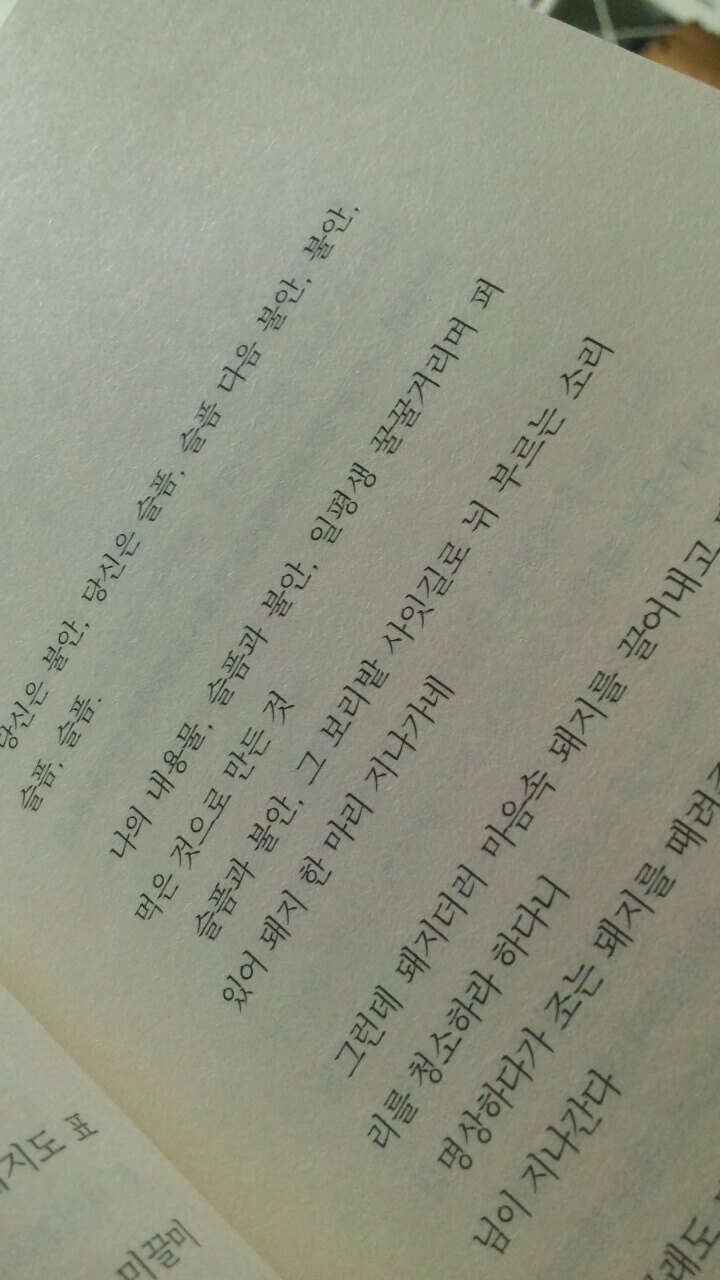남도의 비소식을 들으며 여기도 빗소리 좍좍 들렸음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긴 어중간히 내리다 말았다. 온 것도 아닌 아니 온 것도 아닌..차가 씻기는 것이 아니라
딱 더렵혀지기 알맞은 비.
아침 나절 도서관에 들렀다 가락시장에 가서 고들빼기를 사왔다.
고들빼기를 사려고 간 것은 아닌데 지나다가 눈에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지나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사오면서 엄청 후회...휴일엔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뒹굴거리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사다만 놓고..하루종일 뒹굴거렸더니 마음이 무겁다.
돈키호테와 나라의 심장부에서와 감정교육,
나는 고양이로소이다를 쌓아두고 멍 때리기
오랫만에 김혜순시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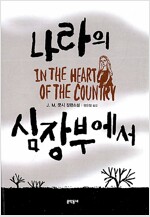
아버지가 오늘 새 부인을 집으로 데려왔다. 그들은 타조 깃털을 이마에서 휘날리는 한 필의 말이 끄는, 먼 길을 달려 먼지가 자욱한 마차를 타고 달가닥달가닥 평원을 가로질러 왔다. 혹은 이마에 깃털을 단 두 필의 당나귀가 끄는 마차였는지도 모르겠다. 그것도 가능한 일이다. 나의 아버지는 검은색 연미복에 실크 모자를 썼고, 신부는 챙이 넓은 모자에 가슴과 목이 끼는 흰 드레스를 입었다. 과장한다면 모를까, 그 이상은 묘사할 수 없다. 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늦은 오후에 나는 내 방에서, 덧문을 닫은 컴컴해져가는 선녹색 방에서 채을 읽고 있었가나, 어쩌면 편두통과 싸우느라 축축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누워 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나는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편두통과 싸우면서 방에 처박혀 지내는 사람이다. 식민지는 그러한 여자들로 가득하다. 하지만 나처럼 극단적인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아버지는 생기 없는 검은색 부츠를 신고 마룻바닥을 수없이 왔다갔다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제3의 인물이 잇다. 침대에 늦게가지 누워 있는 그의 새 부인.그들이 적이다. 6
<나라의 심장부에서 첫부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리뷰가 많아서 긴장했는데, 265페이지 밖에 안되고 시작 부분이 괜찮다. 다행이다....

178
무지함을 인간적인 거라고 천박함을 솔직한 거라고 여기고 있는 건 아닐까.
-------

때로는 진실이 아니라 견고한 거짓말이 관계를 지속시키기도 한다. 진실이 진심을 훼손시킬 때도 있다.
----
<그러나 불은 끄지 말 것>은 읽은지 꽤 되었는데 참 좋았던 기억으로 가끔씩 생각난다. 영화적 에피소드, 단상들 장면들을 옮긴 것 같은 감각적인 책이었던 기억.
<블로노트>의 '천박한 솔직함'과 <그러나 불은 끄지 말 것> '견고한 거짓말'이 짝으로 따라왔다.

내게 붙은 쿤은 내가 자랄 모습으로 자라났다.....그도 그럴 것이 이 몸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내가 아니라 쿤이었고, 나는 쿤의 등에 달라붙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팔로 쿤의 목을 감고, 두 다리를 쿤의 옆구리에 바싹 붙여 업힌 자세로 그녀와 한몸이 되어 살아왔다. 내 가슴과 배는 쿤의 널찍한 등에 단단히 엉겨붙어 있었다. 쿤은 나를 지탱할 만한 몸집이었으므로 뜯겨나온 건 쿤이 아니라 실은 나라고 해야 할지도 몰랐다.86
엊그제 '쿤의 여행'을 읽으며 울컥했다. 내 옆에 옆에 앉은 분도 울었노라고 이야기했고, 자기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는데 일정부분 나의 삶과 비슷했다. 원래 쿤만 있었고 나는 없었던 것 같은 나의 삶. 어느 순간 누가 쿤인지 나인지 모르게 되어버린. 지금의 내가 가장 행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