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를 생각한다
존 코널 지음, 노승영 옮김 / 쌤앤파커스 / 2019년 12월
평점 :

절판

#소를생각한다 #월든 #존코널 #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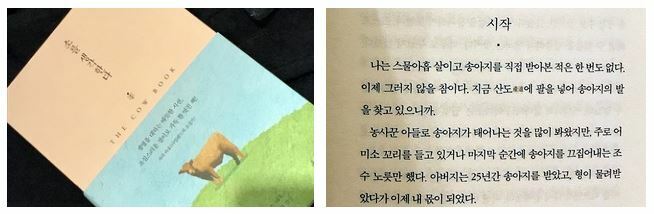
작가와 농사꾼 중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다. 둘 다 될 수 있다.
나는 농사꾼이자 작가이다. 320쪽
새끼소를 낳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산문은 마치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작가이자 농부)을 찾기 시작했음을 알린다는 점에서 탁월했다.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매번 아빠의 농장에 갈때마다 성별을 떠나서 무언가 보탬이 되고 싶기도 하고, 농장의 사계를 글로 적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주일만에 아빠와 다투고 돌아오던 때가 생각나서 였을수도 있다. 자식들의 변명들에 대해 그러면서도 부모님의 노고에 대해 격하게 공감하고 싶었던 그 마음, 이었을 것이다. 다행이면서도 부러운 것은 저자는 농장에 머물렀던, 이 책의 목차이기도한 1월부터 6월까지 착실하게 버텨낸 반면 위에 적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긴(?)기간을 버텨내지 못했다. 가장 길었던 것이 2주였는데 그마저도 중간에서 엄마가 정말 엄청나게(수식어가 늘어난다)고생하셨다. 도망치듯 떠나와 오히려 농장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구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저자와는 다른 나의 정체성(소설가를 꿈만 꾸고 있는 직장인)을 찾았으니 말이다. 이 책은 이처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흥미도와 공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을 떠나 그냥 재미있으면서도 배울 수 있고 또 공감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담았다라는 것이다. 가족 농장이 있는 곳은 아일랜드 시골이다. 즉 아일랜드의 문화를 알고 싶었던 사람들이라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은데 그것이 역사책에서 읽는 딱딱하거나 지나치게 랜드마크나 더블린 위주의 여행서도 아닌 그냥 정서자체를 읽을 수 있었다. 가톨릭 국가인 만큼 이야기 곳곳에 성서와 성호경, 그리고 생활속에 등장하는 성서를 비유로 드는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그들의 정서를 알 수 있었고 저자가 좋아하는 월든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사실 월든을 단순히 목가적인 삶, 미니얼리즘 측면에서만 보면 안되는 것이 순수한 노동과 장소는 전원일지라도 타인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성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녹여져 있다는 점에서도 해당 책을 읽었던 사람이라면 함께 봐도 좋은 부분이 있었다.
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인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소는 1만 500년 가까이 인류의 동반자였기 때문이다. 29쪽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 '소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소를 기르니까 당연히 육식을 찬성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소는 가축이라는 점에서 부인할 수 없고, 소를 먹는 식생활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몇 만년의 역사로 이어진다. 안타까운 것은 저자가 소와 관련된 책을 찾으려 했을 때 관련 자료가 없었던 만큼 우리는 먹는 소와 먹으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싶다. 소를 생각한다기보다는 자연을 위해서 혹은 내 몸, 결국 인간 자신을 위해 먹었던 소를 이제는 이유는 같지만 연구결과에 따라 먹지 말아야 할 소로 판단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또한 농장이 배경이다보니 글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생명의 숭고함을 여러 군데에서 느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가족에 대한 애정과 소중함도 베어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다. '소를 생각한다'는 다른 의미에서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한다'와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