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
로셀라 포스토리노 지음, 김지우 옮김 / 문예출판사 / 2019년 12월
평점 :



#히틀러의음식을먹는여자들 #문예출판사 #히틀러 #시녀이야기
비극적인 상황을 눈앞에 펼쳐보이듯 생생하게 표현할 때 격앙된 어조의 소설보다 차분하고 덤덤한 톤으로 별일 아닌 것처럼, 누구나 이런 일 한 번은 겪지 않느냐는 듯 말할 때 더 마음이 괴로워진다. 그야말로 누구에게나, 결국 내게도 그런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거란 생각때문이다. 소설<히틀러의 음식을 먹는 여자들>은 히틀러가 총통으로 있을 당시 음식으로 인한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 그보다 먼저 음식을 먹어야 했던 실제 생존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다.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쓰였으며 '로자'가 그녀를 대신 해 당시의 상황을 전해준다. 결혼한지 1년 밖에 안된 상태에서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고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어느 날, 그녀는 총통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끌려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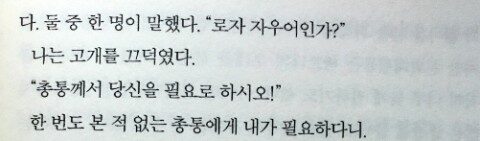
그곳에서는 자신과 같은 이유로 끌려온 열명의 여인들이 있고 그녀들은 전쟁중이라 음식이 넉넉하지 못한 때에 잘차려진 식탁앞에 앉는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히틀러의 음식을, 그를 죽음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은 온몸으로 거부하고 싶을 지경이지만 생앞에 무기력할 뿐이다. 로자는 여성의 삶이 그렇지 않은 때는 없었다고 말하지만 여성을 포함한 나약한 민초들의 삶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늘 그래왔다. 로자의 일은 살기위해 먹어야 하는 일이며, 그녀의 엄마는 먹는 다는 것이 죽음에 대한 저항이라 하였지만 지금 그녀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저항이었을까.
신은 존재하지 않거나 변태라고, 그레고어가 말했었다. 구역질이 또다시 맹렬히 온몸을 뒤흔들었다. 나는 히틀러의 음식을 토해냈다. 히틀러가 절대 먹지 않을 음식을 토해냈다. 목에서 새어나오는 듣기 싫은 신음소리는 내 목소리였다. 인간의 소리 같지 않은 소리였다. 내게 인간적인 면이 남아 있기나 할까? 208쪽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전시상황이며, 독재자의 음식을 먼저 먹어야 한다는 특수 상황이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로자의 삶이 완벽하게 낯설지가 않다. 일제강점기 때 살기 위해 일본인들의 비위를 맞춰야했던 사람들이나 한국전쟁 당시 피난중에 부부가 헤어져 휴전 후 물리적인 이유로도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인간의 본능을 탓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으나 새로운 가정이 있어 못돌아오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그녀의 삶이 아주 먼 곳에서 있는 일 같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연은 늘 그 위대함과 다정함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내겐 그 몇 달간의 기억이 별로 없다. 어느 날 크라우젠도르프로 향하던 버스 차창 너머의 잔디밭 사이로 솟아나온 보라색 토끼풀을 빼고는. 보라색 토끼풀을 보는 순간 나는 수도승 같은 일상에서 깨어났다. 봄이 온 것이다. 130쪽
이전에는 무조건 살아만 남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전쟁소설이나 영화를 볼 때면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하면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거라고. 하지만 정작 로자처럼 타의에 의해 공공의 적이 되버린 경우 대부분이 숨어살거나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기도 했다. 끝까지 그녀가 살아남아 있었던 것은 결국 그녀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을거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소설로라도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비극을 전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를 지켜주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한 또다른 의미의 타의적 생존이라 생각한다.

해당 도서는 출판사 가제본으로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