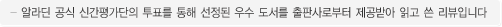[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 - 박찬일 셰프 음식 에세이
박찬일 지음 / 푸른숲 / 2012년 7월
평점 : 


'고독한 미식가'라는 일본 만화가 있다. 영업직이라 사람 만나러 돌아다닐 일이 많은 중년 아저씨가 일을 마치고 배가 고파지면 근처 식당을 찾아가 밥을 먹는 이야기인데, 슴슴하니 재밌다.
그런데 이 만화가 20여분, 11편짜리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드라마는 이야기 기본 구조는 같고, 메뉴는 좀 다르다. 아무리 먹는 내용이 주인 드라마래도 정말 어떤 다른 갈등이 거의 안 일어나고, 정말 식당에서 주문해서 맛있게 먹는다, 가 내용의 전부다. 그런데 이 삐적마른 주인공 아저씨가 정말 맛있게 먹는다. 메뉴도 일식, 중국식, 오키나와식(아, 이건 일식하고는 분명히 다르니까)까지 다양하다.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도, 궁금한 미스테리가 뒤에 풀리는 것도 아닌데, 한달음에 11편의 드라마를 다 봤다. 침을 꼴깍꼴깍 삼키며, 한 편이 끝나면 "빨리 다음 편!"을 외치면서.
다보고 나서도 그런 내 자신이 웃겨서 "아니, 남 밥 먹는 게 뭐 그리 재밌다고, 이리 열심히 보나." 했다.
<추억의 절반은 맛이다>도 그렇다. 박찬일이 참 글을 잘써...라고 생각했지만, 이번 에세이는 정말 최고다.
개그콘서트를 보고 한 주를 정리하며 이제 슬슬 잠들어야 하는 일요일 밤, 처음에 서문과 감사의 말을 읽었다. 감사의 말은 첫 문장부터 마음에 들어서, 옮겨 적으려하니 이건 통째로 옮겨야 할 판이다.
문학 속에 나온 먹는 이야기가 가장 끌려서 3부부터 읽기 시작했다. 읽은 책도 읽고, 안 읽은 책도 있다. 하지만 박찬일이 같이 읽어준 문학 속 음식이야기는 전혀 다르다. 그가 굴비 엮듯 이어가는 이야기들까지 한가득 침이 고인다. 움베리토 에코의 에코 타령은 썰렁한 스위스 개그지만 낄낄거리고 있다.
바로 2부로 정주행. '총은 놔두고 카놀리나 챙기게'라는 제목을 보고 어찌 책읽기를 멈출 수 있을까. 요리사가 시커먼 웍을 흔들어 밥알을 천장까지 솟을 듯 키질을 하며, 엄청난 화력으로 볶음밥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내일 점심은 볶음밥이다, 마음 먹는다. 다행히 난 화교들이 많이 사는 동네, 중국집 골목에 살고 있다. '볶음밥은 그래서 집에서 먹는 요리가 아니다.' 집에서 볶은듯, 비빈듯 만든 볶음밥은 진정한 볶음밥이 아니지. 아, 난 집밥 예찬론자인줄 알았더니, 진정한 프로들이 가득한 식당밥을 좋아했다!
이제 1부를 읽어야 한다. 읽을 수밖에 없다. 글이 얼마나 좋으면 1부에 배치했겠나. 거기에 2부에 나온 카놀리, 치즈, 랍스터, 토끼 고기, 캐비아, 바칼라, 할랄푸트는 구경해본 적도 없지만, 1부에 나온 음식은 알고 있다. 물론 박찬일이 말한 절정의 음식들은 아니래도 나름 내 추억의 맛이다.
세대도, 지역도 달라 마늘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다는 공통점밖에 없지만, 집안의 가장은 닭목을 아무렇지도 않게 비틀고 닭털쯤은 가볍게 뽑아야 권위가 섰을 그 풍경이 눈에 그려진다.
옆에 있는 짝꿍에게 "자기, 가장이라면 소는 아니래도 닭쯤은 잡을 수 있어야 되는거야." 강요한다. 아, 이런 허세 하나쯤은 완전 인정이다!
경양식집에서 고기랑 같이 먹기 위해 수프랑 샐러드를 남겨놨다가 뺏긴 경험...여전히 나중에 나온 고기랑 샐러드를 같이 먹고 싶고, 식전 빵을 파스타에 찍어먹고 싶은 나는 이젠 당당히, "그냥 놔두세요!" 하고 외치지만, 아줌마보다 더 당당했던 여고시절에는 못했다.
아, 이렇게 조르지 않는 애인이나 묵은 친구 하나 부산에 있어서 가끔 부산에 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글을 마지막으로 한 권을 한달음에 읽었다. 난 그런 친구 하나 있는데, 자랑스러워 하면서.
무슨 서스펜스 가득한 미스테리, 추리물도 아닌데, 가슴 두근두근 다음 책 장을 넘겼다. 빨리 자고 싶어, 하는 마음과 아,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두 마음이 이어졌다.
이제 내가 마주한 이 식탁에 추억이, 맛이, 이야기가 쌓일 것이다.
박찬일의 추억이 재미있고, 글도 좋았지만, 내 추억의 맛도 쌓고 싶은 욕심이 들게 하는 글이다. 아니, 하루 세 끼 밥 먹는 다른 사람들의 맛에 대한 이야기에 귀기울이고 싶은 책이다. 내가 먹는 밥상을 준비하는 주방장의 팔뚝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