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에 무슨 지난 여름날 이제 간다고 하는거냐. 고 할 지 모르지만,
밑에 지방은 30도 넘고, 에어컨도 키고, 자다가 더워서 깨고 그런다고 하니깐, 나는 아직도 반팔을 입고 다니며, 가디건을 꺼내야겠네. 생각만 하고 있으니깐.
근데, 이제 진짜 쌀랑해져서, 나는 밤에 풀무원 돌얼음을 오독오독 씹으며 책을 읽는 대신,
뜨거운 물에 마리아쥬 프레르의 캬라멜맛 나는 티를 타서 호호 거리며 책을 읽는다.

 드디어 읽게 된 마이클 쉐이본 (아주 오랫동안 마이클 카본이라고 맘 속으로 읽었던 이 남자) 의 소설이 하필 데뷔작이자 자전적 청춘소설이었다.
드디어 읽게 된 마이클 쉐이본 (아주 오랫동안 마이클 카본이라고 맘 속으로 읽었던 이 남자) 의 소설이 하필 데뷔작이자 자전적 청춘소설이었다.
그러나 하필 '피츠버그의 '마지막' 여름'이어서, 가는 여름에 읽기 좋았던 건지도.
6월, 7월, 8월의 여름에 질풍노도의 남자가 겪는 '여름 같은' 방황과 어지러움에 대한 이야기.
마이클 셰이본의 책은 닉 혼비 같기도 하고, 좀 너무 잘 짜여져서 매력 없는 닉 혼비. 천재과기보다는 노력과인 것 같아, 감동적이다. 라는 마음 보다는 잘 썼네.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른 작품들이 궁금한 정도이기도 하고.
잠시 후 나는 이 모든 것에 진저리가 난다고 느끼며 침을 탁 뱉고는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곧바로 나는 수치심을 느끼면서 신성을 모독하기라도 한 것처럼 입을 가렸다. 그 순간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강한 욕망이 밀려왔다. 나는 해가 뜨는 대로 비행기를 타고서 한때 아서가 그랬던 것처럼 멕시코로 날아간 뒤 자그마한 분홍색 호텔에 머물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고 싶었다. 아니면 이탈리아의 허물어져 가는 저택에 터를 잡고서 눈부신 오후의 햇살 아래 잠을 자고 싶었다. 북아메리카 횡단 열차를 타고 황량한 곳으로 사라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서 매춘부와 바텐더 외에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발신인 주소를 적지 않은 엽서를 보내리라. -352-
아련아련하다. 60년대에 20대인 벡스타인의 이야기.인데, 그 심상만은 2000년대 20대인 하이드의 이야기라고 해도 ..
침을 탁 뱉으며 이 여름이 빨리 지나가기를 나는 30대인 지금에도 바랬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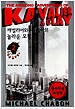




뒤늦은 '여름 휴가'까지도 이제는 모두 다녀왔을테고 ..
회사 다닐 적, 난 늘 남들 다 다녀온 8말에서 9초에 여름휴가 날짜를 잡아 느즈막히 다녀오곤 했다.
코끼리 아빠는 물쇼 때문에 피곤해서, 맨날 집에서 드르렁 드르렁 푸우- 자느라 얼룩말네도 가고, 하마네도 가는 여름휴가를 가지 못했다.
아기 코끼리들과 엄마 코끼리는 아빠 코끼리의 최선을 다한 잠(?)에 날려서(?) 해수욕장으로 가게 되는데 ..
그렇데 뒤늦게 가족은 여름 휴가를 즐기게 되는데 ...
 끈끈한 여름이여 안녕,,
끈끈한 여름이여 안녕,,
로사 몬테로의 <데지레 클럽, 9월 여름> 의 제목이 9월 여름인 걸 보면,
9월이 여름같이 느껴졌던 건 나 뿐만 아니고, 여기 뿐만 아닌가 보다.
망하고, 퇴색된 데지레 클럽에서 볼레로를 부르고,
끈끈한 땀에 뒤범벅이 되어 섹스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니깐, 이제 끈끈한 여름도 안녕.
그러고보니, '습도'를 사람 사이의 온기라고 부르는 <갤러리 페이크>의 후지타가 있었는데 ..
사람 사이의 온기인지, 아스팔트 바닥과 나 사이의 온기인지 .. 쨌든, 끈적거리는 여름은 간다.
여름의 끝을 잡고 읽었던 책들은 위의 <피츠버그의 마지막 여름>과 <스티브 잡스처럼 프레젠테이션 하기>,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뭔가 이 두 책 다, 감동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읽다보면 울컥한다.
뭔가 이 두 책 다, 감동스러운 면들이 있어서, 읽다보면 울컥한다.
처칠의 평전이야 그렇다치고, 스티브 잡스 프레젠테이션은 왜?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드라마틱한 프레젠테이션은 그 현장의 현실왜곡장에 있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만으로도 감동스럽다.
서재 대문에 stay hungry, stay foolish 라고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축사의 가장 유명한 헤드라인을 옮겨 놓기도 ...
워낙 유명한 축사라서 동영상으로 이미 봤지만,
3의 법칙, 헤드라인 강조, 등의 잡스식 프레젠테이션 법칙을 알고 나서 봐도, 그 어떤 것도 손상시킬 수 없는 잡스느님의 위엄.
다시, 새삼, 와닿는다.
처칠의 이야기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던 부분은 24장 '정치는 인생 그 자체' (25장이 마지막) 챕터였다.
그야말로 몸을 불사르며 전쟁과 평화의 물결을 헤쳐나온 불굴의 의지, 그 자체인 처칠.
1차 세계대전때의 그의 역할, 2차 세계대전때의 그의 역할, 전쟁이 끝나고 유럽 평화와 소련을 제지하는 그의 역할 ..
그렇게 몸과 마음과 주변 사람들 마저도 연료로 불살랐는데, 일흔이 넘도록 그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몇 가지 이유로 그의 은퇴는 미루어졌다. 첫째, 세상에서 유일하게 은퇴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클레먼타인은 수년 전부터 그가 은퇴하기를 바랐고 지금은 주위 사람들도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정치는 남편에게 인생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기에 차마 은퇴하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8년 후에 처칠이 의원직을 그만두어야 할 때에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둘째, 그는 여전히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분한 근거를 얻을 만큼 무능하지 않았다. 셋째, 클레먼타인이 설득할 생각이 없고, 여왕이 헌법적으로 압력을 가할 수 없으며, 당에서도 밀어내기에는 매우 중량감 있는 상징적인 영웅이었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내릴 사람은 본인뿐이었다.
한직으로 물러났던 30년대 쇠약해졌던 처칠, 그리고, 그렇게 두 발 전진 전에 한 발 퇴보할 때마다 급격히 쇠약해지고, 일을 할 때 생명력이 불타오르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차올랐던 생명력이 연기처럼 그에게서 빠져나갔던 처칠.
처칠의 평전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그 중에서, 그의 인생의 첫번째 전기인 클레먼타인을 만나 결혼하고, 평생동안 처칠이 처칠일 수 있게 내조를 했던 현명하고, 처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클레먼타인. 그런 그녀가 평생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처칠에게 그가 이미 물러나야할 때임을 알면서도 은퇴하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심정과 위대한 영웅의 마지막이 이 건조한 평전의 건조한 몇 줄에서 뭔가 절절하게 와닿았다.
처칠은 다시 이런 사람이 나올까 싶은 '위대한' 이란 형용사가 가장 잘 어울리는 '영웅' 이라는 말이 제 옷처럼 딱 달라붙는 위인이었다.
그와 같은 영웅은 앞으로 나오기도 힘들 것이고,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현대의 히어로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잡스' 그의 카리스마와 명연설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의 영웅과 오버랩되었다. (실제 명연설가로서의 처칠의 이야기가 이 책에 언급되기도 한다. )
무튼,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는 여름의 끝자락을 보냈고,
추석때 주문하면, 25일날 오는구나 하면서, 이런 책들을 주문했고, ( 이 중 두 권은 바로드림)





눈에 띄는 신간들 중 이런 책들을 장바구니에 다시 담았다. (인생은 장바구니 비우기~ 어디서 왔다가~(보관함에서 왔다가) 어어디로~ 가느은가~ (내 방에 차곡차곡 쌓이겠지)



 엑박 ;;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엑박 ;;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야구도 하고, 가을독서도 하고, 하늘은 높고, 말과 나는 살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