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의 포스팅이 책잡담과 리뷰이던 때가 있었지... (라고 하니, 꽤 오래전인것 같지만, 아마 한 달을 넘지는 않았을게다.)
좀 안정이 되고 나니, 책이 손에 잡힌다.. (혹은, 책짐에 눌려보니, 이 웬수같은 것들을 빨리 읽어치워야지 하는 마음이 커진 것일수도.)
이사 오면서 인터넷 안 되는 와중에서도, 신간 체크는 매일 했다.
사당 반디에 서식했더랬는데, 잠실 교보에도 정 붙이게 될까?
오늘 반가운 신간이 나와서, 이야기할겸 밀린 책잡담을 해보려고 한다. (사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간 신간이 좀 덜나오기도 했다. )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어렵게 원서로 구해서 쟁여두었는데, 황금가지의 환상문학전집에서 나와주었다. 환상문학전집 정말 페이스 빠르게 신간 나온다.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책들이 꾸역꾸역 나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환상문학전집의 리스트는 장르문학 전집 시리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딱히 수상작이라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장르 보다 '문학'에 방점을 둔, 문학성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로버트 하인라인의 <달은 무자비한 밤의 여왕> 어렵게 원서로 구해서 쟁여두었는데, 황금가지의 환상문학전집에서 나와주었다. 환상문학전집 정말 페이스 빠르게 신간 나온다. 잘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책들이 꾸역꾸역 나와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환상문학전집의 리스트는 장르문학 전집 시리즈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딱히 수상작이라거나 그런건 아니지만, 장르 보다 '문학'에 방점을 둔, 문학성 뛰어난 작품들이 많다.


 하인라인의 작품들은 마초적이고, 하드보일드다. 내가 딱히 SF 매니아는 아니지만, 하드보일드와 닿아 있는 로저 젤라즈니나 로버트 하인라인의 작품들은 찾아서 읽는 편.
하인라인의 작품들은 마초적이고, 하드보일드다. 내가 딱히 SF 매니아는 아니지만, 하드보일드와 닿아 있는 로저 젤라즈니나 로버트 하인라인의 작품들은 찾아서 읽는 편.
<스타쉽 트루퍼스> 같은 작품은 조 홀드먼의 <영원한 전쟁Forever War>와 함께 읽으면 좋다. (반전소설로 유명한 <영원한 전쟁>과 그 반대에 서 있는 로버트 하인라인. 조 홀드먼은 그의 작품에 <스타쉽 트루퍼스>의 영향을 많이 받음)
 마크 기로워드 <도시와 인간>
마크 기로워드 <도시와 인간>
영국 출신 건축학사 마크 기로워드가 중세부터 현대까지의 도시문화사를 정리하였다.
만만찮은 가격이긴 한데, 요즘 임석재의 <건축,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읽고 있다보니, 그 좌절감과 허공향한 메아리가 끕끕스러워서라도, 이 책이 더 눈에 들어온다.
뉴욕의 모든 초기의 고층빌딩은 최대한의 상업적 수익을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설계되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신문사, 전신회사들의 본사 건물 등이 그러했다. 이 회사들은 각자 경쟁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들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거나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높은 층수, 화려함, 인상적인 실루엣이 가지는 가치를 알고 있었다. 뉴욕에서 마천루의 광고 효과는 계속해서 중요성을 띠어갔다. 1902년에 세워진 싱어 빌딩, 1911년에 세워진 울워스 빌딩, 1930년에 세워진 크라이슬러 빌딩의 실루엣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p.504 '미국과 마천루의 탄생' 중에서

 역시 영국출신 필자 존 리더가 쓴 CITIES(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도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꺼내봐야겠다. 임석재의 <건축, 우리의 자화상>은 외면하고 있던 이 도시의 쓰레기같은 건물과 그 건물이 나타내는 탐욕을 끄집어낸다. 잔잔한 흙탕물을 휘저어봤자, 쓰레기들이 와글와글 떠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가라앉고, 쌓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넓혀서, 마크 기로워드나 존 리더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치유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영국출신 필자 존 리더가 쓴 CITIES(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도 이쯤에서 다시 한 번 꺼내봐야겠다. 임석재의 <건축, 우리의 자화상>은 외면하고 있던 이 도시의 쓰레기같은 건물과 그 건물이 나타내는 탐욕을 끄집어낸다. 잔잔한 흙탕물을 휘저어봤자, 쓰레기들이 와글와글 떠올랐다가, 다시 그대로 가라앉고, 쌓일 뿐이라는 자조적인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시야를 넓혀서, 마크 기로워드나 존 리더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치유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과 그림그리기 재주가 꽝인 것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나오면, 늘 혹한다. 미리보기를 보고, 토끼를 따라 그려보며, 사고 싶은 마음을 달래본다. ^^; 근데, 정말 쉬워보인다!
그림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과 그림그리기 재주가 꽝인 것의 괴리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책이 나오면, 늘 혹한다. 미리보기를 보고, 토끼를 따라 그려보며, 사고 싶은 마음을 달래본다. ^^; 근데, 정말 쉬워보인다!
<지금, 한국의 북디자이너 41인> 4만원대의 가격이다. 이 책을 살 바에야 북디자인을 보기 위한 멋지구리한 사고 싶은 책들이 한두권이 아닌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자기들만의 잔치'(딱히 나쁜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다) 로밖에 안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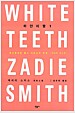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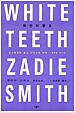 제디 스미스의 <하얀 이빨> (제목을 뭘로 검색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는데, '하얀 이빨'이었어'')
제디 스미스의 <하얀 이빨> (제목을 뭘로 검색해야 하나 한참 고민했는데, '하얀 이빨'이었어'')
도 나오자마자 반가웠다. (한참 이사중에;) 이 책이 나왔을때, 마침 런던에 있어서 호텔방에서 읽었던 기억. on beauty나 번역되어 나오지, 췟

 '일상 = 예술'의 공식을 추구하는지라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역시, 나오자마자 책레이다에 잡히기는 했으나, 뭐, 일단 책정리가 대충이라도 끝날때까지는 당분간 보관함에 담아둘 예정이다.
'일상 = 예술'의 공식을 추구하는지라 <일상, 그 매혹적인 예술> 역시, 나오자마자 책레이다에 잡히기는 했으나, 뭐, 일단 책정리가 대충이라도 끝날때까지는 당분간 보관함에 담아둘 예정이다.
* 덧붙임
알라딘 외서이벤트의 사심에 학을 땐 그 시점 이후로 (그것과 상관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맘에 무지 담아두는 나는 기회 있을때마다 언급), 알라딘에 정 떨어지고, 사심을 버리게 되었는데,
서비스가 무지 좋아졌다. 내가 그간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득을 봤다면,
최근 어느 시점 이후로, 블랙리스트 오브 블랙리스트로 등극한 것 같다.
4년간 알라딘을 남보다 무지하게 많이 (일주일에 4일은 보던 전동네 알라딘 택배 아저씨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 회사로 배달시킬때는 택배기사들 사이에서 '소공동의 김선영'이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 돌 정도였;)
이용하던 나에게, 몇가지 상당히 심증 가는 그간 없었던 서비스들이 눈에 띈다.
사심으로 '애써' 나를 배제한 알라딘에 이제 더 이상, 지적질하는 심신 피로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시점이다보니,
묘한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