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성애소설은 연애소설과는 명백히 다르다. 소재-주제의 특성상 때론 겹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들 아시겠지만,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다. 꼭 서로 사랑한다고, 사귄다고 같이 자는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같이 잔다고(즉 한다고) 해서 다 사랑하고 사귀는 사이인 것도 아니다. 그래서 따로 한 번 빼서 묶어보면 어떨까 한다.
1번. 정말 자신 없는데 <데카메론>이 아니었나 싶다. 더 정확히, 이 책에 그런 이야기가 많지 않았나 싶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대학 초년 시절에 읽었던 책의 기억을 확인해보고 싶다.


그 다음, 쇼데를로스 드 라클로, <위험한 관계>.


대학 시절에 무척 재미있게 읽은 소설인데, 나이 들어 다시 보니 왜 '고전/걸작'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는지(도) 보이는 소설이었다. 인물들이 재미있고 스토리도 워낙 박진감 있어,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다. 18세기 계몽주의를 기치로 내건 프랑스 귀족 사회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길티 플레져'의 진면목을 알 수도 있다. 서간체(고백체의 변용으로서) 소설의 매력도 돋보인다.

주인공 발몽을 제목으로 내건 이 영화. 메르테유 남작(후작?) 부인 역은 점잖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인 아네트 베닝이 맡았다. (미모 돋았던 듯^^;;) 그 다음 발몽은 콜린 퍼스. 그가 정말로 사랑하게 된 ??부인(대법원장 부인이던가) 역을 맡았던 여배우와 결혼, 아이를 낳기도 했다.(나중에 이혼하고 현재의 이탈리아 모델을 만나 결혼, 역시 아들이 둘인 걸로..^^;;)

이 영화의 원작이 <위험한 관계>인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번안에 가까운 개작이지만 줄거리의 얼개는 거의 그대로. <스캔들: 조선남녀상열지사>의 원작도 이것.

19세기, 성애문학 하면 누구나 떠올릴 법한 소설이 <보바리 부인>이지만, 사실 이 소설은 차라리 '반'성애문학에 가까운 듯하다. 더 적합한 작품은 정녕 '-부인' 시리즈에 가까운 <채털리 부인의 연인>. 사실 주제만 놓고 보면 '사랑에 살어리랏다~'일 터인데...^^;; 여기서 우리가 까먹는 것이 '레이디' 채털리가 자기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거다. 이미 임신까지 한 상태. 올리버가 뭐 갖고 먹고 살래? 하고 물으니, 그녀의 답이 바로 이거다. 애초에 '레이디'로 자랄 만한 집안에 태어나야(혹은 스스로 그 정도 자금은 마련할 수 있어야), 사랑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나이 드니 보이는 대목이다.




내가 본 영화 <채털리...> 속의 레이디 채털리. 워낙에 정사 장면이 많아서 여배우가 어지간히 기품이 느껴지지 않으면 포르노그래피처럼도 보일 법하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참 예뻤다 ^^;; 그녀가 올리버에게 느끼는 애욕-사랑 역시 참 예뻐 보였다.
20세기, 아마 소설로서는 이제 잘 읽히지 않는 듯하다. 헨리 밀러, <북회귀선>.


저 포스터 속의 여인. 금발보다는 흑발(갈색), 장신보다는 아담한 체구를 좋아해서, 마리아 드 메데로이스(?)가 우마 서먼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듯하다. 그녀는 <펄프 픽션>에서 브루스 윌리스(부치(?))의 여자친구 역을 맡기도 했다.

위의 <채털리...>를 너무 저속하고 노골적이라는 이유로 비난했던 나보코프의 <롤리타>는 어떤지. 작가는 이 소설을 성애소설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또 실제로도 '성애' 장면이 많지 않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험버트는 롤리타를 사랑하지만 롤리타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많이, 잘, 될 턱이 없지 않나.


마땅히 성애소설이 아닌 다른 부류로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지만,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떠올려 본다. 이 소설 자체만 놓고 보면 철학-에세이 소설에 더 가까울 법하지만, 이후 쿤데라가 쓸 소설(가령, <불멸>)에 비하면 성애 묘사가 정말 너무 많고 또 노골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토마스의 화두가 '바람/바람둥이'이니까. 서사적 바람둥이, 서정적 바람둥이 등등.



목록은 물론 좀 더 보충될 수 있을 법하다. 우리나라 소설 중에서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효석의 작품 중에서 골라야 하지 않나 싶다. 단, '성애' 부분을 쏙 뺀,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 실린 <메밀꽃 필 무렵>은 빼고 ^^;; 혹시 <동백꽃>도 넣어야 하나?^^;; 마지막 장면이 너무 '야하니' 원고를 쓰지 않으면 어떻겠냐는 권고까지 받은 적이 있는 작품이다, 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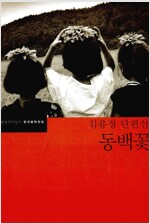
*

지난 9월 중순, 아이의 지능검사 결과지를 들고 대학병원 주치의를 찾아가던 길, 버스 창문 밖으로 이런 걸 보았다. 부동산과 충무김밥과 콘택트렌즈와 나무 사이에 조그맣게 박힌 'SEX TOY'. 한때는 나도 무척 관심을 가졌던 주제이다. 문학이든, 영화든, 심지어 내 삶에서든. 지금은 그 주제로부터 너무 떠나와, 역시나 그 주체와 객체가 나였나 싶을 정도다. 무심코, 저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아이와 나, 우리 가족의 미래가 너무도 아뜩해서, 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의사와 면담을 끝낸 다음에는 수업을 가야 했기 때문에, '섹스'도 '토이'도 원래 그런 단어들이 풍기는 '음담패설' 특유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했다. 진정한 불감증, 이랄까. 그 와중에 섹슈얼러티와 문학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대충 지금 잠깐 휘갈긴 내용이다. 언제 다시 이 주제로 회귀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마는, 정녕 너무 늙어 오직 지적인(!) 차원에서만 가능할 법하다. 심지어 정사 장면 하나 묘사하기도 힘들다. 뭐든지 다 때가 있음을 절감한다. 청춘들이여, 사랑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