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과 혁명의 시: <닥터 지바고>
겨울방학이다. 지난 반년 동안 방치해둔 번역원고 파일을 연다. 겨울에 잘 어울리는 소설, 파스테르나크(1890-1960)의 <닥터 지바고>(1957: 이하, <지바고>)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마뜩치 않은 구석이 많지만 독자의 눈으로 보면 역시 20세기 러시아, 즉 소련 소설 중 가장 사랑받을 만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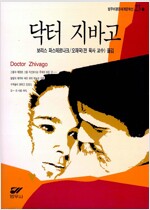


<지바고>는 시대적으로 1905년 피의 일요일 사건, 두 혁명(1917년 2월 멘셰비키 혁명, 10월 볼셰비키 혁명)과 내란, 부분적으로 양차 세계 대전을 아우른다. 이 보편의 역사와 맞물려 유라, 토냐, 라라, 파샤 등 주인공들의 삶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된다. 의사가 된 유라, 즉 유리 지바고는 많은 시간을 시를 쓰는 데 할애한다. 그의 삶을 침범한 역사적 사건에는 대체로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한다. 사생활 역시 그러한데 아내(토냐)를 사랑함에도 ‘빨간 마가목 열매’, 즉 라라를 그리워한다. 역사와 사랑의 딜레마 앞에 선 그는 스스로를 ‘햄릿’, 정확히 햄릿 역을 맡은 연극배우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편, 라라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숭배해온 파샤(안치포프-스트렐니코프)와 결혼하지만 혁명과 내전 중에 거듭된 해후를 통해 지바고와 비극적인 사랑의 인연을 맺게 된다. 철도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샤의 운명은 더 절절하다. 구시대의 악을 척결하기 위해 그토록 사랑한 가족까지 내팽개치고 혁명에 뛰어든 그는 이후 토사구팽의 논리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된다. 그의 자살, 특히 바르이키노의 하얀 눈밭을 물들인 붉은 피는 혁명(이상)과 정치(현실)의 양립불가능성을 시적으로 보여준다. 하나같이 선과 미의 육화인 ‘젊은 그들’ 옆을 맴도는 ‘늙은’ 변호사 코마로프스키는 봉건제의 악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악역이 아니다.
모스크바의 유대계 예술가 집안에서 태어난 파스테르나크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인텔리겐치아의 전형이자, 소설가가 아닌 시인이었다. 무엇보다도 타고난 귀족적 성품상 소련이 요구한 과격한 이분법적 세계관과는 잘 맞지 않았다. 동반자 작가인 그가 스탈린의 저 악명 높은 숙청을 면한 것은 ‘조용한 광기’, 아니 ‘광기의 조용함’ 덕분이었으리라 짐작된다. <지바고>가 소련도 아닌 이탈리아에서 처음 출간되어 이듬해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결정, 냉전시대의 역학관계에 힘입어 물의를 일으킨 지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이 소설은 어쨌거나 문학사의 심판을 거쳐 살아남았다.



(최근에 나온 '사람들과 상황'은 두 단어가 어차피 다 복수니까 그냥 '사람과 정황(혹은, 상황)'으로 번역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덧붙여본다.)
1988년을 전후한 언젠가, 두 동생이 잠든 늦은 밤에 <지바고>를 읽었다. 애지중지한 빨간색 라디오에서는 데이비드 린의 영화 <지바고>(1965)에 삽입된 ‘라라의 테마’가 흘러나왔으리라. 지바고와 라라의 피난처처럼 쥐가 들끓는 단칸방에서 이런 소설을 읽는다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참을 수 없이 문학적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적 망명’에 처해진 시인이 쓴 소설을 무명의 아줌마 소설가가 번역하고 있는 이 정황 역시 그렇지 않은가. 그러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책이다.
-- 서울대동창회보: <나를 움직인 책 한 권>

쓰기는 저렇게 썼지만 죽을 맛이다. 정말 죽도록 하기 싫어서, 그런 느낌이 들 여유가 없도록 죽도록 달리고 있다. 대략 12월부터 다시 시작, 아이 없는 시간에 죽도록 매달려그래도 꽤 많이 왔다. 말하자면 1차 초고는 오래 전에 나왔고 지금 작업은 2차초고(즉, 어지간히 쓸 만한 초고)를 만드는 것. 올 겨울, 더 욕심 내면 1월까지 쫑~하고 봄-여름에 최종 작업 하는 것이 목표이다.
-- 흠, 이렇게 쓰고 보니 유치원생의 <방학계획표>(--_-;;;) 같은 느낌이 든다.
- "일찍 자요 ~ 일찍 일어나요~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골고루 많이 먹어요~"
다시금, 정말 죽도록 하기 싫다. 번역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제발 나에게 다른 일감을 달라. 앗, 다른 일감을 만드는 일 역시 내가 할 일. 계속 바쁘다고 하다 보면 정말 바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바쁠 일이 뭐가 있나. 나는 바르이키노를 달리는, 썰매 끄는 말이 아니다! 차라리 <죄와 벌>에서 두들겨 맞는 늙은 암말에 가깝나?? -_-;;
"올해가 러시아 혁명 100주년 되는 해니 (<지바고> 번역을)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거다", 라고 한 선배가 충고해주었지만, 얼마나 고색 창연한 이름인가, 혁명이라니. '혁명'보다는 차라리 버락 오바마의 퇴임연설이 '사랑과 시'처럼 와닿는다. 미셸, 말리야, 사샤~^^;;
사족. 홍상수와 김민희. 애 키우는 아줌마로서야 , 또 건전한 상식과 윤리를 가져야 하는 사회인-생활인으로서야 '버럭~'이지만,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들의 '사랑과 시(영화)'가 참 부럽구나. 신작도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