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란의 신작 소설집을 샀고, 반 정도 읽었다. 재미있다. 헐, 내가 그녀의 소설을 재미있게 읽다니 뜻밖이다. 왜 그런 작가 있지 않나, 별로 재미 없다고 툴툴 대면서 간헐적으로 자꾸 책을 사고 또 읽게 되고 또 투덜대곤 하는. 조경란도 내겐 그런 작가인데, 이번 소설은 어딘가 발랄하다 못해 껄렁(?)해보이는 낯선 출판사, 화사한 삽화 등을 감안해도, 그저 소설만으로도 재미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얘기를 바꾼(혹은 그 후일담) 이야기, 아버지가 토끼로 변한 이야기 등 다 좋다.



내가 이번에 그녀의 소설책을 산 것은, 위에서 잠깐 구시렁댄 습관 때문이기도 하고, 짧은 소설(엽편 소설, 장(손바닥)편 소설, 콩트)을 읽고 싶어서였다. 장르는 곧 영혼의 형식. 긴 것이 맞는 작가도 있고 짧은 것이 맞는 작가도 있다.
가령, 체호프는 정말로 한 장짜리 소설로 문학사에 입문했다. 그리고 참 잘 쓴다! 하지만 도-키와 특히 톨스토이의 후예로서 그가 느낀 열등감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긴 소설을 써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때론 (거의 명백히 실패작인 ㅠ.ㅠ) 중편(요즘 개념으론 경장편)을 쓰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뭔가 길어질 때, 구구절절이 늘어질 때 그에게 적합한 장르는 소설(산문)이 아니라, 바로 드라마, 즉 희곡이다. 그 희곡을 그는 항상 희극-코미디로 완성하고자 했다. 몇 번 말한 것 같은데 나는 그의 <벚꽃 동산>을 무척 좋아한다.



짧은 소설이 제격인 또 다른 작가는 물론 카프카와 보르헤스이다. 그들에 대해 많이 썼지만, 언젠가 지면이 주어지는 대로 또 쓰고 싶다. 그런데 카프카는 자기 주제를 좀 몰랐던 것 같다. 장편을 쓰려 하다니! 물론 이 주제를 모름에, 바로 그의 문학의 핵심(고뇌^^;;)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실패한, 이라기보다는 미완의 장편 세 편('고독' 삼부작')은 그의 문학의 딜레마를 여실히 보여줄 법하다. 언제 또 다시 탐독할 기회가 오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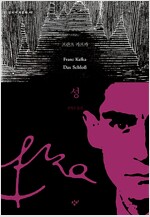

그에 반해, 아르헨티나의 귀족 가문 출신인 보르헤스는 일찌감치 '체념'을 문학으로 승화한 듯하다. 굳이 장편을 쓸 필요도 못 느꼈을 법한데, 그가 문학을 통해 추구한 세계는 기본적으로 서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구질구질 할 말이 별로(전혀) 없었던 듯. 그러니 그토록 황량한 것이다. 또한 구질구질함이 없으니 유머와 위트도 없는 것이다.



애매하긴 하지만, 카뮈에 대해서도 나는 장편이 잘 맞지 않는 작가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제일 아끼는 그의 소설 <이방인>도 사실, 분량이든, 구성이든 전통적 의미의 장편은 아니다. <페스트>가 좀 두껍긴 하지만 워낙에 관념적이고 이념적이서, 역시나 서사에 기반한 정통 장편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에세이적 장편이랄까. <전락>은 도..키의 <지하>의 카뮈 버전이니 더 말할 것도 없겠다.
많은 부분, 그는 (철학자, 사상가라고 하긴 그렇고) 고급한 에세이스트였던 듯한데, 초기(아마 첫?) 산문집 <안과 겉(밖)>(<표리>라고 번역된 적도 있는 듯하다)부터 이런 재능이 보인다. 나중에 <시지프 신화>, <반항인>에서 더 잘 쓰게 된다.



어딘가 날렵한 재능 덕분에 카뮈의 단편도 다 재미있게 읽은 기억이 있다. 덧붙여, 그는 희곡 <오해>를 쓰기도 했다. 극작을 향한 끌림, 이 또한 흥미롭다. 그만큼이나 흥미로운(또한 이해가 되는!) 끌림이, 무대에 서서 연기를 하고자 하는 끌림이기도 하다. 까뮈는 워낙 인물이 출중했던 터라, 도-키의 <카라마조프>를 무대에 올리며 이반 역을 맡기도 했다.



짧으나 기나 다 잘 쓰는 징그런 작가도 있다. 아무래도 사랑할 수 없는 그대, 톨스토이다.



어쩌면 천만다행으로 이런 거물은 한 나라의 문학사에서도 자주 나오지 않는다. 그 이전의 한 작가는 장편을 써가는 도중에 반쯤 광기에 사로잡혀 단식을 시작, 거의 스스로를 체계적으로 굶겨 죽였다. 그의 장르 역시, 그로테스크하고 환상적인 단편(중편)이었던 듯. 큰 장르를 감당하지 못한 작가의 딜레마와, 시작은 했으되 끝나지 못한 이 장편(<죽은 혼>)의 미학이 맞물린다. 차라리 극작이 장편보다는 더, 그를 '구원'했을지도.



러시아와 비슷한 '대륙적' 스케일, 심지어 한 시절 사회주의 국가였던 중국. 루쉰은 고골의 <광인일기>에 영향을 받아, 사회 비판적 요소가 농후한, 심지어 거의 그것만 있는 <광인 일기>를 쓴다. 아무래도 나는 러시아문학 전공자라 고골의 소설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인다. 그의 단편들을 쭉 일별하며 많은 감동을 받았지만, 워낙에 지식인, 투사, 사상가 등 다른 이름이 많은 터라 루쉰은 좀처럼 소설가로는 기억되지 않는다. 하긴 이런 요소까지 포함하여 그는 소설가이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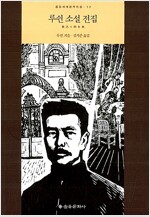

루쉰은 말년에 다시 한 번 고골에게 관심을 기울여 그의 <죽은 혼>을 번역한다. 아니, 그러다가 죽는다. 그런 운명의 소설(책)이 있는 듯하다. 고골은 정녕 이 소설을 쓰지 말아야 했던가. 지난 금요일, 그에 대해 강의하면서 한 번 더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