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 중에서 그 어떤 곳도 내가 당신을 떠나는 이류를 직접 설명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밤이 염세적이다. 밤이 무거운 신음을 토한다. 벽의 몸으로 둘러싸인 밤의 내부와 외부, 내부의 외부, 내부에 둘러싸인 외부, 그 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 내가 살던 나라는 벽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그들이 살던 나라, 수니가 살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282)
(...)
물 속에서 흘러가는 시간의 속도는 임의적이다. 우리는 물고기의 자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십이년 동안 목소리가 없는 수니. 벽에 매달린 수니의 혀. 수난은 달콤한 굴종이니, 내 혀를 잘라다오, 아니면 내 머리나, 그리하여 나를 없애다오, 내 시간을, 내 기억을, 내 해석을, 내 말을 없애다오. 그들은 나를 재판했다. (298)
- 배수아, <밤이 염세적이다>(<올빼미의 없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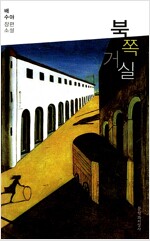

배수아의 <올빼미의 없음>을, 예전부터 읽고 싶었는데 어쩌다 놓친(<에세이스트의 책상>은 읽은 기억이 난다!) 책을 읽었다. 훑었다, 라고 해야겠다. 갑자기 미친 척, 눈을 찌르는 작품은 맨 마지막 수록된 <밤이 염세적이다>이다. 실은 제목이, 뭐랄까, 너무 찌르는 제목이라 제일 먼저 읽었다. 아, 간만에 이런 소설, 너무 좋아! (그 다음은 표제작인 <올빼미의 없음>. 마지막, 카프카의 작품 인용, 너무 좋다.)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인가. 아무튼 그 시절부터 배수아 소설을 간헐적으로, 쭉 읽어왔다. 이제 쉰을 넘긴 그녀. 점점 더 달라지는(혹은 다름이 보이는) 그녀의 모습, 역시 좋다. 더 과격해져라! 이렇게 쓰고도 책을 낼 출판사가 있으니, 살짝(많이, 인가?), 부럽다.
소설은 물론 '이야기'이지만, 이야기의 얽힘(나아가 독자 입장에서는 접수)을 방해하는 이런 시건방지고 심드렁하고 도도한 문체, 간만에 너무 좋다. 누가 당신으로 하여금 이야기를 짜라고 했던가. 결국 그 강박(!) 역시, 내가 나에게 부여한 것일 터. 서사의 강박으로부터의 자유.
19세기 소설(그야 소설의 교과서니까 당연히!)을 많이, 열심히 읽어온 까닭에 참 쉽지 않은 문제다. 나를 나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도 결국 나다. 아무도 나로 하여금 나 이외의 것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내 보기에 요즘 잘 살고 있는 작가 중 하나는 이 사람.



언젠가 그가 소설을 쓴다기에 놀랐다. 뭐, 솔직히 재밌지도 않았다. <고백의 제왕>은 지루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제일 최근 소설집 <기린이 아닌 모든 것>, 좋았다. 언젠가 몇 자 쓸 시간이 나면 좋겠다. 가사도우미가 무슨 클래식을 듣는 소설, 확 꽂히는 뭔가가 있었다.
소설가가 된 그가 최근 시집 냈다. 역시, 천생이 시인! <정오의 희망곡> 이후 훨씬 시다워진(?!) 이장욱을 본다. 그의 문장-시를 나도 반복해본다.
"나는 의욕을 가질 것이다."
세일즈포인트가 많은 것을, 어쩌면 모든 것을 이야기해준다. 님은 아마 소설이 아니라 시가 실존, 영혼의 형식인 듯. 흠, 이렇게 쓰고 보니, 나의 실존은 그럼 번역인가? 정녕 극혐, 노잼이다! 진짜 죽지 못해 하고 있다, 번역. 심지어 오늘도 오직 번역하기 싫어서, 그 이유 때문에 논문 쓴 듯하다. 그게 아니라면, 소설이 쓰이지 않아서, 더 정확히 초고가 잡힌 소설을 다시 보니 정녕 견적이 잡하지 않아서. - 넌 어쩜 소설을 이렇게 쓰느냐, 그 동안의 소설 공부는 똥구멍으로 한 것이더냐, 헐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