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거의 40도에 육박하는 열이 났으나 오늘은 상태가 그리 나쁘지 않은 아이를, 소아과를 거쳐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그 맞은편 커피숍에 앉아 있다. 혹시 열이 또 나거나 손발에 반점이 보이면(그 공포의 수족구!-_-;;) 즉시 데려갈 참이었는데(완전히 벌 서는 기분이다!) 별 탈이 없나 보다. 무거운 노트북을 들고 나와 논문 쓰는 작업을 계속 해본다. 체호프의 <결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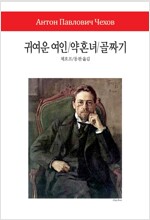


러시아문학만큼 결투가 많이 나오는 문학이 있을까 싶다. 내가 번역하기도 한 <우리 시대의 영웅>의 작가는 본인도 결투에서 죽었다. <벨킨 이야기>의 첫 작품 <그 일발>도 결투에 관한 고전적 틀을 제공한다. 그 작가인 푸쉬킨 역시 결투에서 사망. 18세기, 남의 나라(유럽)에서 들어와 본토보다 더 인기를 누렸으니. 이것에 대한 문화사적 연구는 로트만의 책을 보면 된다. 역시 석학. 비단 결투뿐만 아니라 결혼, 청혼, 음식, 각종 풍습에 대한 연구가 돋보인다. 물론 전공자 아니면 굳이 읽을 필요, 이유는 없다 -_-;; 세상에 재밌는 책이 얼마나 많은데^^;;


체호프의 <결투>는 배수아식 화법을 빌려 말하자면 <결투의 없음>에 관한 소설이다. 완전 웃긴 결투가 된다, 궁극으론 없는 결투, 성사되지 못한 결투에 관한 이야기. 주인공 라예프스키는 러시아문학 특유의 '잉여 인간', 그것의 세기말(덧붙여 체호프식) 버전이다. 후텁지근한 카프카스, 권태와 나태, 덧붙여 2년 전 사랑하여 이리로 꼬셔온 유부녀 나제쥬다에 대한 사랑마저 식은 상태. 언제 소설 얘기는 나중에 더 할 수 있으리라.
겸사겸사, 이 참에 이 소설에 대해 석사논문을 썼던 한 선배를 짧게 회상한다.
대략 '지식인(인텔리겐치아'와 패러디'라는 주제였고, [결투]에는 잘 맞는 얘기였다. 논문을 꼼꼼히 다시 읽어보니 그 무렵 그 선배가 갖고 있었을 나태감과 권태감, 열등감, 무력감 등이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 은근히 배어나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아주 잘 쓴 논문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진정성(!)이 느껴지는 논문이다, 라는 평가를 독자로서 할 수 있을 법하다.
나보다 한 학년 높은 그 선배는 부산 사람이었는데, 대학 입학 직전, 1993년 1-2월, 다른 선배 두 명과 함께 나에게 전화를 하여 해운대 어딘가에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우리는 다 같이 어딘가에서 자장면을 먹었지 싶고, 유람선을 탔다. 그런 인연도 있고 하여, 학창 시절 내내 항상 좋은 느낌을 주는 선배(오빠^^;)였다.
내가 대학원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 군복무중이었던 그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병문안을 가지 못했던(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차가운 장례식장은 또렷이 기억된다. 지금 생각하니 그의 나이는 만 28세에 조로의 포즈를 취하는 <결투>의 주인공보다 더 어렸지 싶다.
그의 논문은 물론, 도서관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보았다. 사람은 죽어 없는데 한 시절 그가 쓴 글(책)이 이렇게 있다는 사실이 왜 이리 새삼스러운지...
그밖에, <애도와 우울증>은 푸쉬킨과 레르-프를 다루는데, 유감스럽게도 결투 얘기는 별로 없다. 그럼에도 참고할 만하다.(지금 내 상황에 딱 맞는다!) 요즘은 '서평가'로 굳어진 듯한데 아무튼 그 '로쟈'가 러시아문학박사라니,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놈의 '박사'가 되기 위해 아등바등하던 시절이 있었다니 이것도 좀 새삼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