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틀비>, 다시 읽었다! 원제는 「필경사 바틀비: 월 가 이야기」(Bartleby, the Scrivener: A Story of Wall-Street). 이것이 처음 발표된 것이 1853년이라니, 충격적이다. 소설의 내용이나 문체로는 영락 없이 모더니즘, 20세기 초반이다.(카프카의 [변신] 같은 작품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운명의 소설이 있나 보다. <모비딕>만큼 대규모(?)도 아니고 단편치곤 길지만 아무튼 단행본으로 내기엔 좀 민망한 분량임에도 아마 최근에 가장 문제적인 소설 중 하나로 대접받는 듯하다.(호프만의 <모래 인간>의 느낌..ㅋ) 대략 노트 옮기면: 하트와 네그리 - “제국에 맞서는 노동 거부”(refusal of labor), 지젝 - “사회적 상징 질서에 뺄셈의 자세를 취하는 수동적 공격성”(Passive aggressivity), 들뢰즈 - “모든 형상을 능가하는 기원적 단독성”(originary singularity), 아감벤 - “순수한 잠재성”(pure potentiality). 뭐, 맥락을 빼놓으니 얄궂지만, 얼마나 인구에 회자되는지는 알 만하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정의는 들뢰즈의 것이다.("Bartelby; or, The Formula")
“「바틀비」는 작가에게 메타포도 아니고 그 어떤 무엇의 상징도 아니다. 그것은 격렬하게 희극적인 텍스트인데, 희극적인 것은 항상 문자 그대로이다.”("Bartelby" is neither a metaphor for the writer nor the symbol of anything whatsoever. It is a violently comical text, and the comical is always literal.)
뭐가 그리 격렬하게(!), 격하게, 맹렬하게 희극적이냐. 내겐 이 바틀비란 인물이 그렇고, 그를 소개하는 변호사가 그렇고, 그의 사무실에 있는 세 명의 고용인(터키, 니퍼즈, 진저 넛)이 그렇다. 문체가 웃긴 건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비딕>과는 사뭇 다르다!
변호사는 바틀비를 두고 '불가사의', '불가해'한 존재라고 하지만, 사실, 고용인에게 휘둘리는(무장해제!) 그야말로 오히려 괴상한 존재이다. 필사를 거부한 필경사 바틀비를 해고하는 데도 실패한 이 변호사는 이런 책을 뒤적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나는 차츰 바틀비와 관련된 이런 고생이 영겁 전에 모두 예정되어 있었으며 바틀비는 나 같은 범부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전지(全知)한 섭리의 어떤 신비한 목적을 위해 내게 할당되었다는 믿음에 빠져들었다. 그래, 바틀비야, 칸막이 뒤에 있어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다시는 너를 박해하지 않으마. 너는 이 의자들처럼 해가 없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아. ... 나는 만족해.... ”(87: 번역본은 창비 것.)
“그 죄없는 창백한 인간을 상스러운 교도소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 꼼짝도 않으려는 녀석이 떠돌이 부랑자라고? 그렇다면 녀석을 부랑자로 취급하려는 까닭은 녀석이 부랑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인 셈인데.”(89-90)
결국 변호사는 자기가 방을 빼기로(!) 한다. 사무실을 이전한 다음에도 계속 바틀비에게 끌리는 것은 또 어떤 연유인가.(이만한 짝패도 없으리!) 다시 가보니, 바틀비는 이제 '사무실의 유령'이 아니라 '건물의 유령'이 돼 있다. 숫제 건물을 안 떠나는 것. 거기서 먹고(그는 거의 안 먹는다!) 자고 등 사무실을 진정한 '오피스텔'로 만들어 버린다. 그와 변호사가 대면하는 장면, 이 소설에서 그나마(!) 제일 긴 대화 장면이다. 변호사 역시, 바틀비가 이례적으로 말을 많이 해줘서 좋아한다.
“어딘가에 취직해서 다시 필사일을 하고 싶나?”
“아니요. 나는 어떤 변화도 안 겪고 싶습니다.”(No; I would prefer not to make any change.)
“포목상 점원 일은 어떤가?”
“그 일은 너무 틀어박혀 있어서요. 싫어요, 점원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까다롭게 가리는 것은 아니에요.(but I am not particular.)”
“너무 틀어박혀 있다니,confinement”하고 내가 소리쳤다. “아니 자네는 계속 틀어박혀 있잖아!”(93)
해서 이것 저것(바텐더 일, 상인들 대신 돈 수금, 젊은 신사의 말벗 자격으로 유럽 가는 것 등) 제안해도 바틀비는 다 싫다고 한다. “... 저는 붙박이 일이 좋아요.stationary. 하지만 내가 까다로운 것은 아니에요.”(94)
여기서 잠시 소위 바틀비 문장인 “I would prefer not to.”를 보자. 내가 영어 표현을 두고 왈가왈부할 주제는 아니나, 게다가 나 역시 번역가로서 번역의 고충을 익히 알기에 뭐라 할 건 더더욱 아니나, 국내 번역본의 표현이 썩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ㅠ.ㅠ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 말이 너무 어색해서이다. "...하는 편을 택한다'라든가 '그러지 않는다'라든가 하는 문장 말이다. 소설의 원문을 슬슬 훑어봐도 이 표현이 밥 먹듯(!) 등장한다. 내 보기엔 그냥 "(그것은/그것을) 하기 싫습니다."(혹은 맥락에서 따라선 "...하고 싶지 않습니다.")가 딱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도 공손함과 완강함은 얼추 표현되는 듯하다. 어차피 번역에서 완전히, 는 불가능하다, 그건 번역이 아니다.
아무튼. 저 유명한 문장에 표현된 이른바 ‘수동적 저항’의 적극성, 더불어, 전체 부정이 아니라 to 이하의 것‘은’ 하기 싫다는 것, 즉 잠재적으로 상정된, 뭔가 달리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된다. 가령 그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를(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prefer to)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는 것(prefer not to)은 바틀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욕망이다. 결코 그가 ‘특별한/까다로운’(particular) 것이 아니다. 단, 불가피하게 우리의 욕망과 선호(prefer)를 조절하고 제한할 수밖에 없는 세계 속에서 타협적인 변호사는 살아남는 반면 바틀비는 마치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로 변해 영업사원의 굴레에서 벗어나듯 조용히 ‘면벽 공상’의 세계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창백하고 여윈 유령 같은 일중독자(그는 변호사의 충복이었고 처음 몇 주간은 죽도록 일만 한다!)는 계속, 누군가를 연상시킨다. 어쩌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어쩌면 그는 나, 당신,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도. '붙박이 인생', '유령 같은 실존'의 누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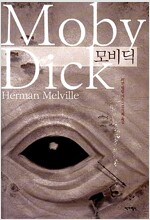


끝으로, 멜빌. 언젠가 <모비딕>에 대해서도 짧게 썼다. 최근에 알게 됐는데(어쩌면 상기됐는데) 레오 까락스의 문제작 <폴라 엑스>의 원작 소설인 <피에르, 혹은 애매함>(?)의 작가 역시 멜빌이다.(이 소설, 엄청 긴데, 번역이 안 돼서 너무 유감이다..ㅠ.ㅠ 영화 역시 비교적 최근에 또다시 봤으나 여전히 '모호한' 영화이다..ㅠ.ㅠ) 놀랍다. 그리고, 카프카 뺨치는 건조한 희극성이 돋보이는 <바틀비> 역시 그의 작품이다. 얼마나 다면적이고, 뭐랄까, 거친(!), 길들여지지 않는(!) 작가인가! "가난과 고독"의 바틀비('야망'을 버리고 편히 사는 쪽을 택한 변호사도 실상은 비슷하다) 역시 멜빌의 분신이다.
멜빌의 '워너비' 작가는 스승 겸 선배 격인 호손이었던 것 같은데, 두 작가와 작품들의 운명도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싶다. 물론, 어린 시절 <주홍글자(글씨)>를 재미나게 읽은 기억, <큰 바위 얼굴> 연극에 참여한 기억이 있긴 하지만, 그의 소설을 다시 읽게 될 기회가 있으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