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에 대해 별로 반응하는 편이 아니지만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나도 연일, 버럭, 의 연속이다. (지난 번 부산외대 사건도 그렇지만) 승객의 대부분이 아이들이니, 그저 참담할 뿐이다. 사고 소식을 접한 그날, 노란 셔틀버스에서 내리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더라.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의 심정이 그랬을 법하다. 내 아이가 저런 상황이라면. 혹자는 마침 아이가 수학여행 떠난 상태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반면 여기에는 또 얼마나 도저한 이기주의가 개입되는가. 내 아이는 살아 있다, 라는 아슬아슬한 안도감. 아이가 생기면 그래도 좀 이타적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자기 아이 일 아니면 잘 모른다더니, 그 말도 이제 알겠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굳이 어떤 누구의 잘못을 캐기보다는 그냥 일이 그리 되려고 그랬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쪽, 그러곤 지난 일을 빨리 잊고 다음 일을 도모하려고 애쓰는 쪽이다. 그럼에도 이 참사는 침몰을 전후한 상황이 너무 부조리하다. 19세기 소설에도 곧잘 배가 등장한다. 그런 배를 저 지경이 되도록 수습을 못했다는 것이 나같은 문외한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구조 작업도 마찬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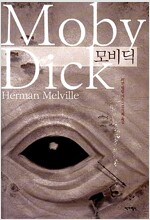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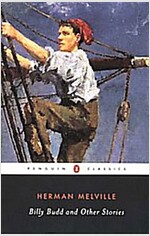
누군가에게 네 목숨 버리고 남 목숨 구하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으나(아무도 그러지도 않는다) 특정한 자리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책임은 있다. 자기 몸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채 가라앉는 배에서 내빼버린 선장의 사진을 보며 누가 분노하지 않겠나. 모든 선장이 배와 더불어 바닷속으로 함몰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야말로 '선장'(캡틴)이라는 말에 대한 배반이 아닐 수 없다. 공분, 이라는 단어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다.
2주쯤 전 일요일, 아이가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로 달려갔다. 유아 발작은 진짜로 위험한 건데 왜 이리 태평이냐고 소리치는 것이,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흥분하는 것이 애 엄마의 자리이다. 그걸 멀뚱멀뚱 바라보며 저 아줌마는 왜 저리 소란이냐고 생각하는 것이 또 관객들(그들도 제각기 아프다!)의 자리이다. 입원 수속부터 받으라는 것이 원무과 직원의 자리이다. 그 와중에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며(경련하는 환아를 처음 본 것 같던데, 그래서 경련 상태인지 아닌지 자기도 헷갈려 하고) 상황을 판단, 부작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아이의 몸에 진정제를 놓아야 하는 것이 또한 의사의 자리이다.(최근 응급실을 자주 가면서 주말에도 고생하는 젊은 수련의들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요즘은 여성 의사들이 정말 많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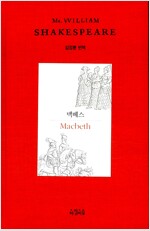
언젠가 <맥베스>를 다시 읽으면서 맥베스의 광기에 대해 죄의식, 죄책감은 죄의 크기가 아니라 죄를 느낄 줄 아는 마음(의식)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쓴 적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껏 쭉 반복적으로 읽어온 <카라마조프...> 때문이다. 이반은 왜, 자기가 아버지를 직접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스메르쟈코프에게 노골적으로 살인을 사주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이 물음을 풀어가는 과정이 이 소설의 삼분의 일, 어쩌면 절반을 이룬다.



<대심문관>에서 암시되듯 우리 모두 천재-선지자(=예수)처럼 살 수는 없다. 우생학적 이분법(이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을 빌려 냉정하게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이 '평민'(=양떼: 라스콜니코프의 표현으론 '이[蝨]')이다. 평민한테 그 이상의 것(가령, 소설 속에서는 기적과 신비에 의지하지 않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자유의 윤리적인 행사)을 요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이라는 자리에 맞는 최소치의 책임과 의식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러고 보니, 오늘이 4월 1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