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다시 읽는 루쉰이 감동적이다. 돌이켜보니 고등학교 때 읽은 다음, 저 번역본으로 대학시절 왕창 다 읽었던 기억이 난다. 기왕지사 읽었던 <광인 일기>, <아Q정전>에 덧붙여 <<고사신편>>을 새로 접한 것이 큰 소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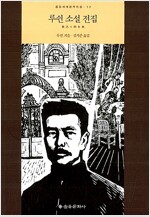
러시아문학 전공자가 돼서 다시 읽는 중국 현대 소설의 거장은 우선 그 대륙적인(!) 스타일로 독자를 압도한다. 혁명의 시기(신해혁명~), 작가는 붓(펜)을 메스로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을 터.(러시아 작가들과 비슷하다!) 루쉰이 젊은 날 의학도였음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소설 곳곳에 선혈이 낭자한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지면이 작아서(그 와중에 14매에서 12매로 줄었다..ㅠ.ㅠ) 여기다 쓴다...^^;; 이번에 읽은 번역본은 전형준 역, 창비에서 나온 것. 그는 나의 첫 소설집의 해설을 써주신 비평가 성민엽 선생이기도 하다.



폐병에 걸린 아들을 살리려고 살해된 죄수의 피를 적신 만두(‘인혈만두’)를 구해오는 부부(라오수안과 화 부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약」. '인혈만두', 이 무슨 섬뜩한 말인가! 사람의 생피를 적신 만두, 라니! 무슨 무협 영화도 아니고. 그럼에도 자식을 살리려는 부모의 심정이(정녕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십분 이해된다. 아무튼. 결국 죽고만 아들의 무덤을 찾은 화 부인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옆의 무덤이 자기 아들이 먹은 ‘인혈’의 주인공, 즉 민중을 위해 투쟁하다가 바로 그 민중에 의해 살해된 비운의 혁명가의 것임을 알게 된다. 두 어머니의 조우는 곧 민중(우매함)과 지식인(나약함)이 만남, 나아가 화해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무덤 위로 날아오르는 까마귀(혁명가의 빙의처럼) 역시 그 나름으로 희망의 상징처럼 읽힌다.
[고향]도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 ‘나’는 거의 삼십년만에, 어린 시절, 해변의 수박 밭을 덮치는 오소리를 잡던 유년의 벗 룬투와 재회한다. 어머니가 룬투가 온다는 말을 하자 화자의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린 룬투의 형상이 목가적이다. 나 역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진다.
“그 순간, 나의 뇌리에 문득 한 폭의 신비스러운 그림이 떠올랐다. 쪽빛 하늘에 황금빛 둥근 달이 걸려 있고, 그 아래는 해변의 모래밭인데 온통 초록빛 수박이 끝없이 심어져 있다. 그 속에서 열한두 살 된 소년이 목에 은목걸이를 차고 손에 죄작살을 들고서 한 마리의 차(오소리~~~)를 힘껏 찌르는데, 차는 몸을 비틀어 그의 가랑이 사이로 도망친다.”(51)
그러나 막상 눈앞에 나타난 룬투는 바닷가 농부의 고생스러움을 고스란히 반영한 주름 가득하고 신산한 얼굴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가 내뱉은 첫마디. “나으리!” 더 이상 너나들이를 할 수도 없는 것이다.(체호프 초기소설 <홀쭉이와 뚱뚱이>를 연상시킨다.) 해맑은 소년 대신 “많/은 자식들, 계속되는 흉년, 가혹한 세금, 군벌, 비적, 관리, 향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의 나무인형”(61)이 된 룬투. 그는 심지어 화자의 물건까지 일부 빼돌린다. 어쩌냐.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을. 작가는 묻는다. 이 뼈아픈 ‘격절’을 어찌할 것인가. 그리고 삼사십대의 야심찬 작가, 계몽가의 면모가 드러나는바, '희망'을 얘기한다.
“나는 희망한다. 그들은(수이성과 훙얼) 더 이상 나처럼, 사람들끼리 격절되지 않기를... 그러나 나는 또한, 그들이 한마음이 되려고 하다가 그 때문에 나처럼 괴롭고 떠도는 삶을 사는 것은 원하지 않고, 그들이 룬투처럼 괴롭고 마비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처럼 괴롭고 방종한 삶을 사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삶을.”(63)
/ “희망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상의 길과 같다. 사실은, 원래 지상에는 길이 없었는데, 걸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이 된 것이다.”(64)
「복을 비는 제사」에서는 수더분하고 성실하고 솜씨 좋은 일꾼이었던 샹린 댁이 영락한 사연이 나온다. 두 번에 걸친 강제 결혼, 강간도 당하고, 지옥 같은 노동에 시달리고 등등. 모든 것은 다 참아도 ‘아차’ 실수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리고는 그녀도 무너진다. 폭삭 늙어버린데다가 일도 잘 못하고 거의 반편이처럼 돼서 온갖 사람을 붙잡고 아이를 잃어버린 사연을 얘기한다. 모든 어미는 자식 앞에서 죄인이다. (낳은 것 자체가 죄다..ㅠ.ㅠ)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정말.” 그녀는 말했다. “눈 오는 날에만 짐승들이 깊은 산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마을로 내려오는 줄 알았죠. 봄에도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소쿠리에 콩을 담아서 우리 아마오에게 문턱에 앉아 콩을 까게 했지요. 그 애는 말을 아주 잘 듣는 아이라서, 제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었어요. (애 소리가 안 들리고.. 가시덤불에 신 발 한 짝.....) 다들 말했죠, 끝났군, 이리를 만났나봐, 더 들어갔더니 과연, 그 애가 풀섶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뱃속의 창자를 벌써 다 먹혀버렸는데, 불쌍하게도 그 애는 손에 그 소쿠리를 꼭 잡고 있었어요...”(146-7)
처음엔 동정을 갖고 들어주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거나, 심지어 그녀를 놀리기도 한다. 어쩔 수 없이, 동정 없는 세상! ^^;;) 아무튼 그런 그녀가 “배운 사람”이고 “대처 사람”인 ‘나’를 향해 묻는다. “사람이 죽은 뒤에, 도대체 영혼이 있는 건가요?”(133) “그러면, 지옥도 있나요?” “그러면, 죽은 식구들은 다 만날 수 있나요?” 그녀의 인생사를 생각해 보면 이 질문(들)에는 공포과 기대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즉, 사후 세계가 있다면, 남편도 보게 되는데, 남편이 둘이나 되니, 옥황상제가 샹린 댁의 몸을 반토막 내서 두 남자에 줄 거라는 공포(누가 이렇게 놀렸다..ㅠ.ㅠ). 그 다음, 죽은 다음 죽은 아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 옛날에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던 소설인데, 애 낳고 읽으니 더 그렇다.
대표작인 <아Q정전>에서 아Q가 심문 끝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장면은,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면, 이 소설을 처음 읽던 고교 시절로 나를 되돌려 놓는다. 맞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 소설이었지!
그러자 장삼을 입은 사람 하나가 종이 한 장과 붓 한 자루를 아Q 앞에다 가져다 놓고 붓을 그의 손에 쥐여주려고 했다. 그 순간 아Q는 몹시 놀라서 거의 ‘혼비백산’할 지경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손이 붓을 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한군데를 가리키며 그에게 서명을 하라고 했다.
“저는... 저는... 글자를 모르는데요...” 아Q는 덥석 붓을 움켜잡고서 황공해하면서 부끄러운 듯이 말했다.
“그러면, 너 좋을 대로, 동그라미나 하나 그려라!”
아Q는 동그라미를 그리려 했지만 붓을 잡은 손이 떨리기만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종이를 바닥에 펴주었고, 아Q는 엎드려서 평생의 힘을 다 쏟아 동그라미를 그렸다.(124)
그리하여 있는 힘을 다해 하나 그렸지만, 호박씨 모양으로 찌그러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다시 감방 안으로 들어간 아Q.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원래 끌려들어가고 끌려나오고 하는 때도 있는 법이고 또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려야 할 때도 있는 법일 터인데 다만 동그라미를 동그렇게 그리지 못한 것만은 그의 ‘행장’에서 하나의 오점으로 남는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개운해졌다.” (125)
---


루쉰은 도..키를 비롯, 러시아문학에 조예가 깊었는데(당연하다!) 그의 데뷔작 <광인 일기>는 고골의 <광인 일기>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다. 말년의 루쉰이, 역시나 고골이 말년에 쓴 <죽은 혼>을 번역했음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 고골은 이 소설을 쓰지 말았어야 했다!!! 이거 쓰다가 자기도 죽고, 번역하던 루쉰도 힘들었을 것이다 -_-;; 이런 운명의 소설-책이 있는 거다...!
마지막. <고사신편>에 수록된 <관문 밖으로>. 늙은 노자(스승)와 젊은 공자(제자)의 만남을 루쉰이 새로 쓴 소설이다. '고사신편' 자체가 옛날 얘기를 자기가 새로 쓴 것으로, 아쿠다가와 류노스케의 일부 소설들과 비슷하다. 아무튼, 간만에 접하는 동양적(!) 아포리즘이 웅숭깊다.
공자(공구)의 첫 방문에 노자가 하는 말: “성(性)은 고칠 수 없고, 명(命)은 바꿀 수 없고, 시(時)는 멈출 수 없고, 도(道)는 막을 수 없어. 도를 얻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잃어버린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217)
석달 뒤. 두번째 방문 뒤 노자의 말: “우리는 여전히 도가 다르다. 설사 같은 한 켤레의 신발이라 할지라도, 내 것은 사막으로 가는 것이고 그자의 것은 조정으로 오는 것이다.”(220)
여기서 “조정”(정치)의 길을 가는 공자와 “사막”(은둔)의 길을 가는 노자 모두 루쉰의 분신처럼 읽힌다. 혁명의 시대를 산 지식인 작가의 두 모습.(얼핏, 도..키와 체호프가 동시에 떠오른다.)
끝으로. 루쉰은 잡문을 엄청 많이 쓴(사실 소설은 다 해야 중편1편, 단편 32편이다) 작가인데, 그의 산문시 한 구절을 되새겨본다.
“절망은 허망하다. 희망이 그러하듯이.”(<들풀[野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