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이 속물스러움을 어찌할 것인가
- 고골, <뻬쩨르부르그 이야기>



고골은 러시아문학 최고의 수수께끼이다. 그는 얼굴이 너무 많거나 아예 없다. 능글맞고 의뭉스러운 재담꾼의 얼굴, 이상과 현실의 괴리 앞에서 파멸하는 광기 어린 예술가의 얼굴, 궁상맞고 추레한 노총각의 얼굴, 구원의 열망에 사로잡혀 고통 받는 메시아의 얼굴. 이 얼굴들이 <뻬쩨르부르그 이야기> 속을, 환상의 도시 뻬쩨르부르그를 유령처럼 배회한다.
그러나 가장 기묘한 것은 네프스끼 거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오, 이 네프스끼 거리를 믿지 마라! (중략) 모든 것이 기만이고 모든 것이 꿈이며 모든 것이 겉보기와는 다르다!(281)
인간은 그를 구성하는 각종 부속물로 해체된다. 프록코트, 넥타이, 중절모, 콧수염 등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그 파편들이 인간을 장악한다.(「네프스끼 거리」) 오죽하면 엄연히 인간의 한 부분인 신체마저도 속을 썩인다. 가령 「코」에서 ‘코’는 분명히 코발료프의 일부였으나 어느 날 갑자기 독립적인 인간이 되어, 더욱이 그보다 더 높은 관등을 뽐내며 그를 위협한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한낱 꿈에(코-NOS를 뒤집으면 꿈-SON이 된다) 불과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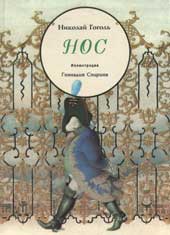
([코] 러시아 본 중 하나.)
「외투」처럼 사실주의의 ‘외투’를 걸친 소설 속의 세계는 더 환상적이다. 가난한 하급 관리가 북국의 혹한에 맞서려고 힘들게 장만한 새 외투를 강탈당하고 절망 끝에 사망한 뒤 ‘귀신’이 되어 뻬쩨르부르그를 떠돈다. 실상 이 소설의 환상성은 전설의 고향 같은 줄거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그 자체로 존재하지 못하고 하나의 외투, 하나의 ‘자리’로 환원되는 세계야말로 그로테스크하다.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시신은 어디론가 옮겨져 매장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뻬쩨르부르그에 아까끼 아까끼예비치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 같았다. 누구의 보호나 사랑도 받지 못하고, 흔한 파리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핀으로 꽂아 현미경을 들이대는 자연 관측자의 관심조차 끌지 못했던 존재가 사라졌다. (중략) 이렇게 하여 관청에서도 아까끼 아까끼예비치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벌써 그 다음날부터 훨씬 키가 큰 다른 관리가 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89-90)
말하자면 고골은 카프카 보다 먼저 관료제의 암흑과 심연을 엿보았던 것이다. 「광인 일기」는 관료제의 부품이 된 인간의 내면을 포착한다. 뽀쁘리시친은 상관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승진을 하려는 야무진 포부를 키우지만 그것이 좌절되자 완전히 미쳐버린다. 이 광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의 저 독백은 한 편의 시처럼 읽힌다.
나는 9급 관리이다. 왜 9급 관리가 되었을까? 어쩌면 나는 백작이나 장군인데, 다만 9급 관리처럼 보이는 건 아닐까? 아마 나 자신도 내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있을 거다. 사실 역사에도 그런 예가 얼마든지 있다. (중략) 어떤 평민이나 농부가 어쩌다가 그 신분이 드러나 갑자기 어떤 귀족이나 황제라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략) 나도 당장에 총독에 임명되거나 경리 국장이나 그 밖의 어떤 관직을 받지 않을까? 내가 왜 9급 관리인지 알고 싶지 않을까? 다시 말해 내가 9급 관리인 이유가 뭘까?(121-122)
뽀쁘리시친은 정체성이라는 화두를 붙든 채 자신의 광기의 궤적을 고스란히 추적할 만큼 뛰어난 시적인 능력을 지녔다. 그럼에도 그의 실존적 고뇌와 그 저변에 깔린 속물스러움의 충돌은 가히, 미학적 충격에 가깝다.

(참 고골스럽게 생겼지요? ^^;;)
「초상화」의 주인공 차르뜨꼬프도 현실 법칙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우연찮게 구입한 초상화 속의 인물이 떨어뜨린 돈으로 그는 양복, 향수, 오페라글라스 등을 사고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고급 음식과 샴페인을 주문한다.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이 가난한 청년이 억눌러왔던 속물적인 욕망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안쓰러운 대목이다. 순수한 열정의 화신조차도 결코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던 내 안의 악마, 그것의 이름이 바로 속물성이다.



고골은 인간 본연의 속물성을 종교를 통해 극복하려 한다. 자기가 그린 초상화가 많은 사람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렸음을 통감하고 수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속죄하며 산 성상화가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의 벽 안에서 순결함과 고고함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도 않거니와 숫제 무의미하다. 인생의 문제는 항상 ‘홍진’에 묻힌 세상에서 생겨나되, 우리는 그것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딜레마가 결국 고골을 광기로 몰아간다.

(나보코프는 고골을 가장 잘 읽어낸 작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좀 얇긴 하지만 고골론을 썼습니다.)
고골의 소설가적 재능은 예민한 코와 왕성한 위장에 있었다. 러시아문단이 낭만주의의 끝물을 붙잡고 있을 무렵, 그는 잘 먹고 잘 살자는, 절대 죄스러울 것 없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에 주의를 기울인 최초의 작가였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초월성도 담보하지 못하는 이 허망한 욕망을 혹독히 단죄하고자 했다. 속물스러운 가치를 탐했던 그의 주인공들은 실제로건 은유적으로건 모두, 죽는다. 한편, 소설 바깥에서 고골은 자기 자신을 단죄한다. 말년에 이르러 종교에 심취한 그는 기괴한 단식을 감행, 포도주 몇 방울로 연명하다가 굶어죽는다. 서른 살만 돼도 다들 웬만큼 타협하게 되는 속물스러움에 고골은 왜 그토록 큰 우수를 느꼈던 것일까. 누구보다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았던 그가 자신의 ‘평범한’ 주인공들에겐 왜 그토록 혹독했던 것일까. 그러게, 고골은 수수께끼란 말이다.
-- <네이버캐스트>
-- 언제부터인가 이 학기가 마지막 학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이란 말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 단언하는 이유는 운을 맞추기 위해서인데,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의 대학 입학년도에 들어 있는 끝자리 숫자(-3)가 이십년을 흘러흘러 다시 끝자리에 왔기 때문이다. ~~~ 뭐, 개강과 더불어 이런 말이 주저리주저리 나오는 와중에 고골을 잠시 떠올려 봅니다. 그의 딜레마와 광기에 대해 제법 많이 생각했는데(즉 두 편의 논문을 썼는데) 결국에는 다 나의 문제를 거기다가 투사했던 것 같습니다. 뭐, 다 좋지만, 특히, 인용한 포프리쉰(뽀쁘리시친)의 말은 최근 들어, 더 귓전에 맴도는군요...!

(일리야 레핀이 1870년에 그린 포프리쉰(뽀쁘리시친), 이랍니다. 처음 보는데, 좋군요!)
여하튼. 환상과 괴기 역시 단지 기법이 아니라 세계관의 문제라, 작가별로 그 양상이 다르고 각기 자기만의 방식으로 '참을 수 없는 현실-실제의 무거움'(!)을 담아냅니다. 가령, 이런 작가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