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정면에서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라.”
- 멜빌, <모비딕>(1851)
<모비딕>이 자신의 다리를 빼앗아간 고래에게 복수를 하다가 파멸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래 뼈로 만든 의족에 몸을 의지한 채 두려움을 모르는 시선으로 앞만 바라보며 서 있는 노인, 신을 믿기는커녕 그 스스로 신이고자 하는 존재, ‘대학물’까지 먹었으면서도 식인종과 어울린 적도 있는 거친 뱃사람…. 에이해브 선장은 시종일관 신비스러운 존재로 그려지는데, 고래를 향한 집요한 복수심과 비장한 투지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스타벅의 눈에는 광기로, 불경스러운 반역으로 보인다. 근육질의 건강한 몸에 청교도적인 윤리와 합리적 실용주의를 겸비한 30세의 일등항해사는 당차게 말한다. “저는 고래를 잡으러왔지, 선장님의 원수를 갚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216) 복수 따위는 돈벌이도 되지 못하거니와 그저 맹목적인 본능으로 공격을 했을 뿐인 “말 못 하는 짐승”에게 원한을 품었다가는 천벌을 받으리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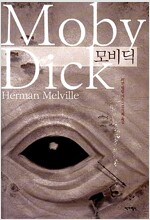

(세상에 쉬운 번역이 없겠지만, <모비딕> 완역하신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짐승에게서 에이해브는 가시적인 “판지 가면”로 가려진 뭔가 거대한 힘의 원천을 본다. “공격하려면 우선 그 가면을 뚫어야 해! 죄수가 감방 벽을 뚫지 못하면 어떻게 바깥세상으로 나올 수 있겠나? 내게는 그 흰 고래가 바로 내 코앞까지 닥쳐온 벽일세.”(217) 개인적인 복수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운명(신 혹은 자연)을 향한 분노를 모조리 고래에게 쏟아 붓는 것이다. 어떻든 열여덟 살의 어느 아름다운 날 처음 고래를 잡은 이래 40년 동안을 바다의 고래와 더불어 살아온 노선장의 한탄은 ‘교향곡’처럼 깊고 묵직한 울림을 낸다. 그는 당장 진로를 바꾸어 돌아가자는 스타벅의 바람직한 충고를 따를 수 없다. 고래, 특히 모비딕이야말로 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까닭이다. “모든 것을 파괴하지만 정복하지 않는 고래여! 나는 너에게 달려간다. 나는 끝까지 너와 맞붙어 싸우겠다. 지옥 한복판에서 너를 찔러 죽이고, 증오를 위해 내 마지막 입김을 너에게 뱉어주마.”(681) 그러고서 에이해브는 고답적인 비극의 주인공답게 고래와 함께 바다 깊숙이 침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마감한다. 하지만 이 비장한 운명극은 이 소설의 일부를 이룰 뿐이다.
 (모비딕, 향유고래.)
(모비딕, 향유고래.)
<모비딕>은 원제(“Moby-Dick or, The Whale”)가 말해주듯 고래의 생김새와 생태와 종류, 고래를 잡고 해체하고 보관하고 활용하는 법, 고래 요리의 종류와 역사 등 정녕 고래학과 포경(捕鯨)에 관한 책이다. 모비딕은 고래 일반을 대표하는 ‘짐승’임과 동시에 <피쿼드> 호의 여느 선원들보다 더 또렷한 형상과 성격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몸집,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고 등에는 하얀 혹이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아 있는, 인간처럼 교활한 지성과 영원한 악의를 뽐내는 독특한 향유고래!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색깔이라기보다 눈에 보이는 색깔이 없는 상태인 동시에 모든 색깔이 응집된 상태”(246)와 같은 저 흰색이 압도적이다. 검푸른 바다를 뚫고 용트림하는 하얗고 거대한 힘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을까.
 (뱃사람처럼은 안 보이죠?ㅎㅎ)
(뱃사람처럼은 안 보이죠?ㅎㅎ)
한데 최후의 접전에서 살아남은 자는 비장함과도, 합리적 실용주의와도 무관한 인물이다. “내 이름을 이슈메일이라고 해두자.”(31) 이렇게 운을 떼는 청년은 지갑도 거의 바닥나고 뭍에는 딱히 흥미로운 것도 없어 기분 전환 삼아 배를 타게 되었다. 하필 포경선이었던 것은 거대한 고래,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괴물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이 출사표에 대해 때론 비장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그의 어조는 대체로 덤덤하다. 자신이 속한 연극판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명징하다. “다른 사람들은 고상한 비극에서 당당한 역할을 맡거나 우아한 희극에서 짧고 쉬운 역할을 맡거나 익살극에서 유쾌한 광대 역할을 맡는데, ‘운명’이라는 무대감독이 왜 나한테는 고래잡이 항해의 이 초라한 역할을 맡겼는지, 그 정확한 이유는 나도 알 수 없다.”(36) 그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것도 그렇다. 퀴퀘그의 관과 <레이첼> 호 덕분인데, 이런 흐름을 관장하는 메커니즘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해 이슈메일 나름의 답은 이렇다. “인간들이여! 불을 정면에서 너무 오래 들여다보지 말라.”(511)



“포경선은 나의 예일 대학이며 하버드 대학”(158)이라는 이슈메일의 고백은 작가에게도 적용된다. 멜빌 문학의 자양분 중 하나는 포경선과 남태평양의 섬에서 쌓은 경험이다. 그 토대 위에서 형상화된 ‘자연’의 이면에는 물론 ‘문명’이 도사리고 있다(멜빌의 후기의 역작인 「필경사 바틀비」는 문명의 한가운데 놓인 인간의 본질을 절묘하게 포착한다). 인종 박물관처럼 보이는, 총 서른 명의 선원을 실은 <피쿼드> 호는 19세기 중엽 미합중국의 축소판이기도 하다. 주인공들의 이름에서부터 여실히 드러나는 성경 텍스트가 이 작품의 보편성과 영구성을 부여해주기도 한다. 삼십대 초반의 작가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공들여 쓴 소설이 <모비딕>이다. 이 소설과 함께 작가가 망각과 침묵의 바다 속에 침몰한 형국이랄까. 20세기 초, <모비딕>의 부활은 눈 덮인 산 같은 모비딕이 바다 위로 웅비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 같지 않나.
-- <책&>
-- <모비딕>의 작가가 가장 열등감을 느낀 작가는 너대니얼 호손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읽어봐야죠 ㅋ <큰바위얼굴>은 연극도 하고 그랬는데...



-- 오로지 거대한 이미지, 숭고함, 뭐 이런 것 때문에 <모비딕>과 함께 연상되는 화가는 아이바조프스키입니다. 그의 그림은 종류 불문, 갤러리에서 실제로 보면 문자 그대로 압.도.(압사?)당합니다..^^;; 칸트의 숭고미 설명할 때 항상 언급하는 화가이기도.. 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