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대, 지식인의 초상
- 자연의 아들이 될 것이냐,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이냐
- 나쓰메 소세키, <그 후>
여름비가 사정없이 퍼붓는 날, 한 청초한 여인이 백합을 들고 다이스케의 집으로 들어선다. “향기가 참 좋지요?”라며 그녀는 가까이서 꽃향기를 들이마신다. 그런 그녀를 만류하며 다이스케는 꽃을 받아 수반에 꽂는다. 그녀가 웃으며 말한다. “당신도 그때는 코를 대고 향기를 맡았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던가, 다이스케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비와 백합 얘기가 나온다. 이번에는 다이스케가 백합을 사온다. 온 집안에 백합 향기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는 인력거를 타고 빗속을 달려올 미치요를 기다린다.
‘오늘 비로소 자연의 옛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때,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안위(安慰)를 온몸에 느꼈다. 왜 좀 더 일찍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왜 자연에 저항을 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는 비 속에서, 백합 속에서, 그리고 재현된 과거 속에서 순수하고 완벽하게 평화로운 생명을 발견했다. 그 생명은 어디에도 욕망이 없고 이해관계를 따지려들지도 않았으며 자기를 압박하는 도덕도 없었다. 구름과 같은 자유와 물과 같은 자연이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행복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276)
사실 여름비와 어우러진 백합 향기처럼 아찔한 것은 나쓰메 소세키의 문체이다. 탐미적인 문체 덕분인지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간통이야말로 사랑의 가장 순수하고 고결한 형식, 심지어 가장 ‘플라토닉’한 형식인 것 같다는 착각이 든다. 주인공들의 사랑이 그 정도로까지 ‘환상적’이라는 것이다. 제법 절친한 사이인 갑과 을이 한 여자를 사랑한다. 갑은 을이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자, 비록 그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지만, “의협심”에 사로잡혀 그들의 결혼을 주선한다. 3년 뒤 을 부부가 다시 도쿄로 돌아왔는데, 아이를 잃은 상처에 덧붙여 당장 생활도 궁핍하다. 을은 갑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려 하고 을의 아내는 그녀대로 갑에게 돈을 꾼다. 그러는 와중에 갑과 그녀는 점점 더 가까워진다. 결국, 갑은 가족과 의절하면서까지 정략결혼을 거부하고 그녀를 선택한다. 이것이 다이스케, 히라오카, 미치요를 둘러싼 사랑 놀음의 전말이다. 과연 속된 말로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남녀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생활의 원칙, 도덕과 관습의 불문율을 저토록 깡그리 무시할 수 있을까. 「그 후」를 읽으며 품게 되는 가장 큰 의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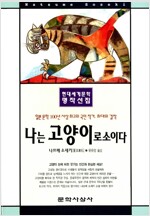

이 소설은 3인칭 시점을 취하고는 있지만 사실 다이스케의 시점에 국한된, 다이스케의 얘기이다. 고등교육을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와 형의 돈으로 먹고 살면서도 곧잘 남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는 서른 살의 귀족 도련님, 이른바 고학력 백수((高等遊民!). 무엇보다도 그 스스로 이런 생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그 나름의 원칙 또한 분명하다. 가령, 먹고 살기 위해 음악 선생 노릇을 하다가 오히려 음악으로부터 멀어진 한 지인을 예로 들며 그는 말한다. “빵과 관련된 경험은 절실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저열한 거지. 빵을 떠나고, 물을 떠난 고상한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야 인간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지.” 이런 가치관이 졸업 직후 곧장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린 히라오카의 반발을 산다.
“자네는 돈에 궁해 본 적이 없어서 문제야. 생활이 곤란하지 않으니까 일할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요컨대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고상할 말만 늘어놓고….”
다이스케는 히라오카가 밉살스럽게 느껴져서 도중에 말을 가로막았다.
“일하는 것도 좋지만, 만일 일을 한다면 단지 생활만을 위한 일이어서야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없지. 모든 신성한 일이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빵과는 무관한 법이야.”(106-107)
다이스케는 그 무렵 히라오카를 비롯한 많은 일본인을 사로잡은 “생활욕”을 “유럽으로부터 밀어닥친 해일”로 치부하며 경멸한다. 절과 절 사이, 공장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도 추해 보이고, 근대화와 산업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 아등바등, 발버둥치는 것도 못마땅하다. 하지만 이는 다이스케가 유달리 고상한 탓이 아니라 구태여 ‘생활욕’을 갖지 않아도 충분히 ‘생활’이 영위되기 때문이다.



대체로 그의 삶 자체가 역설적이다. 그는 사무라이 문화, 즉 전근대적 일본을 부정하지만 동시에 서양의 영향에 침윤된 현재의 일본, 즉 근대화의 환상을 혐오한다. 한데 다이스케의 품위가 유지되는 것은 구세대적 일본이 이룩한 가치 덕분이다(부유한 명문가의 아들이잖은가). 또 그의 탐미적인 삶은 서양, 특히 영국에 대한 문화적 열등감과 반발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한 어설픈 모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중성이 메이지 시대 일본의 많은 지식인이 직면했던 딜레마의 핵심이리라. 다이스케는 이 물음을 연애의 범주에서 던진 것이다. “자연의 아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지의 인간이 될 것인가.” 자연은 곧 사랑(불륜)이며 의지는 제도(결혼)이다. 전자, 즉 비와 백합을 택하는 순간 치명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놀고먹는 삶이 불가능해진 마당에 무슨 수로 입에 풀칠을 할 것인가? 다이스케는 결국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간다. 과연 ‘그 후’가 궁금해지는 소설이다.
-- 네이버캐스트
-- 나쓰메 소세키의 탐미적인 문학이 체질에 맞지는 않지만, 그 역시 일종의 넘어야 할 산 같습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일본 근대문학의 기원>과 함께 읽으면 더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쨌거나 소세키는 소위 시대정신의 육화인지라...
-- 스무 살 넘기면서 10년 이상을 하루에 두 갑쯤은 거뜬히 바닥내는 골초로 살았는데, 그래서 담배 없이 책읽기와 글쓰기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읽어지고 써지더라고요...-_-;; 저 글이 그 첫 증거였습니다. 글을 쓰는 내내 엄청나게 담배를 피우고 싶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