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는 보잘것없고 주눅이 들고 소심한 가난뱅이였다. 활력이나 자신감이라곤 전혀 없었다. 자부심도 없었다. 그가 대체 무엇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체격이 작고 볼품없고 허약했다. (...) 그는 늘 가난했다. 그는 양순하고 존재감이 희박했으며, 자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남에게 봉사만 했다. 그렇다고 비겁하거나 비굴하지는 않았다.(<네 개의 이미지>, 226)
부모형제도 없고 달리 의지할 데도 없고 집도 없는 어떤 아이가 세상의 끝에 다다를 때까지 길을 떠나기로 작심했다. 챙겨갈 것도 별로 없었고 짐을 꾸릴 필요도 없었다. 딱히 가진 게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형편이 되는 대로 아이는 길을 떠났다.(<세상의 끝> 299 )
<일자리 구합니다>를 비롯하여 '삶과 노동'에 관한 글은 고골이나 멜빌(<바틀비>), 카프카(<변신>) 등과 엮어서도 읽어볼 만하겠다. <주인고 피고용인>, <계급투쟁과 봄날의 꿈> 등도 좋았다.
그는 나름대로 섬세하고 고결한 사람이었다. 그는 교양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경로를 통해 독특한 교양을 쌓는다. /
그는 신분이 낮아서 소박한 옷차림을 하고 다녔다.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좋았고 기뻤다./
그는 말하자면 어두컴컴한 길을 따라 즐겁게 사색에 잠겨 우아한 인생을 차분하게 조용히 살았다. 그는 자신의 변변치 못한 처지를 예찬했다. (<노동자> 307)
사무원은 우리 생활에서 아주 친숙한 존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글로 다루어진 적이 없다.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다. 사무원은 작가님들의 글쓰기 소재가 되기에는 어쩌면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순진하며, 그다지 창백하거나 타락하지도 않았고, 도무지 흥미를 끌지 못한다. 그저 필기구와 계산기를 손에 들고 있는 소심한 청년일 뿐이다. (<사무원> 320)
한두 해가 더 흘러갔다.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성가신 목숨을 스스로 끊기로 했으며, 그가 아는 깊은 동굴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동굴 아래로 내려가려니 당연히 겁이 나서 흠칫 물러섰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생각하니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서 기분이 짜릿했다. 그는 어두컴컴한 커다란 문을 통과하여 한 계단씩 아래로 점점 깊이 내려갔다. 그렇게 몇 걸음을 내려가자 벌써 하루 종일 걸어온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맨 아래까지 내려가서 으슥한 곳에 있는 조용하고 서늘한 지하 납골당에 다다랐다. 등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 브렌타노는 납골당 문에 노크를 했다. 불안을 견디고 버티면서 까마득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자 들어오라고 무시무시한 명령이 떨어졌다. 어린 시절이 생각날 정도로 겁을 먹고 안으로 들어가자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무뚝뚝하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너는 가톨릭교회를 섬기는 종자가 될 거지? 여기서는 그렇게 해야 해." 음침한 느낌을 주는 사내가 그렇게 말했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브렌타노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브렌타노 2>, 437-438)
앗, 다 읽었다!^_^
겸사겸사, 괴테 전공자인 걸로 아는 독문학자이자 (한때??) 문학평론가 임홍배 선생님의 번역이 너무 좋다. 직접 편집하신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구성도 좋다. 무엇보다도, 번역하는 텍스트에 대한 역자의 참된 애정, 학적인 지식, 공감능력^_^ 등이 느껴져 좋다. 그의 괴테 연구서를 사서 훑어보며 나도 이런 식으로 도스-키 연구서를 써야겠다는 다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 검색해 보니 번역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나도 부지런히 해야지^_^



*
카프카와 비슷한 구석이 굉장히 많지만(하급 관리, 회사원, 사무원, 외판원 등의 느낌도 그렇고), 뭔가 2프로 부족(혹은 넘침?^^;). 유럽(스위스)의 우아함, 느긋함, 세련됨, 이런 것도 생각한다. 20세기 전반기 이렇게 좋은 요양원이라. 정신질환으로 요양에서 생활(입원), 그런데 저렇게 성장하고(모자와 지팡이까지!) 항상 산책을 나갔다고 한다. 낮에는 정해진 분량의 노동을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봄여름가을겨울 항상. 너무 좋다, 그 루틴이. 그러던 어느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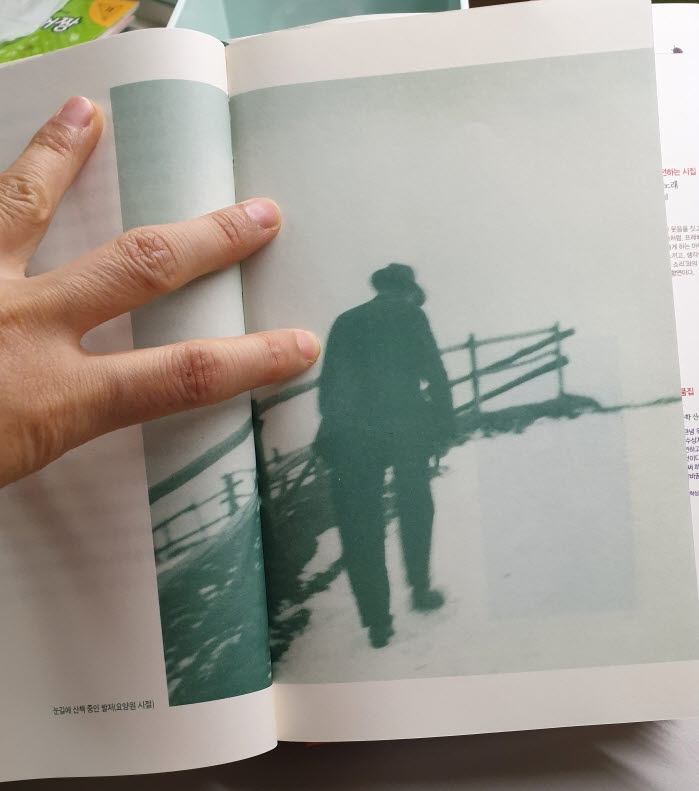

엎드린 자세도 아니고 그냥 벌러덩, 기꺼이 드러누운 것 같은 자세. 언젠가 내가 어린 시절 거창 산골에 눈이 왔을 때 야트막한 언덕에서 눈썰매(->비료 포대로) 타다가 저렇게 드러누웠던 것 같다. 확실히 극과 극은 통한다. 그리하여 그가 꾸었던 꿈은...
"간밤에 얼마나 아름다운 꿈을 꾸었던가. 나는 그 꿈 이야기를 가벼운 필치로 전하고자 한다. 나는 어디선가 편안한 지인들에 둘러싸여 아주 매력적인 공간에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장면이 바뀌어서 나는 전망 좋은 널찍한 장소에 놓여 있는 소박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낯선 느낌을 주는 언덕들이 낭만적인 인상을 주어서 보기에 좋았다."(<꿈> 180-181)
"하지만 그는 엄청나게 추운 겨울날 저녁에 유령 같은 모습으로 살아 있었다. 엄청나게 키가 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아, 이것이 단지 상상일 뿐이고, 내가 넋을 잃고 헛것을 보았을 뿐이라면 너무 슬프다. 우리는 어떤 일은 무조건 믿고 싶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믿지 않을 수 없고, 달리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네개의 이미지 - 1. 예수> 223)

음, 이십대(스무살?) 사진이라는데, 느낌은 젊어보이는 사십대 -_-; 그만큼 초월적으로 보인다. 드디어 사십대가 되었을 때는 이미 저쪽으로 넘어간 듯한 느낌. 저쪽, 어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