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서사의 매혹>


나폴레옹의 러시아 침략(1812년 대조국전쟁)을 다룬 역사소설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로스토프 집안과 볼콘스키 집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두 집안은 각각 작가의 친가, 외가로서 그의 입장에서는 ‘나’가 어떻게 생겨나 성장했는지를 추적하는 과정이 곧 소설 집필 과정이었다. 이 압도적인 분량의 책이 주목하는 것도 실은 남성적 서사인 ‘전쟁’(국가의 역사)보다는 여성적 서사인 ‘평화’(‘개인의 이야기’)이다. 특히, 열세 살 소녀에서 시작하여 네 아이의 엄마, 즉 ‘아줌마’가 되는 여주인공 나타샤 로스토바는 톨스토이의 인간관과 세계관을 오롯이 보여준다.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이 귀염둥이는 볼콘스키 공작의 두 번째 아내가 될 뻔했으나 결국 모스크바의 대부호인 베주호프 집안의 안주인이 된다. 볼콘스키 공작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는 자는 그녀의 오빠인 니콜라이 로스토프 백작이다. 그로써 나타샤는 남편(안드레이 볼콘스키)의 여동생이 될 뻔한 마리야 볼콘스카야와, 정반대로, 오빠의 아내로 다시 만난다. 이런 개인(들)의 성장의 ‘이야기’가 곧 일국의 ‘역사’이기도 한바, 개인사와 보편사의 총합에 관한 파노라마는 대하소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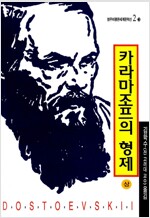
반면, 제목만 놓고 보면 가족서사의 전범처럼 보이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은 작가의 독특한 시간 사용법이 돋보인다. 그는 대하처럼 흐르는 시간의 총체가 아니라 그러한 시간의 한 순간을 포착하여 그 단면을 확대한다. 주인공들의 성장은 한 순간에 완성된다. 드미트리는 하루아침에 아비 죽은 패륜아로 전락하고 이반은 그로 인해 광인이 되고 스메르쟈코프는 자살하고 알료샤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모두 하루아침에 망하거나 흥한다. 톨스토이의 ‘교과서’와 비교하면 성장 없는 성장소설, 가족 없는 가족소설에 가깝다. 그럼에도 세계문학사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 이 독특한 서사 구조 덕분이다.



우리 문학의 근대소설사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성취인 염상섭의 <삼대> 역시 잘 쓴 가족소설의 전범이다.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 등 조 씨 집안 ‘삼대’를 대표하는 세 남자들의 흥망성쇠, 즉 ‘성장’에 관한 기록은 동시에 그들이 속한 세계의 백과사전이기도 하다. 최서희의 성장소설인 토지 역시 그녀 주변의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서사이자 역사대하소설로서 앞으로도 추월을 허용하지 않을 법하다. 물론, 가치평가 여부를 떠나, 이미 이런 규모의 소설이 읽히지도, 쓰이지도 않는 시대가 왔음도 기정사실이다.
어릴 때부터 성장소설을 쓰려는, 나아가 가족서사를 축조하려는 꿈이 있었다. 대학교 4학년 때 등단한 이래 일곱 권의 소설책을 냈다. 지난 9월에는 작은 장편 <다시, 스침들>이 나왔다. 그동안 러시아문학 전공자로서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작년 말에 출간된 파스테르나크의 <닥터 지바고>까지 굵직한 러시아 소설을 번역해왔다. 올해는 러시아문학 연구서와 독서에세이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한 달만 있으면 마흔 다섯 살이다. 소년은 늙기 쉽고 학문은 이루기 어렵다. 최근에 이 말을 곧잘 되뇌는 것은 가족 구도 속에서 나의 생물학적, 사회적 입지를 비로소 실감한 탓인 듯하다. 나에게 ‘가족’은 양친과 두 동생, 이렇게 다섯이었다. 서른여섯, 결혼한 뒤에도 그랬다. 서른일곱,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랬다. 2018년 3월,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나보다 먼저 결혼한 두 동생도 아이(들)의 부모가 된 지 오래다. 지금 나의 가족은 남편과 아이다. 과거의 가족은 문학적 현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우리 삼남매의 고향은 경상남도 거창군 수내 마을이다. 내가 태어난 것은 1975년 1월이다. 여동생은 2년 뒤 한창 바쁜 모내기철에 태어났다. 막내인 남동생이 태어난 이듬해인 1981년 1월, 우리 가족은 부산으로 이사 갔다. 11월생인 막내 동생은 문자 그대로 핏덩어리였다. 우리의 첫 정착지는 부산진구 전포동 기찻길 위 산동네의 단칸방이었다. 1920년생인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인 2007년, 당시는 육십 대였던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았던 곳을 ‘답사’하며 쓴 소설 초고의 1장은 이렇듯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 거창과 부산을 배경으로 한다. 과거는 우주보다 더 멀고 낯설다. 성장소설은 그 시간을 상대해야 한다. 다시금 문제는 새로운 시간 사용법의 발견이다.
(<월간에세이> 2월호: http://www.essayon.co.kr/kr/)
*
어제 잡지 한 권이 배달되었다. 나는 "할 일 없는 사람"이라서 이 에세이 역시 언제 나오나 열심히 기다렸다. 원고료 10만원. 이렇게 '원고'에 대한 '료'를 받으면(아직 안 들어왔지만!) 작가(글쟁이, 혹은 매설(문)가)로서의 정체성을 실감한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도 기분이 좋은 것이다.
'책'(=판매상품)과는 엄연히 다르다. 원고료는 진짜 한 자, 한 자 쓴 글에 대한 대가이다. 저 글은, 지난 학기 시간표가 애매한 탓에, 학교 커피숍과 도서관을 오가며 쓰고 다듬은 것이다.
솔직히 청탁 받을 때는 귀찮았다. 아, 이런 대책 없는 거드름, 좋아, 너무 글쟁이스러워, 잃을 것은 하나도 없고 얻을 것은 온 세상인 프롤레타리아-작가의 본성!
하지만 막상 쓰다 보면 또 글을 쓰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좋은 것이다. 그 다음, 이렇게 잡지에 실린 내 글을 보면(실은 안 보는데) 또 기분이 묘하다.
종이가 재생지. 그 느낌도 좋았다. 요즘도 나오는지, <좋은 생각> 같은 잡지.
'에세이' 아닌 '수필'. 이 단어 역시, 어딘가 아늑한 데가 있다.
하지만 저 글은 좀 많이 매정하다. -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아닌가.
*

게티이미지 뱅크에서 하나 찾아왔다. 모양새는 튤립과 비슷한데, 들꽃이고 왜 이름이 할미꽃인지. 아무튼 좋아하는 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