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전히 단어만 놓고 볼 때 얼마나 우아한가. '현기증'. 검색해 보면 이런 저런 것이 뜨지만 아무래도 나한테는 히치콕의 <현기증>(Vertigo)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제발트의 소설은 언제 읽어야지 하면서도 결국 못/ 안 읽는 책.


반면 '구토'는 순전히 말만 들어도 '구토'스럽다. 그래도 토한다, 역하다, 멀미 난다, 우웩, 토사물 등등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우아하다. 무엇 때문인지 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릴 때부터 좋아한 책. La nausee(맞나?), 아무튼 원어도 어딘가 좋았던 듯. 아주 오래 전인데, 옛날 남자친구가 마침 교보에 간다기에 원서를 사다 달라고 부탁한 기억이 난다. 그러고 몇 장 뒤졌던가. 적어도 그런 야망도 있던 시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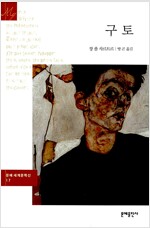

지난 수요일, 더도 덜도 말고 딱 이 두 단어의 조합을 떠올렸다. 현기증과 구토. 복지관이었고 아이가 작업치료를 끝내고 4시쯤, 그룹체육을 하러 들어갔다. 웬일인가. 항상 비교적 얌전해보이던 홍**씨가 웬일로 괴성을 지르고 난리다.(지난 금요일, 나 대신 아이를 데려간 남편이 얘기해준 대로다.) 자폐, 바로 이게 문제다. 무발화 중증, 이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런 식의 돌발 행동이 제어되지 않는 것이다. 아마 '시즌'인 모양이다. 그가 '엄마'와 함께 떠났다.
얼마쯤 지났나, 갑자기(그야말로 '갑자기'여서 놀랐다!) 손에 들고 있던 출력물의 글자열이 흔들흔들, 휘청휘청거리면서 시야가 급속도로 망가졌다. 이건 뭐지. 가끔, 한 2, 3초 시야가 흔들리거나 약간 노르스름해지다가 멈추는 일은 더러 있었지만(물론 많지는 않았고), 이건 질적으로, 양적으로 아주 다르다. 머리통이 뒤로 툭 젖혀지는데, 아, 사람이 이러다가 곧장 기절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종잇장들을 내려놓고 머리를 벽에 기대도 보고 의자(여러 개가 붙여진)에 다리를 올리고 앉아도 본다. 시야가 너무 흔들려 눈을 감는데, 몸이 화끈, 훅 달아오르는 느낌도 든다. 잠시 뒤 화장실. 나온 다음에도 편치 않아, 저쪽 복도 구석으로 가서 쪼그리고 앉는다. 또 화장실. 정녕 현기증과 구토.
아이가 나왔다. 너무 힘들어 아이와 함께 좀 앉아 있는다. 또 구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3층 대기실로 내려간다. '태양에 지친 자들'이라는 미할코프의 영화 제목이 생각나는 풍경. 여기서 '태양'은 스탈린인데, 내가 말하는 건, '희망'. 장애가 이른바 '극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나날이 더 지쳐가는 듯한 엄마들. 사실 더 큰 절망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런 정황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지적 장애 2급에 최근에 뇌병변 4급까지 추가. 겉보기에는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던데, 그래서 등급이 나오더라도 훨씬 더 낮게(좋게) 나올 줄았는데, 엄마가 아는 아이의 실제 상태는 그토록 심각했던 것이다.) 대기실에 좀 드러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난다. "엄마, 다른 엄마들은 다 가는데 엄마는 왜 이러고 있어?" 다시 화장실. 토하는 엄마 옆에서 "엄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등이 아닌 엉덩이를 두드리는 내 아이라고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옆에서 수돗물 틀어보며(걸레 빠는 곳) 키득거리기까지. 아이고, 내 팔자야.
간난신고 끝에 택시 타고 귀가, 집에 오자마자 엄청 토하고 방으로 들어가 눕는다. 다시금 시야. 세상이 이렇게 흔들린 적이 없는데, 이 흔들림의 양상과 지속 시간이 무섭다. 거물거물 천정을 보다가 곧 잠들었다. 깨 보니 7시였다. 한 시간 넘도록 잔 것이다. 이후, 또 다시 구토와 현기증의 연속. "엄마가 아프니까 내가 위로해줄게." "엄마, 나 배고픈데?" 늘 그렇듯, 이런 날은 꼭 남편이 출장 중이다.
나중에 곰곰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급체한 것 같다. ("엄마가 아까 배아프다고 했잖아?") 증상은 생각보다 빨리 호전되어 다음날 아침에는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고 오늘, 아이의 개학이 연기되어 나도 계속 '놀탱이' 모드다. 그런데, 활자열, 문자열과 마주하며 그저께와 비슷한 그 현기증이 미약하게 다시 재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유학 시절부터 시작되어 최근들어 잦아진 이명까지 합세. 나이가 우리에게 안겨준, 참 달갑지 않은 종합선물세트다. 아, 고맙지만 됐어요~ 그래도 자꾸 떠미는 것이다, 이 선물. 문제는 그런데 이게 아니다.

이 책이었지 싶다. 김현 선생의 일기 어딘가에, '매일 혈변을 본다, 무서운 건 혈변 자체가 아니라 그걸 무서워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다'하는 식의 문장이 나왔던 듯하다. 20여년 전에 읽은 문장이 새록새록 '재발', '재생'한다. 원래 위장이 약해 구토를 많이 하는 편이다. 한 번 꼬이면 이삼일은 족히 간다. 찬겨울이거나 다른 요소와 겹치면 일주일씩 앓기도 한다. 그래서 구토에 관한 소설도 한 편 썼다.

무서운 건 이토록 상습적이고 하찮은(!) 증상 앞에서 의기소침해지는 나 자신이다. 그저께 그 현기증이 너무 아뜩하여, 한참을 뇌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아주 쫄아버렸다. 바로 직전에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 계속 파스 부치고 약을 먹던 중이라, 혹시 이 모든 것이 더 무서운 어떤 것의 일환이 아닐까 말이다. 죽을병에 걸릴(-렸을)까봐 너무 쫄다보니 자살 따위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어져, 이것 하나는 좀 좋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의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그럴 힘이 없다는 것에 감사해야 하나. 하나만 해야 한다. 우리 말 번역 [구토]도 다시 읽기 힘들다, 원서는 고사하고.
*
- 엄마 좀 누워 있을 테니까 아까 읽은 책 제목만이라도 써봐.

다음 날 보니 진짜로 사실상 제목만 딱 써놨다. "이름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Carle 이렇게 써줘야지!" "어, 너무 길어서 짧게 줄였어." -_-;; 아이 방학 숙제의 마지막으로 고른 것은 다 음식, 먹는 것 관련 책이다.


작업 치료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에서 아이와 함께 <투데이 이즈 먼데이>를 봤다. '읽었다'라고 하기에는 글자가 너무 적다. 아무래도 노래 책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에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바로 왼쪽 아이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 '사대주의'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나, 달리 선진국이 아니다. 어떤 아이도 저 아이의 장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저 다 같이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신나게 먹을 뿐이다. 이 책은 그냥 평범한(?) '노부영' 중 하나이지, 딱히 장애에 관한 책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런 배려가 있는 것이다. All you hungry children, come and eat it up!

보다시피 지체장애는 그래도 괜찮다. 문제는 정신장애(지능장애와 정서장애)이다. 말 한마디 못하고 괴성을 지르며 뛰어다니는 **씨를 보면, 누구라도, 심지어 우리조차도 무서워할 만하다. 지난 주에 남편은 애 귀를 막았다고 한다. 참 어찌해야 할지.
*
오늘로 아이의 방학 중 돌봄교실 생활은 끝이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학기 중 스케줄로 간다. 어제, 활보 선생님이 아이 점심 먹는 걸 도와주러 오셨다가 그냥 가셨다.(-라고 한다.) "친구들하고 웃으면서 밥 잘 먹고 있어서요~" 제발 좀, 이렇게만 자라다오!
*
무엇보다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식판이 엄청 크다. 많은 아이들이 싹싹 긁어먹는다. 아이가 적게 먹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내 식사량의 두 배는 되는 듯하다. 그런데도 체중 증가 속도는 내가 더 빠른 듯하다. 체형의 변화 역시 눈에 뜨인다. 역시 나이. '청년' 속도로 질주하던 태풍이 졸지에 '노인'이 되었다더니, 나는 계속 귀가 먹먹하다. 다시 현기증이 올까봐, 세상이 흔들릴까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