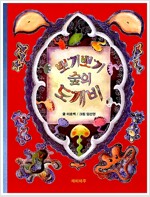이순옥 작가의 ‘틈만 나면‘이 너무 좋아 신간 ‘무서운 ㄱㅁㄷ‘도 기대가 됐다.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한 걸 이제사 받았네.
(이번에도 바코드까지 그림의
일부로 활용하는 센스!)
제목을 읽을 때 기역미음디귿이라고 읽는 게 불편했는데 읽고 나면 ‘괴물들‘이란 걸 알게 된다.
헌데 괴물들 말고 왜 ㄱㅁㄷ 이라고 했을까?
분명 다른 뜻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상상력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어른들이야 그림 휘리릭 텍스트 더 휘리릭 읽고 말테지만 아이들과는 한 페이지에 여러가지 이야깃거리가 많다.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의 ‘생각하는 ㄱㄴㄷ‘과 한글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아...이제 우리 아이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져 안타깝네.
오랜만에 예전의 아이들을 상상하며 봤다
이 책도 좋아했지만, 말놀이 면에서는 ‘뽀끼뽀끼~‘를 넘을 수가 없지.
아이들이 ‘그림없는 책‘스타일의 말놀이도 참 좋아했었는데... 그때의 너희들은 어디 간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