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2
어쩌다보니, 11월도 얼마 남지 않았다. 겨울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것일까? 달력 넘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매몰차다. 원래 시간은 인정머리가 없다지만 생각할수록 정말 야속하기 그지없다. 가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도 한다. 텃밭에 파종도 안 했는데, “수확하고 나면 겨울에는 뭘 하지?”라는 투로 걱정하는 우를 범하고 나면 씁쓸하면서도 참 스스로 어리석다며 다그친다. 뭐가 그리도 급한 것일까. 그래도 다행이다. 시간은 가도 격려는 남는다. “내가 뭐 시간 때문에 사나?” 격려가 나를 살게 하는 것임을 재차 상기해본다. 마음의 끈이 빙빙 돌다 다시 말뚝으로 돌아가 자신이 묶여 있는 곳 언저리에서 털썩 주저앉는다. 그래, 거기가 바로 네 자리다.
이런저런 일도 있고 해서 동네 잔디구장 트랙을 돌고 왔다. 나름 단단히 무장하고 나갔는데, 의외로 추웠다. 뛰는 사람도 별로 없더라니, 휑한 트랙 탓에 더 추워보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럴 땐 그냥 계속 뛰는 것이 상책이다. 무리를 했는지, 씻고 나오니 다리에 누가 바윗덩어리를 얹은 듯 무겁다. 메일 확인하고, <나는 가수다> 재방송을 어머니와 함께 보며 “그래, 김경호가 대세야!”라고 무릎 좀 치다가 책상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봤다.
책상 위, 바닥, 책장에 꽂혀 있는 책들이 위용을 뽐낸다. 그까짓 것 사람이 쓴 것인데, 라는 대체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지 몰랐던 시절에 손댔다가 화상을 입은 책들도 있다. 곁에 두고픈 책들도 있다. 읽다가 운 책도 있고, 자지러진 책도 있다. 독서라는 행동은 참 묘하다. 인식의 메커니즘이야 오래 전에 이미 철학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심리학적으로든 소상히 밝혀진 바이지만 가만히 표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독서 좋아하는 이들은 다 동의할 것인데, 웃음이 나온다. 오늘 나의 웃음을 받을 새 책 4권이 도착했다. 얼굴 반반한 책들이 후줄근한 책들 사이에서 광을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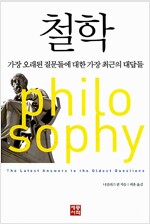
내가 최근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책을 사놓고 나면 뒤늦게 알게 된다. 기대가 크다. 따뜻하게 몸 지지고, 새 책 냄새 맡으며 기웃기웃 거리고 있으면 입이 “헤~”하고 벌어진다. 내가 읽고파 산 책인데도 느껴지는 막연한 부담감과 “대체 어떤 내용을 만날까?”라는 호기심이 교차하면서 몇 문장 읽다보면 다시 그 교차된 감정이 나의 독서를 압도적으로 방해한다. 성가신 큐피드이다. 누가 내 등짝에다가 화살을 마구 박아 놨다. 책을 덮었다. 책 제목들을 다시 한 번 바라본다. 꾸깃꾸깃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어주리라, 벼른다. 겸손한 지혜에 다다를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