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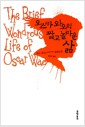
-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
주노 디아스 지음,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 2009년 1월
평점 :



겁도 없이 와장창! 깨진 유리창이 고속카메라를 돌리자 다시 창틀에 끼워지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유리 조각들이 창이 있었던 공간으로 빨려가는 모습을 볼 때, 나는 적잖은 위로를 받곤 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고칠 수 있어_리플레이]같은 버튼이 존재할 것만 같아서였다. 물론, [고칠 수 있어_리플레이] 버튼이 언제 내 앞에 나타날지, 죽은 뒤에도 나타나지 않을지, 모든 것이 그저 나의 환각인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데 레온 가족 -오스카, 롤라, 벨리시아, 아벨라르, 재클린, 아스트리드, 라 잉카-의 삶, 옴짝달싹하면 끝장나고, 옴짝달싹안해도 끝장나는 삶을 넘겨다 보며, 나는 계속해서 [고칠 수 있어_리플레이] 버튼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어느 시절, 그날의 어느 현장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들의 황당한 얼굴에 웃음으로 답하며 리플레이 버튼을 눌러 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할까. 그런데,
"롤라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천만 명의 트루히요야."
롤라가 말했다. 우리 모두가 천만 명의 트루히요,라고. 그렇다면 천만 명의 트루히요(이 인간은 어떤 역사학자나 저술가도 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을 정도로 궁극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우리의 사우론이자 아론, 다크사이드였고,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할 독재자였으며, 너무나 기이하고, 너무나 변태인 데다 너무나 무시무시해 SF소설 작가가 지어내려도 지어내기 힘든 인물)가 뭔가 어긋나고 불리해지는 대목마다 리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세상은 과연 아름다울까. 알 수 없다. 아니, 어떻게든 기가막힌 세상일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아니, 어쩌면 완벽한 지.옥!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리.플.레.이! 그것이 어쩌면 데 레온 가족을, 데 레온 가족을 있게 한 또 다른 가족들을, 그 가족들을 있게 한 또 다른 가족의 선조와 선조들의 잠자리들을 염병할 저주, [푸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 [고칠 수 있어_리플레이] 따위를 꿈꾸는 나는 틀렸고 빌어먹었다. 나 역시 트루히요니까. 이웃을 밀고하고, 비밀경찰이 되어 철봉을 휘두르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나 역시 트루히요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저주라고 말하겠지. 난 삶이라고 말하겠다. 삶이라고."
롤라가 말했다. 어떤 이들이 저주라 말하는 것을 삶이라고. 그래, 그건 삶인지도 모른다. 리플레이!라고 외칠 수 있지만 리플레이 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선택이건 주어진 것이건 꼼짝없이 살아내야 하는 것, 살아낼 사람은 꼭 살아내야 하고, 또 다음을 살아낼 사람도 살아내야 하는 것, 그것을 저주가 아니라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옳다. 벨리시아가 사탕수수밭에서 죽도록 구타당했지만 죽지않고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것은 롤라와 오스카가 태어나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게 태어난 롤라와 오스카는 죽도록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또 그렇게 꼼짝할 수 없었다는 것, 그리고 오스카의 짧고 놀라운 삶이 또 그렇게 사탕수수밭에서 끝장났지만 그 꼴을 다 보고도 남은 사람들은 살아내야 한다는 것, 어떤 이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삶이었다. 피가 흐르고 갈비뼈가 부러져도 살아내야 하는 것, 리플레이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따위를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은 삶이었다. 따라서,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은 천재적인 작가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니다, 오히려 동감할 지도 모르겠다, 그저 한 권의 소설이 아니다. 인쇄된 활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뜨겁고, 가공된 이야기라 하기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흔하다. 저주는 도처에 널려있고, 그것이 삶이라면, 널려있는 저주 만큼의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는 그저 소설일 수 없다. 찌질하거나, 분노하거나, 아름답거나, 뚱보이거나 한 누군가의 삶이다. 그렇지만, 또 한 편 <오스카 와오의 짧고 놀라운 삶>은 한 권의 놀라운 소설이다. 나는 그것을 책의 마지막에서 엿본다. 그것은,
"그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 젠장!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다니. 이토록 아름다운 걸! 이 아름다움을!"
오스카가 말했다. 이토록 아름답다고. 삶이 젠장! 이토록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찌질이 오스카는 삶을 놓았다. 사탕수수밭에서. 카리브해 열대에 위치한 달콤한 사탕수수밭에서. 삶으로부터 파이어!
이쯤되면 이것은 그저 소설이 아닌 소설이다. 꾀지지한 수도꼭지에서 철철 나오는 물처럼 놀랍고 능청맞은 소설이다. 독자를 쥐락펴락하는 소설이다. 오스카이도 한, 롤라이기도 한, 벨리시아이기도 한, 아벨라르이기도 한 독자들을 뜨끔거리게 하고, 웃게 하고, 결국 울리는. 그러니,
나는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로군! 젠장! 이렇게 늦게야 알게 되다니. 이토록 얄미운 소설을! 이 얄미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