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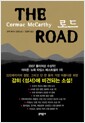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온통 재뿐인 세상이다. 모든 게 다 타버렸다. 태양은 모습을 감춰버렸고 검은 비가 내리고 검은 눈이 내린다. 길가엔 말라빠진 시체가 굴러다니고 집들과 건물은 온통 텅텅 빈 채로 쓰레기만 난무하다. 도시와 시골 모두 그런 잔해뿐이다. 남자와 아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다. 먹을 것은 다 떨어져가고 방수포를 뒤집어쓰고 가는 둘은 그런 폐허가 된 길 위에서 추위에 떨며 간신히 걸음을 옮긴다. 또한 길에서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약탈자나 살인자의 공포에 떨면서.
그렇다. 그들은 망해버린 세상의 생존자였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시적인 생존자였다. 실낱같은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고, 착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그들은 불을 운반하는 생존자였다.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세상에서 자신들은 좋은 사람들이냐고, 그래서 굶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잡아먹지 않을 거냐고 아빠에게 다짐을 받는 아이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늘 그런 잿빛 세상만을 봤지만 선(善)을 향한 마음만은 한결같다. 어떤 순간이 닥치더라도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선을 향한 마음은 어쩌면 이 세상이 망해도 살아남은 어떤 것이 아닐까. 그게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개개인이나 국가가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물질에 대한 끝도 없는 욕심 그리고 세상 망하는 줄 모르고 펑펑 써대는 자원과 늘어나는 쓰레기에 파괴되는 자연과 환경 등등 언젠가 이 세상은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망해버리는 게 아닐까. 책을 읽는 내내 그런 공포가 스멀스멀 기어들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게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가야만 하는 그 길, 배고픔과 추위에 떨면서 가는 그 길 위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커 보였다. 아니 온통 절망 투성이 길이었다.
‘뭣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 되고말고.
우린 죽나요?
언젠가는 죽지. 지금은 아니지만.
계속 남쪽으로 가나요?
응.
따뜻한 곳으로요?
응.
알았어요.
뭘 알았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알았다고요.
자라.
알았어요.
불 끌게.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한참 뒤 어둠 속에서, 뭣 좀 물어봐도 돼요?
그럼. 되고말고.
제가 죽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싶어.
나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요?
응.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알았어요.’
남자와 아이는 서로를 보듬으면서 그렇게 남쪽으로 향한 길을 간다. 행복했던 시절을 추억하는 남자가 오히려 세상에 대해 경계를 하고 행복한 건 이야기 속에나 존재하는 걸로 아는 아이가 오히려 친구를 찾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이 아닐까. 세상이 망했어도 말이다.
‘너한테는 행복한 이야기가 없니?
우리가 사는 거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내 이야기는 안 그렇고.
네. 아빠 이야기는 안 그래요.
남자는 소년을 살펴보았다. 우리가 사는 게 아주 안 좋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나는 그래도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우린 아직 여기 있잖아.
그래요.
넌 그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구나.
괜찮죠, 뭐.’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든다. 언젠가는 망하겠구나, 이 세상…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망치고 있구나… 미래에 올, 불을 운반할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말이다. 하지만 남자가 소년에게 하는 말에서, 그래도 이 세상에 선이 살아있다고, 영원히 선이 살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선이 이길 거라고 우겨본다.
‘너는 가장 좋은 사람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