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혹하는 글쓰기 / 8월의 빛
유혹하는 글쓰기 / 8월의 빛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중 첫 장편 '캐리' 부분으로부터.


영화 캐리(1976) 포스터
아래 발췌글에 나온 '태비'는 스티븐 킹의 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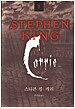

이 이야기는 그 때부터 한동안 마음 한구석에 머물러 있었는데, 뚜렷이 의식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의식도 아닌 상태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쓰기 시작한 것은 교직에 몸담은 뒤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 나는 줄 간격 없이 세 쪽 분량의 초고를 쓰다가 실망하여 구깃구깃 뭉쳐 내던지고 말았다.
내 경우에는 마치 살을 맞댄 듯 친밀하고 내가 잘 아는 것들에 대하여 쓸 때 글쓰기가 가장 순조롭다. 그런데 《캐리》를 쓸 때는 고무 잠수복을 입고 있는 듯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튿날 밤 학교에서 돌아와보니 태비가 그 초고를 갖고 있었다. 쓰레기통을 비우다가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하고는 담뱃재를 털어내고 다시 펼쳐 내용을 읽어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이 소설을 계속 쓰라고 말했다. 나머지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것이었다. 내가 여고생들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자 태비는 자기가 그 부분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 소설엔 뭔가 있어요. 내 생각은 그래요."
이 소설에 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말하자면 소설가로서의 내 인생이 거기서 비롯되었다. 태비는 그것을 금방 알아차렸고, 줄 간격 없이 50쪽 가량 쓴 다음에는 나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한다. 그리고 때로는 형편없는 작품을 썼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좋은 작품이 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