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자가 7만명이 넘는 북튜버 김겨울님의 첫 작품이다.
이웃 '세상틈에'님이 책상다반사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소개하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것이다.
20년 내공의 책덕후인 작가의 책속에는 (과장하자면) 보르헤스의 단편집 <픽션들>중 '바벨의 도서관'만큼의 책들이 등장한다.
등장하는 책들이 우리의 입맛을 다시게 만든다.
작가가 프롤로그에 밝혔듯이 이 책의 장점은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기 쓰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장점이다.
그래서 소개한 책도 딱 좋다.
아마 이 중에서 몇권의 책들은 장바구니로 들어가지 않을까?
1. " 그런 의미에서 가장 안전한 표지는 명화 표지다. 이미 많은 출판사에서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다. 심지어 펭귄클래식코리아에서 나온 것과 민음사에서 나온 책은 표지로 같은 그림을 채택했다.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다. 아마 니체가 말한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반드시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지녀야 한다'는 구절 때문일 테다." -2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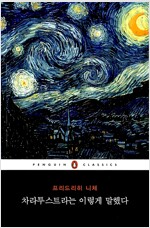
2. 민음사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노르웨이숲>처럼 보자마자 감탄사를 자아내는 표지도, 이승우<모르는 사람들>처럼 손대는 순간 마음 속 파문이 일듯한 표지도 좋다. 사실 명화로 된 세계문학 표지도 무척 좋아한다. 민음사에서 나온 다섯 권짜리 <보르헤스 전집>은 세련과는 거리가 먼데도 어쩐지 보르헤스 책이라면 그래야 할 것 같은 능청이 있다. 숲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리스 고전 원전 번역>시리즈의 디자인은 볼 때마다 탄성을 자아낸다. 서점에서 <음식의 언어>를 집어들게 된 이유에는 표지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이 온다>를 장식한 안개꽃은 한동안 나의 컴퓨터 바탕화면이었고, <마담보바리>원서의 펭귄클래식 디럭스 에디션을 장식한 푸른빛 레이스를 뉴욕 여행 내내 얼마나 어루만졌던가 - 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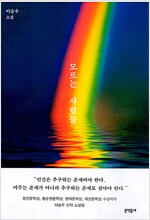








3. 세상이 변한만큼 책도 변했다. 표지 디자인을 넘어 이제는 표지의 종이 질감이나 두께, 제본 형태 같은 물리적 요소까지 출판사의 고민거리가 된다. 이 고민의 결과로 어떤 디자이너는 뒷날개를 아주 길게 만들어서 책을 완전히 감싸게 만들었고(볼테르, <불온한 철학사전>, 민음사), 어떤 디자이너는 앞날개를 조금 길게 만들어서 책갈피처럼 쓸 수 있게 했다.(진중권, <고로 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천년의 상상). 표지 질감을 벨벳 질감으로 만들어서 그 질감에 매료되게 만들기도 한다.(정이현, <상냥한 폭력의 시대>, 문학과 지성사)
솔직히 고백하겠다. 나에게는 제본 형태만 보고 산 책도 있다. 지금도 잘 모셔두고 있는 사데크 헤대야트의 <눈먼올빼미>는 지인에게 추천을 받아 2013년에 샀던 책이다. -24쪽




4. 강유원 박사는 <인문고전강의>에서 독서의 차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번째는 호기심 차원, 두 번째는 쾌락적 차원, 세 번째는 구조적 차원이다. -68쪽

5. 내가 책에서 얻은 즐거움이란 이런 것들이다 :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읽고 나서 펑펑 흘린 눈물.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읽고 뒤통수가 짜릿했던 지적 쾌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읽고 실감한 삶의 회한.
<엘러건트 유니버스>를 읽고 느낀 우주의 아득함.
<고래>의 장돌뱅이가 들려주는 것 같은 힘 있는 서사의 장쾌함
<음식의 언어>가 보여주는 문화의 교류과정에 대한 놀라움
<검은 고양이>를 읽으며 느낀 공포.
<백년의 고독>을 읽은 뒤 뒤통수를 망치로 두드려 맞은 듯했던 멍함.
<단지>가 선사한 아픔.
<이갈리아의 딸들>을 읽으며 느낀 통쾌함
<SKEPTIC>이 보여주는 과학적 사고방식의 정합성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를 읽으며
입에 씁쓸하게 남은 외로움.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를 읽으며 들었던 인간 본성에 대한 고민.
<운명>을 읽고 마침내 인정한 삶의 도피 불가능성











6. 과학 교양서를 낯설어 하는 사람들이 책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과학과 친해지는 첫 단계로 메리 로치의 책을 권하곤 한다. <인체 재활용>이나 <우주 다큐>등을 추천해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반응을 보인다.(...) 유머러스한 글을 쓰기로 유명한 빌 브라이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로치는 이야기하는데, 빌브라이슨보다 덜 시니컬하고 더 웃기다. -78~79쪽


7. 어렵게만 보이는 우주 물리학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과학자들은 많으나, 브라이언 그린만큼 쉽고 재미있게 우주물리학 책을 쓰는 과학자는 없다. - 80쪽

8. 위근우가 낸 책은 <프로불편러 일기> 한권밖에 없지만, 꽤 오랜시간 기사를 읽어온 입장에서 앞으로 더 책을 낸다면 얼마든지 살 용의가 있다. (...) 이 정도의 명료함과 합리성을 갖춘 칼럼니스트를 찾기란 쉽지 않다. -83쪽

9. 믿고 사기엔 너무 과작의 작가지만, 나에게 '믿고 산다'는 정의에 이보다 부합하는 작가는 없다. 테드 창의 다음 작품이 언제 나오든 무조건 살 것이고, 죽을 때까지 몇권이 나오든 다 살 것이다. -85쪽


10.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에는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 원리를 구상하고 연구하는 데에 있어 플라톤과 칸트 등의 철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잘 나타나 있다. 반대로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세상의 구성 원리에 대해 가졌던 관심은 지극히 과학적이다 - 92쪽


11.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 내내 온갖 책을 읽었다.(...) 양귀자 작가의 장편동화 <누리야 누리야>를 읽고 대성통곡을 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을 처음 읽은 것도 초등학생 때였다. 집에 있던 <타나토노트>를 읽고 매료되어, 친구 집에 있던 <개미>와 <개미제국>을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 얼마후 <뇌>가 신작으로 나왔고 역시 집어삼키듯 읽었다.
영어 과외 선생님은 이문열이 평역한 <삼국지>를 열번 읽게 시켰는데, 정말 에누리 없이 열번을 읽었다. <세계문학사의 전개>라는 지금 생각하면 대체 초등학생에게 왜 읽게 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는 책도 그때 읽었다. <해리포터>시리즈도 빼놓을 수 없다. (...) 마크 트웨인의 소설부터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같은 책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12. 하루키를 처음 읽은 것도 중학생 시절이었다. <해변의 카프카>가 만 나왔을 때 학교 안에서 가벼운 하루키 바람이 불었다. 하루키 소설에 매료된 나는 곧바로 도서관에 비치된 하루키의 모든 소설과 에세이를 읽었다.-123쪽


13. 이를테면 <세계의 교양을 읽는다> 같은 인문교양 책과, <대중문화의 겉과 속>같은 사회교양 책, 셜록홈즈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영미 추리소설, 그리고 나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임레 케르테스의 <운명>같은 책도 모두 중학교 때 읽었다.(...)
첫사랑에게 실연당한 뒤 공지영과 츠지 히토나리가 쓴 <사랑후에 오는 것들>을 들고 다니던 기억이 난다 .124쪽





14. 미학에 관심을 가지게 했던 진중권의 책들, 이를테면 <미학 오디세이>나 <현대미학강의>를 처음 읽었고,
그래서 미술사와 명화 읽기에 관련된 책을 줄줄이 읽었고, <파우스트>나 <베니스에서의 죽음>, <달과 6펜스>같은 고전문학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읽어 나갔다. -125쪽








15. 돈을 열심히 벌어서 미국에 교환학생을 갈 때는 한국어 책을 몇 권 들고 갔다. 단테의 <신곡>과 <단테신곡강의>, <인문고전강의>,<그섬에내가있었네>정도가 기억난다.-127쪽




16. 책을 읽다 보면 연관지어 읽을 만한 책들이 문득문득 떠오른다. 진중권의 책을 읽다가 보드리야르의 철학서나 보르헤스의 단편집을, <세명의 사기꾼>을 읽다가 러셀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를, 우주물리학 책을 읽다가 <시간에 관한 거의 모
든 것들>을 떠올린다 - 140쪽



17. 이 글을 쓰며 책장을 바라본다. 왜인지 책장을 바라볼 때마다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한동안 바라보게 된다. 타인의 고통에 깨어 있느냐는 물음이 죽비처럼 내리친다. -155쪽

18. 밤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책 중에 한스 요아힘 슈퇴리히의 <세계철학사>가 있는데 희미한 전자책 단말기 화면으로 읽다보면 어느새 스스륵 잠이 온다. 이걸 한권으로 치기는 조금 억울한 감이 있따. 종이책 기준으로 무려 1208쪽짜리 책이기 때문이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쓴 <계몽의 변증법>의 경우에도 수록된 논문 중 세편밖에 읽지 못했지만, 그 중 '계몽의 변증법'한 편을 읽는 데에만 한달이 걸렸다 이런 책들을 접하다보면 권수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어진다.-175쪽


19. 처음 TTS로 들은 책은 조던 엘렌버그의 <틀리지 않는 법>이었다 - 185쪽

20. 2014년 4월 이동진 평론가가 팟개스트 <빨간책방>에서 전문을 읽은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소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을 잊지 않고있다. 그걸 듣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눈물이 났던 기억도, 잊지 않고 있다. -189쪽

21.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몇 개의 낭독 영상이 올라가 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편이나 톨스토이의 <안나카레리나>편, 테드 창의 <네 인생의 이야기>편,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캐롤>편 등인데, 촬영하며 가장 힘들었던 영상은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에 수록된 이진송 작가의 <건너가는 힘>편, (...)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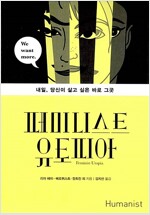

22. 이미 이 원고를 쓴 전날 밤 침대에서 마거릿 애트우드의 <시녀이야기>를 종이책으로 기어이 다 읽고 잤다. -208쪽

23. 후반부 각 챕터에서 소개하는 책




24. 가장 유명한 작품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는 수년 간 모두 합해 2,000권 정도가 팔렸을 뿐이다. 만약 모디아노가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면 모디아노는 영영 미국 독자들에게 알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288쪽

중간 중간 아주 짧게 언급한 몇몇 책들은 생략했다. 그래도...바벨의 도서관 같은 책이다..
포스팅을 하다 중간에 삭제 버튼의 유혹이..까마득한게 겨우 끝났다.
"읽으면 읽을수록 읽을 책이 까마득히 많아지는 그 역설을 공감하길 바란다." 라는 김겨울 작가의 말이 심히 공감되는
주말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