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김금희 지음 / 창비 / 2021년 5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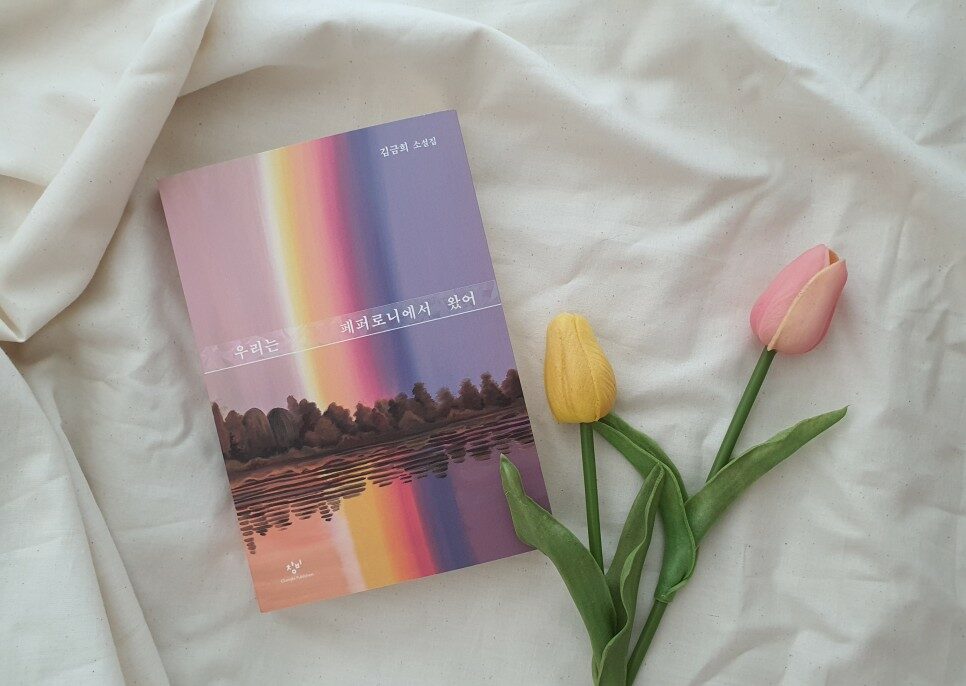
국내 단편들을 읽으면 희부윰한(이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서인지 나도 써본다.ㅎ) 감정의 뻐근함이 밀려온다. 봄이 아닌 여름이라서 오는 삶의 불쾌지수가 여름의 비 내음 같기도 하고 전 땀내 같기도 하다. 그렇듯 어떤 여름은 연속적으로 환기되기도 하고 오래전의 여름임에도 끈덕지게 달라붙기도 한다.
표제작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는 2020년 김승옥 문학상 대상작이다. 책이 있음에도 읽지 않고 있다 단편집에서 제대로 만난 셈인데 무언가 내재된 의미가 많아 보여 가벼이 읽을 내용들은 아니다. 그만큼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고 불리는 사이들과의 복잡 미묘한 감정선들 때문일 것이다.
"넌 어디에서 왔니?"라는 물음에 "페퍼로니에서 왔어."라는 뜬금없는 대답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뿌리를 지키고 정리하는 일(족보사업)이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겐 출신 배경 따위를 언급하는 일이 피로(강선)하거나 때론 위협(이기성)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야 하고 가야만 할까. 외국을 들고나고 하다 아무 곳에도 적응하지 못한 강선, 팟캐스트로 논객을 자처하다 외부와 소식을 끊어버린 기오성, 엄마의 죽음 이후 거처를 옮길 계획인 은경.
때론 지겨운 물음과 거북한 상황에 주저하고 머뭇거리더라도 나와 너는 우리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애쓴다는 것. 강선이 그렇게 기다리는 건 진짜 정말 레알 굿퍼슨이었을까. 외로움이야말로 정말 견딜 수 없긴 하지.
어디에서 왔는지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울고 싶은 기분으로 그 시절을 통과했다는 것. 그렇게 좌절을 좌절로 얘기할 수 있고 더 이상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성장이었다. -p.40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와 뿌리라는 소재로 비슷하게 얽혀 있는 <마지막 이기성>에서는 유실이라는 이름을 숨길 수밖에 없는 동포 유키코와 유학 생활의 위기가 온 기성의 일화가 등장한다. 한인 차별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구호 대신 선택한 것이 배추심기라니. 작은 땅덩이 위에 유키코가 했던 수고가 결코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았을 때 그 엄청난 떨림이란.
그 느리고 비전문적이고 헛수고에 가까운 선택에 대해서였다. 그러나 예로부터 이러한 완고한 아마추어들의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고정된 세계를 뒤흔드는 도화선이 되었다고. -p.122
등장인물 간의 껄끄러운 관계와 어설픈 시간 속을 헤집다 보니 <우리가 가능했던 여름>속 삼수생과 장의사 조교 형의 기이한 삼각구도에 우울과 짜증이 인다. 삼수생임을 누구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자신을 학대 중인 나, 의대 적응 실패 후 휴학해버린 장의사, 그런 장의사를 가스라이팅 하는듯한 조교 형. 그 시절에 우리를 지배하던 사람과 감정들은 대체적으로 불안한 시행착오를 거친다. 좋은 사람이라고 못 박고 있으면서도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모를 나쁜 사람의 행태는 장의사에게도, 조교형에게도, 삼수생에게도 있는 면이다. 그런 불안한 자기검열을 지난 후 되돌아본 그해 여름. 실패와 충동적 만남의 시작과 끝이 있었고 뜬금없는 죽음도 있었던 그해 여름의 일들에게서 분명 작가가 건네는 말을 새겼다. 스물한 살에 바친 열정이라곤 외우고 적고 또 외운 것이 전부여서 아쉽고 그 흔한 안부 인사조차 물을 수 없었던 시절의 메마름으로 안타깝다.
유일한 겨울이야기 <크리스마스에는>에는 옛 연인과 일적으로 어쩔 수 없는 재회를 하게 되지만 안 좋았던 끝이 조금은 다듬어진 얘기여서 좋았다. 나쁜 새끼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내적 성장이 이루어진 셈이니까.
함께 내려간 팀원 간의 불협화음(띠동갑의 말싸움)은 계속되고 그 화음 속에 짜증지수가 상승하자 문학동아리 선배에게서 들었던 개돼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던 순간. 그 순간을 덮어 버린 건 옆 테이블에서 울려 퍼진 덕담 가득한 소음이었다. 그 소음의 파동이 연말이라는 새해라는 시간에 섞여 들어서일까. 분명 옛 연인은 당시의 감정을 속였고 재회시엔 자신의 능력까지 속였다. 그런 점에서 재형은 욕을 처먹어도 싼 인간이지만 '나'는 그저 건,조,하,게. 응수할 뿐이다. 크리스마스였고 새해가 밝았으니까.
<기괴의 탄생>편에서는 존경하던 교수의 사생활을 비난하는 제자가 등장한다. 참고 있다 결국은 비난의 화살을 쏘아버렸지만 리애라는 제3의 인물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그러한 과정도 필요했을 것이다. 뒤에서 그런 척 아닌 척 수군거리는 대상보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한 어설픈 과정이었다고 위로했다. 참으면 분노하게 되니까.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최대한 가까이 가 볼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고 아무래도 좀 더 어두운 편에서 보는 것이었다. 나는 평소에는 크게 관심도 없는 사랑의 면면을 왜 이 여름 이렇게 고심해야 하나 생각했다. - 기괴의 탄생
<깊이와 기울기>는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등장한다. 각자 무언가 예술적인 결과물을 위해 모였지만 그들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물은 섬에 버려져 있던 르망 자동차를 굴러가게 한 일이다. 예술이 삶의 목적을 만났을 때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희망적이었다.
그런 집단체의 여름에 비하면 우리의 나날들은 너무 헤이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기억 저편에서 '낫 크라이' 하는 말이 떠올랐다. -p.263
마지막만큼은 시원하고 당당했던 단편 <초아>편에서는 세상에 적당히 편승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물이 등장한다. 어리고 여리지 않은 초아, 스스로 논객이라고 자처한 초아는 '나'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지닌 이종사촌이다. 초아는 부당함에 당당하지만 주변 시선을 외면하지 않는 덕도 갖췄다. 그것은 자기 밥그릇은 살뜰히 챙길 줄 아는 괜찮은 이기심인 것이다. 무언가에 이끌려가듯 살던 '나'는 그런 초아와의 재회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정당성을 찾아간다.
그럼에도 그 당당함의 경계는 어디까지일까. 윗집에 당당히 도배비를 달라고 얘기하는 초아의 행동은 right 이지만 삼수생이 장의사에게 불편하니 그 토스트 집에서 있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over 아닌가. ㅋ
이번 단편들에서 언급된 '좋은 사람'이란 단어를 보며 난 좋은 사람일까 보다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 시절이 보인다. 착하면 피곤하고 착하면 바보고 착하면 등신이라는 말은 현대가 만들어낸 공식이다. 초아처럼 빠손할 관계는 빠손하고 은경처럼 하고 싶은 말은 하고 살려 한다. 그렇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라는 말은 왜 이리 아픈 걸까. 사랑은 그렇듯 손해 보는 관계인가 보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