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레구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르크 로제 지음, 윤미연 옮김 / 문학동네 / 2020년 1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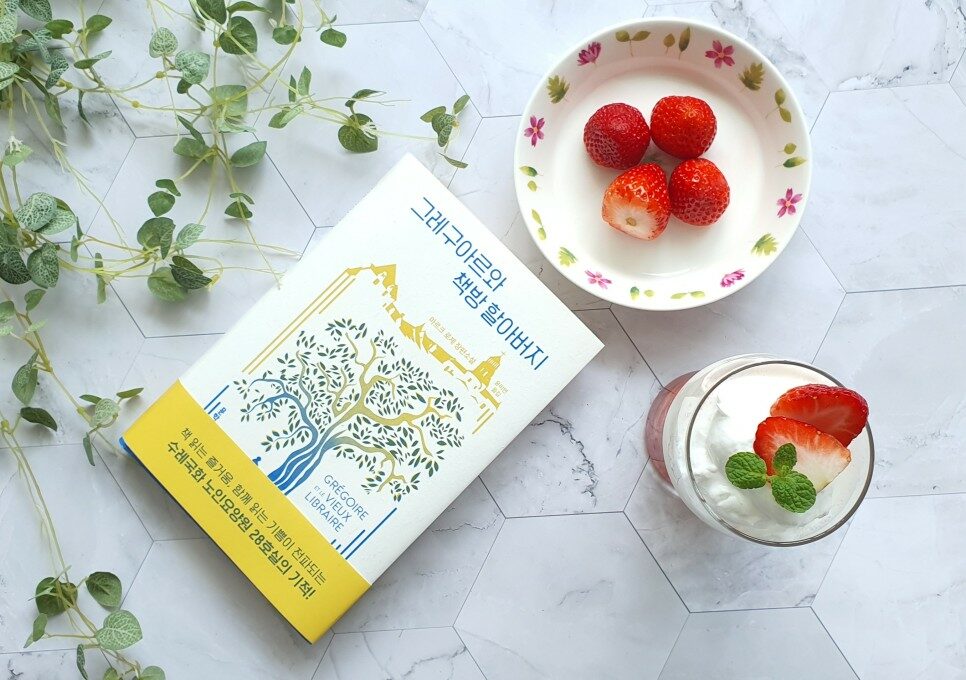
여기는 수레국화 노인요양원. 수레국화의 꽃말에 따르면 행복한 요양원 정도의 의미겠지만 어디 요양원이란 곳이 행복이란 단어와 나란히 하기 쉬운가. 인생의 종착역이자 삶을 정리해야 하는 곳에서 몸은 망가져가고 정신마저 붙잡고 있기가 힘들다.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이도 노인들을 케어하는 이도 극한의 순간들이 즐비한다. 그렇기에 어쩌면 행복보다 안도감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곳이 아닐까.
28호실 앞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문장이 적힌 문을 열면 피키에 씨가 있다. 얼마나 상실감이 컸으면 저런 문구를 붙여 놓았을까.
전직 책방지기였던 그는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맛본다. 그 많던 책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의 심정을 헤아리다가 문득 내 책장을 쳐다보았다. 여기서 더 살아도 사십 년인데 그 사십 년의 만족을 위해 꾸역꾸역 소장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친다.
그는 말짱한 정신에 몸이 불편한 파킨슨 환자다. 게다가 녹내장까지 덮쳐 그의 세상에 드리운 어둠이 점점 짙어져만 가고 있다. 그는 문밖출입을 거부한 채 식사를 따로 받는다.
그의 식사를 들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열여덟 살의 소년 그레구아르는 이 허드렛일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아직은 모른다. 겨우 이 요양원의 주방보조와 잡다한 일거리에 땀을 흘리고 있을 뿐이다. 각자의 삶에 책이 찾아오는 방식은 다양하다. 운이 따르지 않으면 평생 책과는 담을 쌓은 채 지내기도 하고 늦게라도 운을 잡은 이들은 책의 즐거움을 더 오래 만끽하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그레구아르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그는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책의 맛을 알게 된다. 피키에 씨의 작전에 말려든 건지, 책 표지가 그를 잡아 끈 건 지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피키에 씨를 위해 발을 들인 낭독의 세계 덕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한다.
전혀 교차지점이 없어 보이는 세대가 만나 접점을 찾는 매개체는 책이었다. 학창 시절의 트라우마 따윈 첫날부터 날려버린다. 소리 내어 읽은 문장들에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의 마음이 열린다. 타인의 삶에 그토록 젖어들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그레구아르는 전혀 알지 못했다. 점차 요양원 식구들 또한 28호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되고 그레구아르의 낭독 소리는 요양원 곳곳을 지나 전체를 울리기에 이른다.
피키에 씨는 좋은 선생님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책을 선별했고 그레구아르의 낭독 지도까지 더한다. 대중 낭독가로 활동해 온 작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돋보인다. 세계 곳곳. 그로 인해 책의 맛에 빠져든 이가 얼마나 많을까. 낭독하는 책들이 대부분 낯설긴 하지만 찰스 부코스키가 등장할 땐 와우~~ 했었다. 그의 어떤 책이 그리 화끈했던 걸까.ㅋ
그레구아르는 책으로 인해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얻었다.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뿐 아니라 멋진 여자친구도 생긴다. 행복한 일들이 그의 주위를 맴돈다. 하지만 피키에 씨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은 그레구아르에게는 아픔이다. 갈 시간은 다가오고 피키에 씨는 그걸 핑계 삼아 그레구아르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긴다.
피키에 씨는 생의 마지막을 아주 훌륭하게 끝맺음했다. 책방지기로서 책과 연이 없던 청년에게 낭독의 즐거움과 책의 맛을 전하고 떠났으니까.
그레구아르 또한 다시 걸어 나갈 것이다. 문학의 모험 속으로. 그리고 얻게 될 자신만의 삶 속으로.
최근 나도 오디오북을 즐겨 듣고 있다. 산책할 때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아마 눈이 침침해질 나이가 되면 더욱 즐겨듣고 있지 않을까. 그렇담 청력은 좋아야 할 터인데.ㅋ
책은 이렇듯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것이 문학의 힘이라고 했던가. 내가 죽은 뒤에도 책은 인간의 삶에 남아 인간성을 회복하는데 애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피키에 씨를 게이로 설정한 걸까. 험한 세상을 견뎌온 자의 내공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