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 월
존 란체스터 지음, 서현정 옮김 / 서울문화사 / 2020년 4월
평점 :

품절


콘크리트 바다 바람 하늘
바다 바람 하늘 + 언덕이었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리겠지만 이곳엔 언덕 따윈 없고 차가운 콘크리트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 왜 이곳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는지 친절한 설명은 없다. 단지 이야기 흐름 속에서 단서를 찾고 추측할 뿐이다. 세상은 대격변(종말)을 겪었고 어떤 무리는 살아남아 벽을 세웠고 그렇지 못한 무리는 세상을 떠돈다. 더 이상 지구촌은 하나가 아니며 생존을 위한 투쟁만 남는다.
벽안의 사람들은 벽안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벽을 지키는 일을 중시한다. 세상은 이분법화되었다. 살아남은 자와 떠도는 자, 벽을 지키는 사람들(경계병)과 벽을 넘으려는 사람들(상대), 벽 이전(기성세대)과 벽 이후(우리), 빼앗기는 자와 뺏는 자, 작게는 벽 위의 시간(근무)과 이후의 시간(제대).
먼 미래 어쩌면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르겠다. 세상은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혼란으로 사람들은 분열된다. 망가진 지구에서 더 이상 인간의 존엄과 인간다운 삶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천연자원은 바닥나고 물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귀해진다. 대격변이전 시대의 삶(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사라진지 오래고 가진 것만이라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방어벽을 치고 지켜야만 한다. 디스토피아 소설이 그렇듯 출산도 쉽지 않다. 대격변 이후의 가정의 개념 또한 달라진다. 콘크리트 벽만큼의 세대 간의 벽이 세워졌고 남녀 간 사랑보다는 번식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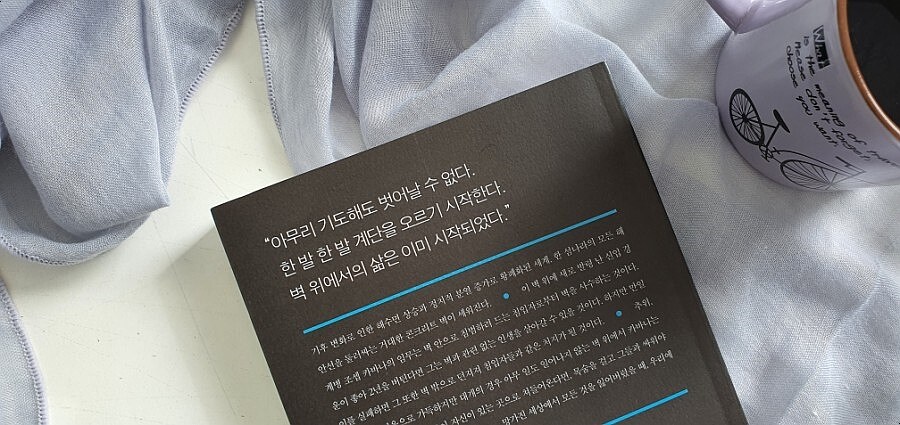
벽안의 사람들은 벽을 지키기 위해 2년 동안 복무를 해야만 한다. 선택지는 없다. 해야만 하는 것이다. 카바나도 두려움을 안고 벽 위의 첫 발을 내디뎠다. 추위와 긴장과 싸워야 하지만 진짜는 상대(침입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상대들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 바다로 추방된다. 상대들을 막지 못했기에 그들과 같은 삶으로 내몬다. 거의 사형선고다.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기에 사회적 대우도 다르다.
벽만 바라보고 서 있는 곳. 보이는 거라곤 바다와 하늘 피부로 와닿는 거라곤 바람(추위). 머릿속으로 전해지는 울림은 두려움. 그는 시간을 계산한다. 계산하면 더 빨리 지나갈 것처럼. 12시간 근무를 하고 교대를 서는 일을 반복하는 동안 시간의 흐름만 기억한다. 하지만 시간은 더디다. 오히려 몸을 움직이는 훈련은 긴장감을 주지만 지루하진 않아서 할만하다. 하지만 삭막해 보이는 그 공간에도 온기가 있다. 그냥 인사하고 싶어서 온 거야.-p. 59라며 먼저 온기를 전하는 동료와 근무 시 따뜻한 음료를 배달하는 조리사(그녀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웠다), 그와 썸을 타게 되는 히파는 군 복무 생활을 좀 더 산문에 가깝게 해 준다.
그는 대위와 병장의 지도 아래 조금씩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간다. 스스로 특별하고 싶었지만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은 차츰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위안을 얻게 된다. 다만 적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은 의문이 든다. 그가 그들의 고달픈 삶을 잠시 떠올리는 모습은 분명 연민이었으니까.
누구보다 대원들을 챙기고 임무에 충실한 대위는 그가 본받고픈 인물이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훈련은 대원들끼리 더욱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격변 중이고 안전을 찾아 떠도는 자들은 벽을 넘으려 한다. 그리고 폭풍이 치던 어느 날, 정전이 되던 어느 날, 벽에서 긴박한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다.
망가져버린 세상에서 누구는 살아남고 누구는 죽어야만 한다면 인간 세상은 나아갈 수 있을까.
벽은 물리적인 의미보다 상징적인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더 이상 품어주지 않는, 선택당할지 말지에 놓인 세상은 오래 유지될 수가 없다. 대위가 강조한 거짓 없는 세상. 혹은 거짓으로 세워진 세상 또한 서로를 품을 수 없다.
카바나는 바다 위에서 해적을 만난다. 치열한 생존의 끝은 동물처럼 본능만 남는다. 그는 눈앞에서 그런 현실을 보았다. 동료를 또 한 번 잃고 가까스로 살아남은 그는 히파와 함께 떠돈다. 희망을 찾아 내려가는 남쪽. 기적과 같이 그들 앞에 도움의 사다리가 내려진다. 그가 벼랑의 끝에서 본 희망의 사다리 앞에서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더 이상 인간의 믿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사다리를 타고 오른다. 그들이 만난 생존자는 카바나와 히파에게 인간 등불인 셈이다. 그들이 진짜 등불을 밝히며 그 아름다운 불꽃에 온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분명 그들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았을 것이다.
그렇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난민, 불법 이민자, 나라 간 장벽,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자국 이기주의, 세대 간 갈등 등은 여전히 진행 중인 이야기다. 서로가 잘 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그런 이슈들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그것이 진정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제임을 잊어선 안된다. 우리가 벽을 세울지 말지를 결정했다면 그 벽을 넘을지 무너뜨려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우리 자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