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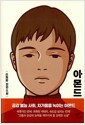
-
아몬드 (양장) - 제10회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작
손원평 지음 / 창비 / 2017년 3월
평점 :

절판

같은 말을 계속 되뇌면 그 말의 뜻이 어느 순간 흐릿해지는 순간이 온다 . 그러다 어느 순간 글자는 글자를 넘어서고 , 단어는 단어를 넘어선다 . 아무런 의미도 없는 외계어처럼 들린다 . 그럴 때면 , 내가 헤아리기 힘든 사랑이니 영원이니 하는 것들이 오히려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했다 . 나는 이 재밌는 놀이를 엄마에게 소개했다 . 그러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
ㅡ 뭐든 여러 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 처음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더 지난 뒤엔 변하거나 퇴색되는 것처럼 보이지 . 그러다가 결국 의미가 사라져 버린단다 . 하얗게 .
ㅡ본문 중에서 ㅡ
최근 한 애니를 보다가 알아진게 있는데 , 이상하게도 몰입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면서도 왜지 , 왜 이렇게 와 닿지 않는거지 하는 고민을 했었다 . 나중에야 그 감정이 서로 밀고 당기는 감정 이란 걸 깨달았다 . 웃긴 건 애니 속 주인공 둘이 모두 지독한 몰입을 각자의 방식으로 하느라 사랑을 퍼주고 있는 상황임에도 정작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임을 모른다는 사실이었고 , 밖에서 극을 보는 나는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슬퍼만 하는 그들처럼 왜 그래? 했던 거였다 . 겉의 사랑만 보고 안의 사랑 , 사랑함으로 생기는 오해와 이해들을 그들처럼 몰랐다 . 아니 정확히는 그 감정을 잊었던 거라고 해야할까 ?
타인의 감정은 물론이고 자신의 감정조차를 모르는 편도체 이상을 가진 윤재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입장에선 오히려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나는 했다 . 사랑이란 감정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부분이 내겐 죽어 있었다 . 내 안에 있는 감정도 그렇게 죽고 다시 살려지고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상 , 혹은 비정상이라 부르는 것들이 단지 우리의 편견 가득한 학습으로 무뎌진 한 부분 아닌가 하면서 .
곤 (이수)이와 도라 ㅡ 그 둘과의 만남은 필연적이면서도 극적이었다 . 곤( 이수) 은 보통 애들과 다른 윤재를 처음엔 괴롭히는 걸로 호기심을 표현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자기 힘만 빠질 뿐이란 걸 알고는 괴롭힘을 멈추고 친구가 된다 . 고립되지 않는 방향 ㅡ즉 학교를 선택하고 그 선택은 만남을 불러온다 . 사춘기랄 수있는 시기에 도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소녀를 알게 되고 그 애로부터 점차 주위의 모든 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바람 , 다른 냄새 , 다른 색깔을 가지고 다가들며 그것들이 자신에게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좁고 좁던 윤재의 세상도 그들 덕에 넓어진다 . 어쩌면 그의 뇌는 오랜 시간 배워서 축적된 학습으로 기능이 확장된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게보면 이야기가 무척 시시해지겠지 ?
엄마와 할머니의 지극한 정성에도 꿈쩍 않고 로봇같기만 하던 윤재가 드디어 감정의 물결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걸 본다 . 이쯤되면 경험이 선생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 하면서 . 모성이라고 불리는 그 대단한 사랑으로도 일깨우지 못하던 부분을 , 때가 되니 알게된다는 건 이 소설에서 감동 부분을 맡고 있었겠지만 , 나는 역시 조금 억지스러움을 느꼈다 . 아 , 난 끝까지 괴물로 자라는 윤재를 기대한 걸까 ? 모르겠다 . 그 걸 .
처음엔 윤재가 무서운 괴물로 자랄까 걱정됐지만 다행이 부모가 없는 자리에 이웃들이 있어서 일상을 따듯하게 이어가는 걸 본다 . 할머니가 말했듯 그저 이쁜 괴물로 자라는 게 기특해 나 역시 엄마 미소를 지으며 보게 된다 . 곤을 도우려다 다치는 부분에선 아슬 아슬하고 뭉클한 감정도 만난다 . 모두 다치지 않고 좋은 관계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 어떤 것은 많이 손상된 후에야 진심으로 마주치게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이란 걸 받아들이게도 되는 걸 보면 인생이란 어쩌면 불행이란 진창과도 같은 늪에서 힘들게 한 발 한 발을 빼는 것이 아닐까도 싶었다 .
처음부터 있지 않던 기능적 이상을 안고 사는 윤재와 처음부터 당연한 것처럼 감정을 갖고 살던 곤과 곤의 아버지가 그것들을 망가뜨리면서 다시 찾는 과정을 통해 작가는 표현 불능 같은 건 후기 학습의 결과로도 나올 수있고 또 그것들은 불치가 아닐 수도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고 느낀다 . 나도 내 말라죽은 감정에 아몬드를 주면서 그것들을 꼭꼭 되씹으며 내 안에 잠든 아몬드 싹을 틔워야겠다고 그렇게 느꼈다 . 쌉싸름하며 고소한 한 웅큼의 시간이었다 . 이 아몬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