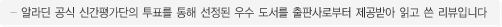[알렉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알렉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알렉스 ㅣ 형사 베르호벤 추리 시리즈
피에르 르메트르 지음, 서준환 옮김 / 다산책방 / 2012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두께에 밀려 손대기 힘든 마음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몰입하게 되는 책이 있다. 내가 만난 이 책 『알렉스』가 그랬다. 표지마저 눈길을 끌어 더더욱 궁금증으로 시작한 책이었는데 결국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면서 동시에 눈물마저 흐르게 하는 이 책의 정체가 무엇인지…….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그녀, 알렉스가 저질러놓은 일들의 결과만으로는 아무 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알렉스가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 감춰진 의미들에 대해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다. 이 책의 내용도, 알렉스의 이야기도.
실종된 한 남자의 아버지가 한 여자를 납치하면서 이유를 알고 싶어지게 하는 이야기가 시작이다. 왜 그녀를 납치했는지, 그녀를 납치한 그 남자는 누구이며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가야 할 것들로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런데 단순히 한 여자의 납치사건으로 알고 수사를 시작한 일들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간다. 납치되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탈출한 그녀의 신원은 아무도 파악할 수조차 없었고, 납치한 이의 행방은 묘연하다. 뭐, 결국엔…….
그녀의 이름이 나탈리이자 레아이자, 로라, 줄리아, 엠마, 끌로에인 이유. 정작 자신의 본명인 알렉스라는 이름은 마지막에 가서야 드러난다. 알렉스는 매번 다른 이름으로 남자들을 만나고, 그 남자들을 살해한다. 살해 방법도 잔인하다. 연장을 이용해서 머리를 강타하고 마지막에서는 꼭 입안으로 농축된 아황산을 들이 붓는다. 그녀는 왜 그 남자들을 살해했을까, 많은 살해 방법 중에서도 유독 그런 잔인한 방법을 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읽는 내내 갖게 한다. 도대체 왜?
그게 추리소설의 매력인 것 같다. 모든 사건을 앞에 두고 궁금해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독자는 그 이야기의 시선들을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특이나 이 소설은 계속되는 살인의 나열에 속이 거북하기까지 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갈 수밖에 없었다. 잔인한 그녀의 살인을 즐겁게 구경하는 것이 아닌, 그 이유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카미유 반장의 죽은 모친이 남긴 그림 경매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카미유 반장의 사적인 이야기와 알렉스의 이야기 그리고 수사과정이 타이밍 절묘하게 교차적으로 들려온다. 카미유 반장이 들려주던 자신의 슬픈 이야기는 어머니가 남긴 그림을 처분하면서 모든 아픔을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알렉스의 살인과 수사과정이 진행될수록 드러나던 알렉스의 이야기는 상처로 더 깊게 들어가는 계단이었다. 그렇기에, 아픔과 슬픔 그 사이에서 축적된 분노, 결국은 그 분노를 터트려야할 시기가 오고야 말았기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장면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왜?’라는 의문에 마침표는 찍어줄 수 있기에, 그 ‘왜?’에 대해서 독자로 하여금 눈물과 분노가 동시에 터트려지게 만드는 공감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씁쓸할 뿐이다.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이 책 안에 농축되어 꾹꾹 눌러서 가득 담겨 있는 것만 같다.
처음 남자에게 납치된 상태에서 알렉스는 묻는다.
"왜 나인가요? 왜 하필 나예요?"
남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왜냐면...... 너니까."
계속되는 살인에서 죽어가는 남자들은 알렉스에게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것이다.
"왜 나인가요? 왜 하필 나예요?"
그럼 알렉스는 그 남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겠지.
"왜냐면...... 너니까."
남은 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할 진실과 처벌일 텐데,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긴다. 마지막 장의 문구처럼 진실보다 정의라는 미덕이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