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초콜릿 우체국' 두 번째 이야기인데, 책의 부제로는 '38 True & Innocent Lies'이니 현실인 듯도
하지만, 환상인 듯도 한 그런 짧은 이야기이다.
특히, 명작 속의 문장을 근거로 하여 한 편의 짧은 이야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명작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발췌해서 인용된 문장의 뒷 이야기, 숨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이지만 그런 이야기는 황경신이 만들어 낸 이야기일뿐이다.
작가, 소설가, 음악 등의 이야기의 밑바탕이 되는 그런 이야기와 사랑과 이별, 남자와 여자, 그런 주제를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만들어 놓았으니, 황경신의 글쓰기의 독특함을 알지 못한다면 꽤나 혼란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때로는 동화나 우화와 같은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읽다보면 허무맹랑하게 생각되기도 하고, 때론 사랑과 이별에 대한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생의 마지막 날에 악마가 찾아오고, 뒤이어 천사가 찾아온다면...
셰익스피어와 슈베르트가 시공간을 무시하고 찾아온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를 재조명해 본다면...
마음을 파는 가게가 있다면....
작가에게 상상력은 얼마든지 시공간을 뛰어 넘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그 이야기들을 읽어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런 류의 이야기들에는 별로 공감을 받지 않기에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황경신의 글은 글을 책을 많이 읽지 않은 독자들의 성향에는 좀 맞지 않는 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나 역시 다음에는 황경신의 신작을 선뜻 읽으려는 마음이 들지는 않을 것 같다.
" 가로수 녀석의 말이 옳다. 행복이나 불행은 개념일 뿐이고, 나는 애초에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저 거리에 서 있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 가로수
녀석이 어린 싹을 재촉하고 있는 날,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느긋하게 하늘이라도 한 번 올려다 보는 날, 먹이를 쫓전 비둘기들이
가끔 걸음을 멈추고 멍하게 서 있기도 하는 날, 나는 그 소녀를 떠올려본다. 언젠가 시작되고 언젠가 끝이 난,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상상해
본다. 그리고 나, 하나의 우체통, 거리의 마음은 지금도 같은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본다. 그대와 나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마음의 거리를
가늠하며, 오늘도 시를 쓴다. " (p.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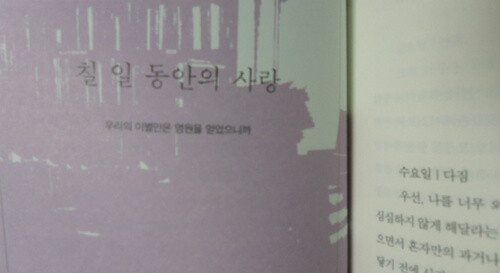
"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건 없잖아. 그게 사랑이든, 삶이든, 늦기 전에, 나이 들기
전에, 현명해지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기 전에, 또 죽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밀함을 나는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 그것이
비록 소유할 수 없는 것을 소유했다는 착각에서 나온 것일지라도. 난, 사랑은, 하나의 생명처럼, 살아 있는 것이라고 믿어. " (p.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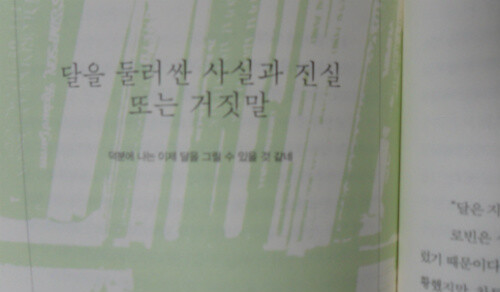
" 이별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과 같아. 너무 성급하게 마시면 마음을 데고, 너무
천천히 마시면 이미 식어버린 마음에서 쓴 맛이 나. 이별을 잘 견딜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 하지만 겁먹을 필요도 없어. 지금 네가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다하면, 시간이 흐른 후에도 향기는 남는 거니까. " (p.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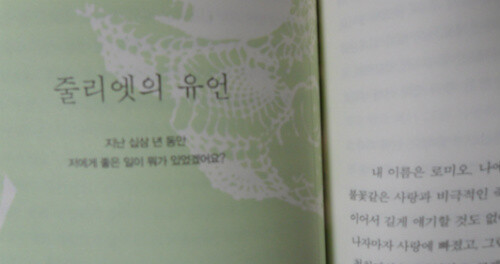
" 지나가지 않는 마음은 없다. 그것이 아무리 간절한 그리움이었어도. " (p.
195)
" 지나가지 않는 사랑은 없다. 그것이 천 년의 기다림 끝에 온 사랑이라 해도.
그리고 그때는 하지 못했던 말.
'지금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금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지금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이는 것. 그대가 망설이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것. 영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 그건 어쩌면
앞으로도 영원히 하지 않을 말. " (p. 196)

" 우리가 서로를 미치도록 갈망했던 건, 우리가 서로를 만나기 전부터 간직하고 있었던
외로움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외로움은 우리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던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너ㅜ나 사랑하여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나 자신이 되었을 때, 우리의 외로움은 우리 속에 그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리고 무성한 가지에 무수한 잎을 매달아 우리들을 깊은
그림자 속에 가두어 버렸다. 우리가 헤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 때문이었지. " (p.
215)

" 사라지는 것들은 언젠가 한 번 존재했던 것들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은 사라질 수
없다. 그리고 그들이 세계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내 마음 어딘가에 그 파편들이 남아, 가끔 내 심장을
콕콕 찌르는 것을 느낄 뿐이다. " (p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