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출간되었던 책이 갑자기 베스트 셀러에 올라왔다. 영화 <안녕, 헤이즐>의 개봉때문이다. 영화 속의 감동을 원작
소설에서 찾으려는 데서 오는 현상이다.
혹시나 이 소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그만큼 현실 속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실감이 느껴지는 소설이다.
그러나, 작가는,
" 이 책은 픽션이다. 내가 만들어 낸 내용이다. (...) 우리 인류가 기본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가공의 이야기도 현실적일 수 있다. " ( 작가의 말 중에서) 라고 말한다.
또한, 작가는 암을 비롯한 불치병에 걸린 소설이 그동안 많이 출간된 것을 의식했는지, 이 책의 여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 암이야기란 원래 재미대가리 없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사람은 누구에게나 찾아 올 죽음의
부작용일 뿐이다." 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일침을 놓기도 한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과연 그렇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죽음을 앞 둔 사람들의 이야기는 소설 뿐만 아니라, 에세이, 자기계발서
등을 통해서 쏟아져 나왔고, 여전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읽었던 책들이 쌓아 놓으면 내 키를 넘을테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미 비포 유 / 조조 모예스 ㅣ 살림출판사ㅣ
2013>도 읽은 후에 한참을 생각에 잠기게 했으니까.
헤이즐의 입을 통해서 작가는 " 암이야기란 원래 재미대가리 없는 거 아닌가? "
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 책은 암과 암환자의 이야기를 뛰어 넘어
십대 청소년의 아름답고 슬픈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이란 명제를 생각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슬프지만,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서는 말기암이란 죽음
앞에서도 솔직하고,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더 가슴이 아픈 소설이다.
헤이즐과 거스는 십 대 암환자들의 만남인 '서포트 클럽'에서 만나게 된다. 헤이즐은 16살로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폐까지 전이되어서
튜브에서 산소가 나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산소 발생기를 끼고 다닌다.
어거스터스 워터스(거스)는 17살로 골육종에 걸렸지만 지금은 암의 진행이 멈춘 상태로 친구인 아이작을 따라서 '서포트 클럽'에 왔다가 한
눈에 헤이즐에 반하게 된다.
" 넌 2천 년대의 나탈리 포트만 같아."
(p.22), <브이 포 벤데타>에 나오는 매력적인
여인인 나탈리 포트만을 닮았다는 헤이즐, 그들은 그 날 거스의 집에서 이 영화를 같이 본다.


(사진 검색 : Daum )
그리고 서로 좋아하는 책을 교환하여 읽게 된다. 헤이즐은 피터 반호텐이란 작가가 쓴 <장엄한 고뇌>를 , 거스는 <새벽의
대가>를 서로 추천하여 읽게 된다.
헤이즐이 읽게 된 <새벽의 대가>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살인이 난무하는 그런 시리즈물인데, 물론 헤이즐의 취향은 아니지만 그
후편까지 구입하여 읽게 된다.
'좋아하면, 취향도 닮아가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장엄한 고뇌>란 소설은 소위 말하는 '열린 결말'이었는지, 결말이 확실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다. 주인공 안나는
죽었는지?, 안나의 엄마는 어떻게 되었는지?, 네덜란드 튤립맨은 사기꾼인지?, 클레어와 제이크는 어떻게 되었는지?
몇 년째 헤이즐에게 궁금증으로 남아 있는 소설 속의 끝부분에 대한 의문들....
이를 알기 위해서 거스는 기부단체에서 암환자들에게 주는 행운의 소원을 네덜란드에 가서 피터 반호텐을 만나는 여행에 쓴다.
이런 과정에서 헤이즐과 거스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암투병을 하는 이야기가 잔잔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려진다. 그
끝은......
" 사람들은 암환자들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도 그런 용기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나
역시 몇 년이나 바늘로 찔리고 칼로 찢기고 약물을 투여당하면서 어떻게든 버텨 왔으니까.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그런 순간마다 나는 매우, 대단히
기쁘게 죽어 버리고 싶었다. " (p. 114)
" 난 내가 싫어, 난 내가 싫어, 이게 싫어, 내가 혐오스러워, 이게 싫어, 이게
싫어, 이게 싫어, 빌어먹을, 그냥 죽게 해 줘." (p. 258)
헤이즐이 아니면, 거스가 아니면, 안암으로 장님이 되는 아이작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말기암 환자들의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를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재치있게, 때로는 아프게 작가는 그려낸다.

이 책에서 가장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니 가장 아름다운 내용은 헤이즐은 거스를 위해서, 거스는 헤이즐을 위해서 추도사를 써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에게는 죽음이란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에 자신의 장례식이나 추도사 등을 언급하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말기암 환자인 그들이
자신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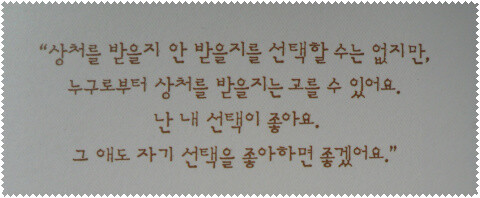
그들에게는 아주 짧은 생이겠지만 거스가 말한 것처럼 0과 1 사이에는 소숫점을 비롯한 무수한 숫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짧은
10 여 년의 삶이 그 누구의 삶 보다도 더 긴 무한대의 순간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