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의 맛>은 처음 이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에도, 책을 읽는 도중에도, 책을 다 읽은 후에도, 여러가지 의문이 남는
책이다.
이 책의 장르는 여행 에세이, 책 소개글에서는 구태여 '여행'이란 단어를 빼고 '소설가 김사과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라고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세계적인 몇 몇 도시인 뉴욕, 포르투, 베를린 그리도 또다시 뉴욕이란 도시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행 에세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행이란 단어를 빼고 책을 읽는 편이 훨씬 작가의 속내를 더 잘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설탕의 맛'이라고 하면 달착지근한 그런 맛을 생각했다. 그런데 작가는 서문에서,
" (...) 머리가 멍해지는 설탕의 맛이다. 이 책은 그 맛에 대한 이야기다. "
라고 말한다.
'머리가 멍해지는 설탕의 맛', 그런 맛을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맛을 찾고자 했지만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
맛이 내가 찾은 맛인지 아닌지는 이 책을 덮으면서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하게 남는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했던 '김사과'라는 소설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겼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이런 문장을 보게 되었다.
'문제적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소설가 김사과'
라는 글이 보이는데, 이 책 속에는 작가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런 도시들을 찾았음을 이야기한다.
작가의 아버지는 1960년에서 1980년, 약 20년간 해외에 체류한다. 그래서 집안은 해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었다.
작가는 1984년생으로 젊은 작가인데, 2005년 단편소설 '영이'로 창비 신인소설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한다.
2007년 한국 문화예술 위원회에서 젊은 작가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집필을 하는 목적으로 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녀는 뉴욕에 가서
소설을 쓰기로 한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한 권의 장편소설을 들고 오게 된다.
이 책은 2007년 소설 리서치를 위해서 뉴욕에 가기 전에 체코의 프라하에 들리게 되는데, 사회주의의 그림자가 짙게 깔린 중부 유럽 체코의
프라하에서 두 달을, 자본주의의 최전선인 미국의 뉴욕으로 세 달을 머물면서 그녀의 두 번째 장편소설을 쓰게 된다.
" 도시와의 헤어짐은 사람과의 헤어짐에 비하면 슬픈 것이 없다. 그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돌아가면 되니까. 어 그러면 되니까." (p. 72)

그리고 잠깐 샌프란시스코...
" 화장실 세면대 타월의 다양함. 그게 어쩌면 내가 이번 여행을 통해 경험한 모든
것이다. (...) 그리고 지금 나는 내 모험 속에 들어 있다. 내가 선택한, 내가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종류의 세면대 타월로 이루어진.
시시하고 멋대가리 없는, 나의 모험." (p.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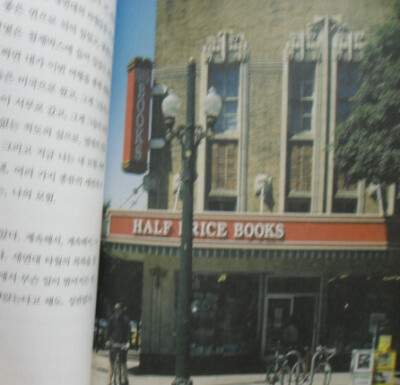
김사과는 2007년에는 뉴욕에서 두 번째 장편소설을 쓰게 되고, 2009년에는 통영을 꼭 닮은 포르투갈의 포르투에서 세 번째 장편소설을
쓰고, 베를린에서는 네 번째 장편소설을 완성한다.
그리고 다시 2012년에는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소설을 쓴다.

작가의 글을 인용하면,
" 행군같은 여행이 아니라, 머무른 것인지 떠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길고 임시적인
이동" 을 통한 여행이 아닌 그렇다고 해서 생활인도 아닌, 이방인의 시각으로 그 도시의 일원이 되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의 인연을 맺고, 작품활동을 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서 소설가 김사과를 처음 알게 되었기에 작가의 소설을 아직 접해 본 적이 없다. 그런데, 평이한 소설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제대로 읽으려면 일정량의 각오와 결단과 열량공급이 필요한 김사과 작가의 소설들과
달리, 이 에세이는 작가의 다른 면모를 보여주어 신선하다. 여러 칼럼과 인터뷰 등에서 느낄 수 있듯이, 김사과 작가의 신중하고 논리정연하며
똑똑한 글은 아프고 부끄러운 곳마저도 주저 없이 한 방에 찌르는 과단성이 있다." (인터넷 책 소개 글
중에서)
<설탕의 맛>을 읽으면서 이 책은 분명 에세이라는 장르이지만, 어떻게 읽으면 한 편의 소설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글까지 읽게 되니 한 번쯤은 김사과의 소설들을 읽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기존의 여행 에세이를 읽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스타일의 에세이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접한다면 '머리가 멍해지는 설탕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들이 바로 그런 설탕의 맛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