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읽는 <독일인의 사랑>
또 한 권의 <독일인의 사랑>을 소장하게 되었다. 더클래식에서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나오는 '더클래식 세계문학 컬렉션 008>을 사게 되었다.

책값도 싸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책이다. 세계적인 명작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막스 뮐러는 '겨울 나그네'의 독일 낭만파 시인 프리드히 막스 뮐러의 아들이다. 그는 1856년에 <독일인의 사랑>을 썼지만 1857년에 작가미상으로 발표를 한다. 그런데 그 반응은 좋았고 세월이 흘렀건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작품으로 남아 있다. 막스 뮐러가 남긴 단 한편의 소설이기도 하다.
<독일인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받는 이유는 시적인 문체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감수성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책을 읽다보면 시처럼, 음악처럼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준다. 주인공 '나'의 회상을 통해서 마리아와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펼쳐지지만, 그 이야기는 비교적 담담하게 써 내려간다.
" 흠뻑 젖은 강아지가 물을 털어내듯 우리의 기억을 모두 털어내더라도, 남는 그 장면들은 기묘한 장면 몇 개뿐" (p. 11) 이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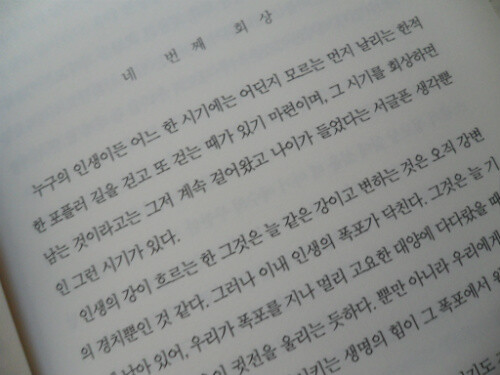
이 책의 내용은 어린날의 기억을 따라가면서 첫 번째 회상을 시작으로 여덟 개의 회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의 나와 마리아. 구성도 간단하고 두 주인공을 제외한다면 아주 적은 인물들이 잠깐 등장할 뿐이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의 맑고 고귀한 사랑은 별다른 갈등구조 없이 전개된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순수하고, 아주 맑게...
그러나 결코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적인 슬픈 사랑이야기이지만 그 슬픔이 더 아름답게 비쳐지는 것이다.
세 번째 회상에서 나는 마리아를 알게 되고 그녀는 자신이 죽을 때 가지고 가려고 했던 반지를 나에게 건네 주는 것이다. 나는 그 반지를 다시 돌려주면서 "네 것은 곧 내 것"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회상에서 세상을 떠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한 통의 편지를 남겨 주게 되는데...
낡은 종이에 싸인 '주님의 뜻대로'라고 새겨진 반지가 들어 있는 것이다.
그 종이에는 "네 것도 모두 내 것이야. 너의 마리아로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덮기 전에 밝혀지는 마리아를 돌보던 의사 선생님의 몇 마디의 말은 어린시절부터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사랑의 마음을 키웠던 나의 사랑과 오버랩이 되어 가슴에 남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 <독일인의 사랑>은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가 가끔은 꺼내서 읽어 보게 되는 책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마치 시처럼 아름답고, 음악처럼 운율을 가지고 있기에 영롱한 구슬처럼 반짝인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시리도록 슬프기도 하지만, 마음이 환하게 밝아오기도 한다.
이루지 못한 사랑이 이처럼 아름답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