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르는 여인들
신경숙 지음 / 문학동네 / 2011년 11월
평점 :



<모르는 여인들>의 작가 신경숙은 오래된 친구와 같은 느낌이 드는 작가이다.
신경숙의 작품이라면 빼놓지 않고 읽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작가이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리라.
이번에 출간된 <모르는 여인들>은 그동안 작가가 침울하거나 혼란스러울 때마다 써 두었던 단편소설 7편이 실려 있다.
장편소설은 장편소설대로의 느낌이 있고, 단편소설은 단편소설대로의 느낌이 있는데, 이 책에 실린 7편의 단편은 짧은 호흡으로 읽어 내려가기는 하지만, 읽은 후의 여운은 장편소설보다 더 길게 남는 것이다.
우린 어쩌면 모두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기야, 내가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린 나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도 무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우리는 소통의 단절, 소통의 부재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하기는 한 것일까?
<모르는 여인들>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이런 생각을 하게 해준다.
<그가 지금 풀숲에서>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소통이 없는 관계이다.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적에는 시어머니가 하는 같은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들어주던 아내였지만, 시어머니의 죽음이후에 아내는 이상한 버릇이 생기게 된다. 버릇이라기 보다는 <외계인 손 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린 것이다. 아내의 의지와는 다르게 움직이는 왼손, 때론 남편에게 폭력까지 가하게 되는 왼손.
그 왼소은 왜 아내의 의지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일까?
남편은 소통이 없는 사람이었고, 아내의 어떤 질문에도 단답형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항상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사는 남편.
" 아내의 왼손은 아내의 마음이기도 한 것인가. 아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말의 대신이기도? (....) 밤의 풀숲에 버려지 채 그는 처음으로 아내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다. " (p116)
<숨어 있는 눈>에서의 남편과 아내도 별로 다르지 않다. 아내가 어느날부터 길고양이를 집으로 데려 오게 되고, 집안은 고양이로 난장판이 되어가고. 7마리까지 고양이가 늘어나자, 남편은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가게 되고, 고양이들은 다른 집으로 입양이 되고, 남편이 돌아 오지만, 또 아내는 길고양이들을 한 마리, 한마리 집으로 데려 오면서 21마리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들 부부 역시 아내가 집을 나간 후에야 서로가 얼마나 무심한 관계였던가를 알게 된다.
<어두워진 후에>는 어머니, 할머니, 자폐인 형이 살해당하는 살인사건 현장에 없었기에 홀로 살아 남은 남자가 세상을 떠돌아 다니다가 어느날 우연히 만나게 되는 절 입구의 매표소 판매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보는 이야기이다.
별 생각없이 거절 당할 줄 알면서 매표소 판매원에게 표를 살 돈이 없으니 그냥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 본다. 의외의 대답인 그렇게 하라고 한다. 절에서 내려와서 또 거절당하리라는 생각에 배가 고프니 밥을 사줄 수 있냐고 한다. 그녀는 잘 아는 식당으로 함께 간다. 맛있는 저녁후에 잘 곳이 없다고 하니, 선뜻 자신의 집으로 안내한다. 아침 밥상에, 그리고 헤어지면서 버스비까지 얻게 된다.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에게 거절당할 줄 알면서 내민 손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자는 자신이 떠났던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남모르는 사람도 선뜻 받아주는 그 친절을 남자는 가족들에게 과연 하였던 것일까.
(다음은 신경숙 작가의 인터뷰 기사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신경숙 작가의 소설집 <모르는 여인들>에 수록된 <어두워진 후에>라는 단편은 연쇄살인범에게 가족을 잃은 한 남자가 처음 만나는 여자에게 위로받고 삶의 빛을 보게 되는 내용이다. 사실 여자가 베푸는 호의는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타인에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자가 이런 생각을 말했더니, 신경숙 작가는 “그럼 연쇄살인범 같은 사람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라고 반문한다. 연쇄살인범 이야기는 뉴스나 영화에서 익히 봤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온정을 베푸는 사람의 이야기는 마땅히 기억나는 게 없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전자는 사건이고 후자가 일상이어야 맞다.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가.
“사실은 타인에 대한 선의가 판타지처럼 느껴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야 하는 삶이고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본모습이잖아요. 타인에 대한 온기는 본래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인터뷰 기사 중에서)
이 책에 실린 단편소설들을 읽으면서 소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또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된다.
우리들은 언제부턴가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다가, 이젠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입을 닫아 버리기도 한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도 하지 않게 되어 가고 있다.
얼마전에 일어난 중학생 자살 사건을 통해서도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다. 13살 어린 학생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부모에게, 아니면 운동도 잘 한다는 형에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떠나면서도 가족을 챙기는 그 마음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왜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까.
부모와 자녀는 왜 대화의 문을 닫아 버렸을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 책의 표제작이기도 한 <모르는 여인들>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아내는 집안일을 하는 가사 도우미와 노트에 글을 적는 것으로 가사일에 대하여 일을 시키고, 도우미는 그 노트를 보면서 가사일을 하고, 자신이 필요한 것들은 그 노트에 적으면서 아내와 가사도우미는 소통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가사 도우미가 집안일에 익숙해지자 아내와 도우미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적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내가 병에 걸리고, 남편의 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에서야 남편은 아내가 가사 도우미와 의사 소통을 하던 노트를 발견하게 된다.
그 노트를 가지고 찾아온 옛사랑인 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남편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 (...) 자기를 위해서 아무 것도 하지 말아달래. 혹여 낫게되면 그때 돌아 오겠대, 아이한테도 비밀로 해 달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가출한 줄로만 알았어. 이게 말이 되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면 아내가 병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나는 몰랐을거야. 이게 말이 되니? 왜 자기 생각만 할까? 가족으로서도 할 일이 있는 법인데, 아내가 왜 그러는 걸까? 너는 알겠니? " (p253)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이 소설들에는 있다.
'신발', '맨발'의 의미를 소설 속에서 찾아 나가는 것이다.
<세상끝에서의 신발>, <어두워진 후에>, <모르는 여인들>에서의 신발, 맨발은 삶의 가장 내밀하면서도 누추하고 자신의 무게를 짊어진 부분들을 통해서 관계맺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더 미스테리가 들어간 < 화분이 있는 마당>도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작품인 것이다.
또한, 나는 오래전 작가의 작품 중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주려고 봄나물을 맛깔스럽게 무쳐 놓는데, 결국에는 오지 않아서 나물의 색이 추하게 변한 모습을 묘사한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어떤 작품이었는지, 어떤 이야기였는지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그 장면만이 기억되는 것이다.
이처럼 신경숙의 소설 속에서는 음식을 참 맛깔스럽게 만들어 내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 책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어두워진 후에>에서
" 상 위의 밥그릇들 옆에는 파란 배추된장국이 한 그릇씩 놓여 있었다. 파를 종종 썰어넣어 무친 생굴에서 참기름 냄새가 맡아졌다. 큼직한 깍두기, 멸치볶음, 깻잎, 계란찜, 언제 만들었는지 숭늉이 담긴 큰 양푼이 밥상 아래 놓여 있다. (...) 소년이 생굴무침을 더운 밥 위에 얹은 뒤 싹싹 비비기에 남자도 그리했다. 소녀가 배춧국이 든 대접을 들고 국물을 후루룩 마시기에 남자도 그리했다. " (p147)
내가 신경숙 작가의 소설들을 좋아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일상 속의 묘사가 사실적이면서도 섬세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없는 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묘사하는 관찰력도 뛰어나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녀의 작품 속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같으면서도 또 다른 그렇지 않은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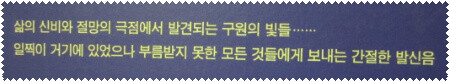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내 말만 들어주기를 기대하는지도 모르겠다. 상대방의 마음이나 아픔보다는 나의 마음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그때는 상대방과의 소통보다는 입을 닫아 버리고 체념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 책속의 주인공들도 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소통의 단절을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소통의 단절 속에서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가다가 어느날, 어느 사건을 계기로 그때에서야 상대방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7편의 단편소설을 읽으면서 가족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내가 아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음이 아프면 아프다고, 마음이 울적하면 울적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함께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