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
최인호 지음 / 여백(여백미디어) / 2011년 5월
평점 :

절판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의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책을 구입했다.
그리고 얼마 동안 그대로 책꽂이에 꽂아 두었다.
선뜻 읽기 보다는 읽던 책들을 끝내고 여유있는 마음으로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인호 작가의 에세이인 <인연>을 읽은 후에 투병 소식이 전해졌고, 그이후에 <산중일기>, <천국에서 온 편지>등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의 새로운 작품을 읽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써 오면 <샘터 > 연재를 중단하는 것으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을 것임을 알려 왔기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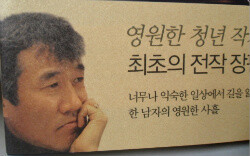

최인호 작가는 추억 속의 작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젊은 날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던 작가였다.
그가 발표하는 작품들은 언제나 인기리에 독자들의 손에 들어갔고, 그 중의 다수는 영화화되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별들의 고향"이었고, 그후에 작가는 시나리오까지 쓰면서 " 바보들의 행진","병태와 영자", " 깊고 푸른 밤", "고래사냥" 등의 영화를 만들게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작가는 '상업주의 작가', '퇴폐주의 작가'등으로 구설수에도 많이 올랐었던 것이다.
사실상 그의 작품들에는 유독 성적 표현들이 많이 나왔기에 읽기에 거북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다.
나는 작가의 작품을 모두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책들을 읽어 보았다.
그가 말하는 최인호 '제 1기의 문학' 인 현대소설, 소위 말하는 연애 소설류의 작품들도 많이 읽었고, '제2기의 문학'인 역사, 종교 소설도 읽어 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작품으로는 "잃어버린 왕국"과 "왕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그 작품들에는 작가의 열정이 많이 담긴 작품들이었고, 독자들에게 왜곡된 역사의식을 바로 잡아 주려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작가는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의 '작가의 말'을 통해서
"하느님깨서 남은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제3기의 문학'으로 이 작품을 시작으로 다시 출발하려한다.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의 십자가인 원고지 위에 못박고 스러지게 할 것임을 나는 굳게 믿는다. "
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외에 '작가의 말'을 읽는 것만으로도 숙연한 마음이 든다.
항상, 원고 청탁을 거절해 가면서 까칠하게 글을 쓰던 작가가 이번에는 자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글을 쓰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출해서 쓴 자발적인 최초의 전작 소설이기에 글을 쓰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 전해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 작가 혼자만의 독자를 위해서 썼다는 말까지 덧붙이는 것이다.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는 최인호 작가의 글임을 느끼면서도 작가의 글이라기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는 점들이 많다.
그동안 현대소설을 쓰지 않고, 역사소설을 써 왔기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이다.
이 작품에는 새로운 작가의 작품 세계가 또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작품이다.
내가 이 책을 구입하고도 읽지 못하고 책꽂이에 꽂아 두었듯이, 읽은 후에도 어떻게 이 작품을 읽은 느낌을 글로 써야 할 지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멍'하면서도 혼돈스럽고,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발문'에서 김연수 작가가 이야기했듯이 " 이 소설이 너무나 무겁게 읽히고 ,그럼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책을 읽는 속도는 너무도 빠를 정도로 거침없이 책장을 넘길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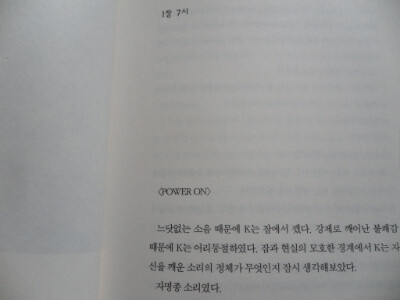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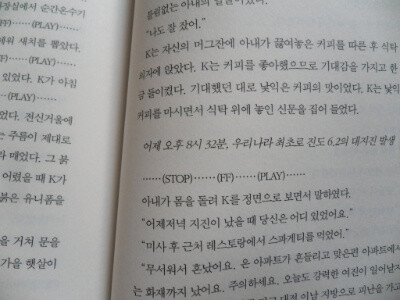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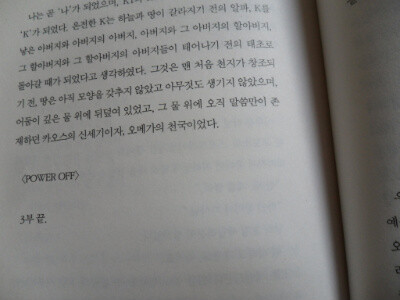
K 라는 주인공이 토요일 아침 7시에 익숙한 자명종 시계 소리에 일어나면서부터 자신이 평소에 생활하던 집임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야기가 월요일 8시 14분 지하철을 타기 직전의 지진이 일어나는 때까지의 3일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K는 자신의 생활에 충실한 평범한 직장인인데, 그에게 갑자기 다가온 세상은 현실 속의 실재의 공간인지 아니면 환상 속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지 모를 정도로 혼돈스럽게 돌아간다.
"자명종은 낯이 익지만 어제까지의 자명종이 아니다. 아내 역시 낯이 익지만 어제까지의 아내가 아니다.
딸아이도 낯이 익지만 어제까지의 딸아이가 아니다. 강아지도 낯이 익지만 어제까지의 강아지가 아니다. 스킨도, 휴대폰도 어디론가 발이 달린 것처럼 제 스스로 사라져 버렸다. 이 돌연변이의 기이한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된 것일까.
섀도박스
같은 종이를 여러 겹 오려 필요한 조각을 만든 후 실제 상황에 맞춰 입체감있게 재배치해서 만든 전위적 예술공간. 종이를 여러 겹 쌓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그림가 지고 그로 인해 입체감이 느껴지는 3차원의 공간. 그 상자 속에 K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닐까." (P54~55)
어느날 갑자기 낯익은 세상이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만나는 사람들도 낯익은 사람들인 것같으나, 낯선 사람들이고,
그들은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K가 움직이는 공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혼돈스러운 일들에 의심을 품고 그 원인을 추적하여 가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신의 행세를 하는 또다른 K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참'나인 K1은 지금의 나인 K2보다 감성이 풍부하고 다소 감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P299)
"도플갱어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분열된 또 다른 자기 자신의 생렬을 보는 심령 현상을 말한다. 타인은 볼 수 없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나' , 그렇다면 K2 는 지금 또 하나의 자기 자신과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영혼(靈魂)이 영(靈)과 혼(魂)으로 나누어져 있다면, 레이저의 분신 복제이자 영인 K2는 지금 자신의 정신을 지배하는 원형질의 혼인 레인저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잇는 것이다."
(P 327~328)
"나는 자네고, 자네는 곧 나니까 . 우리는 한 몸이고 또한 일심동체지 " (P331)
K는 자신에게 익숙했던 현실 세계에서 어딘가로 떠나가야만 한다.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었던 스킨의 냄새, 자명종 소리, 아내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모두 낯설게 느껴지는 그 어딘가로 떠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K가 살고 있던 현실세계는 없어지고 그는 또다른 어떤 세계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비 문신을 한 여인, 세일러문 복장의 여인들에게서 풍기던 그 낯선 냄새.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몸의 촉감.
그리고, 이 소설이 딱 3일간의 이야기라는 것.
월요일 지하철을 타려는 순간에 일어나는 지진.
그것들의 연관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현실이란 곧 일상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별하는가?
일상적인 것에서 멀어지면서.
(...) 이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연인의 손을 더 이상 잡지 못하는게 이별이다. 연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이별을 경험한다. 우리가 알던 현실이 붕괴될때다. 이 현실이 붕괴되면 우리는 비일상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이 공간은 신비의 공간이다. (P388. 김연수 작가의 발문 중에서)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 '작가의 말'을 꼼꼼하게 읽었고, 그리고 책을 다 읽은 후에 김연수 작가의 '발문'을 또 꼼꼼하게 읽어 보았다.
실체를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읽은 후에 자꾸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기때문이었다.
이 책을 읽은 후의 다른 독자들의 서평도 꼼꼼히 읽어 보았다. (사실 나는 다른 사람의 서평을 잘 읽지를 않는다)
머리를 떠나지 않는 '비일상의 공간', '신비의 공간' 을 찾기 위해서....
작가가 투병생활 중에 힘들었던 때마다 생각하곤 했던 그 무언가가 이렇게 현실세계에서 멀어지는 세계를 그리지는 않았을까.
항상 일상 속에 있어서 낯익은 공간들이지만, 그 끈이 풀어질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타인의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공간은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닐까.
1970~1980년대의 힘들었던 청춘들에게 시원한 바람처럼 생명력을 불어 넣어주셨던 최인호 작가님의 완쾌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읽은 후의 여운이 길게 남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