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섬에 내가 있었네 (양장) - 故 김영갑 선생 2주기 추모 특별 애장판
김영갑 지음 / 휴먼앤북스(Human&Books) / 2007년 5월
평점 :

절판

2005년에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사진작가 '김영갑'에게 '그 섬'은 제주도이다. 아니 제주의 초원, 오름, 바다였던 것이다.
작가는 항상 제주도의 풍경을 담는 사진을 찍었다. 1982년에 제주를 알게 된 gn에 '그 섬'에 정착하면서 제주의 풍광을 뷰파인더에 담는 작업을 했다.
사진의 주제는'외로움과 평화' - '김영갑'의 일생의 모습과 같은 주제이다.
작가는 '섬의 외로움과 평화'를 찍는 사진 작업을 수행이라 할 만큼 영혼과 열정을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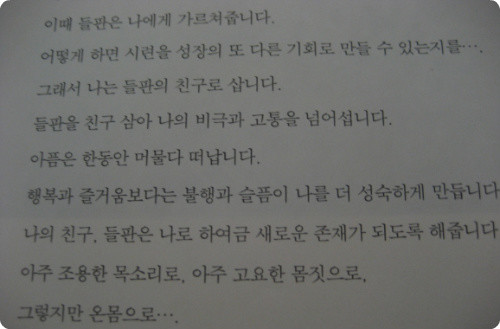

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진 작업을 할 필름과 인화지를 사는 것은 그에게는 '밥'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다.
그가 제주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내 사진에 표현하고 싶은 주제(마음)가 다르기 때문이다. 찍고 싶은 사진만 찍으며 살아가는 사진장이로 만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 할 정도로 인생 그자체가 사진 찍는 작업 뿐이었다.
낮에는 제주, 마라도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밤에는 현상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인화작업을 하는 것이다.
일출사진을 찍겠다고 서둘러 마라도에 나타났다가는 제대로 된 사진도 찍지 못하고 오전 배로 떠나는 사진 작가들의 행동에 사진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설명해 준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또다른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풍경만이 아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감동까지 담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풍경을 담기 위해서 그는 제주에 홀로 남아 사진 작업을 했던 것이다. 사진 작업은 끊임없는 기다림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기도 하기에....
20여년 넘게 섬의 모습을 찍는 작업을 하고 살던 그에게 그당시만 해도 듣도 보도 못한 희귀병인 '루게릭'병이 찾아오게 되고, 카메라를 잡은 손이 떨려서 사진을 찍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폐교된 초등학교를 개조하여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을 열게 된다. '두모악'은 한라산의 옛 이름이며, 갤러리에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은 국제적 수준의 아트 갤러리이며 그가 루게릭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직접 자신의 손으로 만든 갤러리인 것이다. 갤러리 마당은 제주의 상징인 '바람','돌','사람'을 주제로 한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어 있다.
'그 섬에 내가 있었네'는 2004년에 출간되었고, 작가 사망후인 2007년에 내용은 그대로인채로 다시 출간되었다.
이 책은 사진에 미쳐서 살아 온 김영갑의 삶과 작품 세계, 그리고 투병과정의 이야기가 구술형태로 씌어진 포토 에세이이다.
제1장의 주제가 '내마음의 풍경'으로 '제주의 자연속에서 풍요로운 영혼과 빛나는 영감을 얻었던' 삶과 사진 작업의 이야기라면
제2장은 '한라산, 내 영혼의 고향'으로 사진 작업에 몰두하는 과정에 루게릭병을 앓게 되는 투병의 기록인 것이다.
그리고, 책에는 작가가 어느날 섬에 홀려서 정착하게 되었던 '그 섬'의 사진들이 약 70여컷이 소개된다.
그런데, 사진만을 보면, 그곳이 제주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 그런 잔잔하면서도 느낌이 있는, 그의 평생의 사진 주제였던 '외로움과 평화'가 깃든 사진들이다.
제주가 관광지이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기에 그런 제주의 낯익은 모습을 기대한다면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관광객이 아닌 오로지 '섬'이 좋아서 그 곳에 머무르게 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 본 자연의 모습, 가식적이 아닌 자연 그래로의 본연의 모습이 그의 사진속에 담겨 있다.
그의 사진은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냥 외롭고 평화스러운 것이다.
또한, '초원'은 초원대로, '오름'은 오름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영원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작가의 모습처럼 드러내 놓고 보이지도 않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모습에서 외로운듯 평화가 깃든 모습이다.
'내가 사진에 붙잡아두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들판의 빛과 바람, 구름, 비, 안개이다. 최고로 황홀한 순간은 순간에 사라지고 만다. 삽시간의 황홀이다.'(p180)
작가는 항상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집념으로 카메라의 셔터를누렸다.
그런 작가에게 루게릭병으로 카메라를 들 수 조차 없었던 때의 생각이 드러난 대목을 소개해 보겠다.
'카메라를 잡을 수 없는 사진가의 삶은 날개 잃은 새의 운명처럼 시련의 연속이다. 폭풍치는 바다에서 날지 못하는 새는 내일을 기약하기 힘들다. 새는 더 이상 짙푸른 하늘을 꿈꾸지 않는다. 카메라 셔터를 누를 수 없는 사진가는 고민하지 않는다. 눈, 비, 바람, 구름, 안개에 마음이 달아 오르지 않는다. 편안하게 바라보며 잃어버린 것보다는 얻은 것을 생각하며 미소 지을 뿐이다. 이제 마음으로만 숱한 사진을 찍는다 절망하자면 한없이 절망스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한다.'(p234)
사진에 일생을 바친 작가가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제주도의 올레길을 걷다 보면 그의 갤러리를 발견할 수 있고, 갤러리를 둘러 보는 과정에서 김영갑의 담은 사진 풍경에서 '외로움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면 그의 사진 작업의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