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출판사도 유지하기 힘든 시기에 작가 정여울과 총 3명이 운영하는 작은 출판사 '천년의 상상'이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 당신의 잃어버린 감각과 감수성을 일깨우는 12개월
프로젝트"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들의 감각과 관련있는 의성어가 책제목을 가진 책이 출간됐다.
그동안 꾸준히 정여울의 책들에 관심이 있었는데, 작가의 책들을 검색하다가 알게 된 책들.
지금부터 한 권씩 읽어보기로 했다. 워낙 정여울은 여행도 좋아하고 책읽기도 좋아하고 글쓰기도 좋아하니 작가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작가의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된다.

사유하고 창조하는 글쓰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많다.
12권의 책들은 작가의 글과 함께 그달의 화가의 그림이 함께 한다.
" 자신의 상처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드러내며 독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가. 글쓰기,
듣기, 읽기, 말하기 네 가지는 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세상 속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글을, 한없이 넓고도 깊은 글을
쓰고자 한다. 일정한 틀에 매이기보다 스스로 주제가 되어 더욱 자유롭고 창조적인 글쓰기를 하고 싶은 목마름으로 '월간 정여울'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독자와 소란하지 않게, 좀 더 천천히, 아날로그적으로 소통하기를 바란다." (작가 소개글
중에서)

'월간 정여울' 3월호는 <까르륵까르륵>이다. 우린 언제 이처럼 까르륵까르륵 웃어 봤을까?
티없이 맑은 어린 아이의 웃음소리가 아닐까?
작가는 '까르륵까르륵'을 " 가장 순수한 것들의 찬란한 웃음소리'라고 정의한다.
나는 정여울'의 글들이 긍정적이고 소박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깊이가 있는 글이라서 좋아한다. 어린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면
추억에 잠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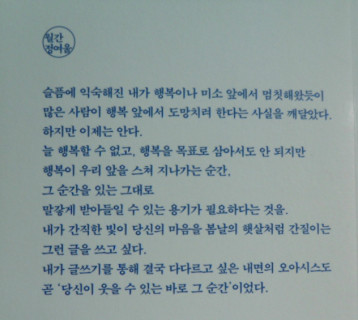
"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저 너머의 또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는 자유다.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삶에서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의 힘만으로 나를 지켜낼 용기를 기르는 일이다. 책을 읽는다는 것,
그것은 항상 매 순간 새롭게 태어날 부활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정신의 모험이다. (p. 61)
"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을 상징하는 단어 '휘게 Hygge' 또한 새로운 행복의 기준을
암시한다. 휘게는 사회가 요구하는 속도나 경쟁을 중시하는 삶이 아닌, 소박하고 느린 삶, 여백이 있는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휘게는 화려함이
아닌 단순함에서, 빠름이 아닌 느림에서, 사치스러움이 아닌 소박함에서 행복을 느끼는 마음이다. (p.
142)
" 행복의 기준점을 '먼 훗날 성공한 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꾸밈없는나'로
잡으면 된다. 행복의 가치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느리게, 더 소박하게, 더 느슨하게' 스스로를 이완시키는 것에서
찾으면 된다. 우리는 '머나먼 훗날' 행복해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성공했을 때 느끼는 잠깐의 짜릿함이
아니라, 365일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 느릿느릿한 삶의 여유, 그것이 내가 꿈꾸는 행복의 맨얼굴이다. " (p.p.
147~148)
" 사실 아이의 일거수 일투족을 '사랑의 이름으로' 분석하는 어른과 어떻게든 부모의
감시를 벗어나려는 아이의 용의주도한 두되게임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는 근원적인 갈들이 놓여 있다. 어른은 아이의 행동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내려 애쓰지만, 아이는 언제나 바로 그 '의미'자체에 저항하려 한다. " (p. 153)

느리게 그리고 소박하게, 천천히 살아갈 것을 권하는 작가의 글을 읽으면 마치 정여울이 인생의 선배처럼 느껴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공감을
하게 된다. 실은 내가 정여울 보다 훨씬 인생의 선배임에도.
3월의 화가인 최인선의 그림도 독특하다.

" 최인선 작가의 작품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이런 목소리가 들여오는 듯하다.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미를 지나치게 파고들려하지 마. 그냥 한번 흠뻑 빠져 들어 봐.
파란색이 얼마나 새파란지, 붉은색이 얼마나 선연하게 우리의 심장을 할퀴는지, 흔색이 이
모든 빛깔들을 얼마나 거대한 품으로 끌어안고 있는지. 나는 최인선 작가의 그림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었다. 같은 파란색이라도 어느 순간에는
얼음물처럼 차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에는 방금 끓인 녹차처럼 따스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그는 무슨 색을 써야 아름답게 보일까를 주도면밀하게 연구하는
과학자의 스타일이 아니라, 본능과 직관의 몰아침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고 거침없이 마치 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색채와 놀이를 벌인다. (p.
17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