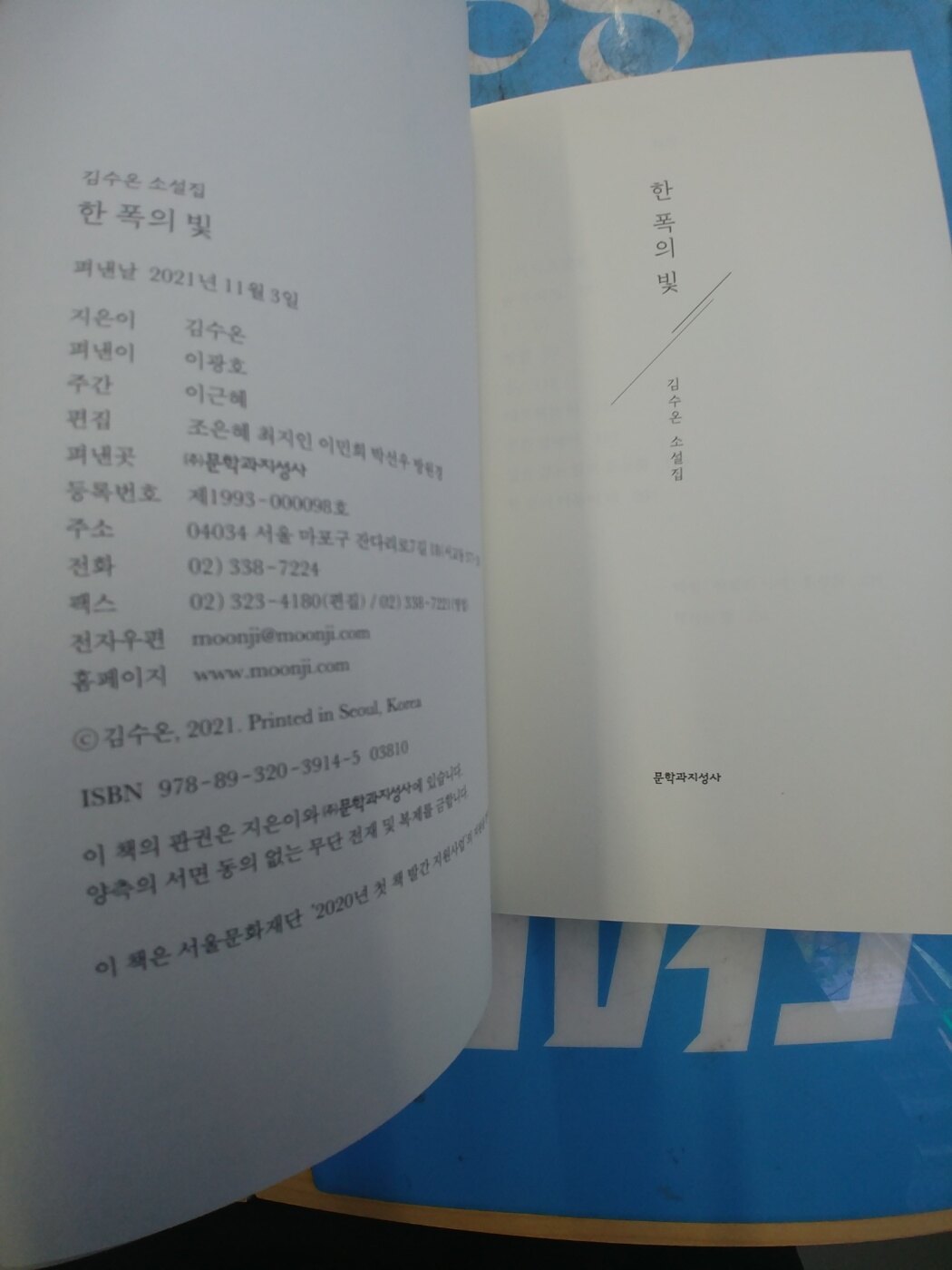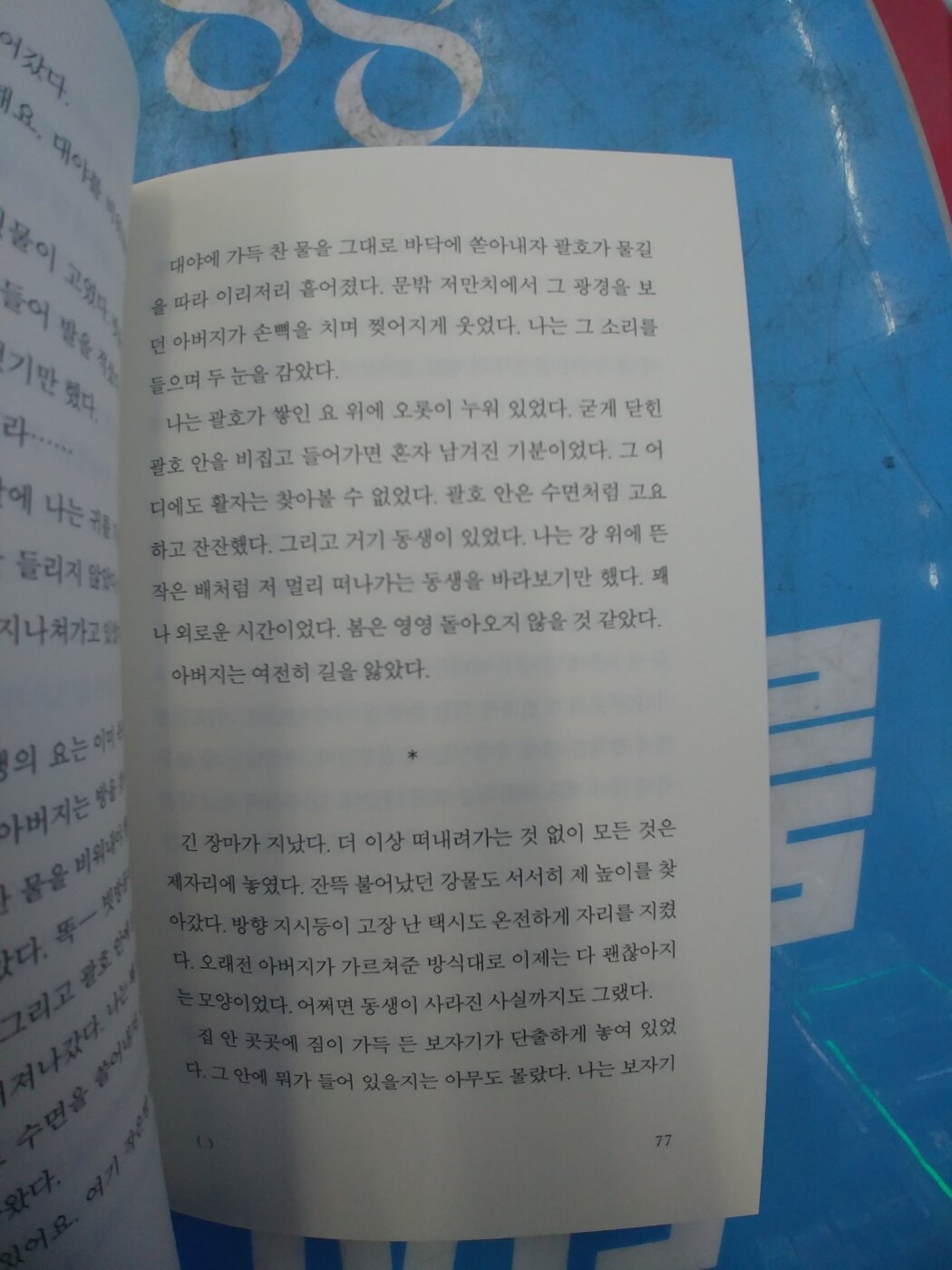-

-
한 폭의 빛 - 김수온 소설집
김수온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21년 11월
평점 :



세상에는 흡입력이 좋은 소설이 있고 잘 읽혀지지만 읽고 나서의 느낌을 표현하기가 힘든 소설이 있으며 잘 읽혀지지 않지만 많은 것을 알게 되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읽는 내내 뭐라 형용할 수 없었던 소설도 있는 데 바로 오늘 완독한 김수온작가님의 첫 소설집 「한 폭의 빛」이 그런 소설이었어요.
앞서 읽은 김태용작가님처럼 글이 음악처럼 쓰여졌거나 정영문작가님처럼 언어자체를 자유자재로 쓰시지도 않는 데 내용을 파악하기가 좀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설집이 별로라는 뜻은 아니라 단지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접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설집에 실린 작품들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기억을 잊고 과거를 지워버리며 어두컴컴한 밤이 지나면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 밝아오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데 과수원에 심어놓은 나무의 열매들이 썩어들어가 그 나무들을 불태워버리는 (나의 마르멜로), 동생이 사라진 이후로 괄호가 온 세상을 뒤덮어버린 등단작 ( ), 바닷속으로 온 몸이 잠겨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던 사람들의 (행렬), 군인의 발자국으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정원을 쳐다보는 (애프터눈 티), 화실에 불이 나 더 이상 미소를 짓지도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아이들이 그렸던 초상화 또한 남아있지도 않게 되어 영원히 볼 수 없는 (얼굴 없는 밤의 초상화), 마치 미로 속을 헤메는 것처럼 이불이 몸 전체를 가리면서 집 안 구석을 몇번이나 되짚어가는 (한 겹의 어둠이 더), 소설집을 통들어 가장 인상깊게 읽었으며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 사이에서 홀로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열대어 한 마리의 비늘이 수조 위로 떠오르는 (푸른 열대어)와 마지막으로 읽으면서도 짐작하기가 어려웠던 표제작 (한 폭의 빛)까지 9편의 이야기가 실린「한 폭의 빛」을 접하였기에 김수온작가님의 다음 작품들도 그저 묵묵히 읽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 ) 에서 자주 길을 잃어버리시는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인상깊었는 데 77쪽에 ‘여전히 아버지는 길을 앓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앞서 읽어본 걸 토대로 하자면 ‘길을 잃었다‘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수온작가님, 좋은 글을 읽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