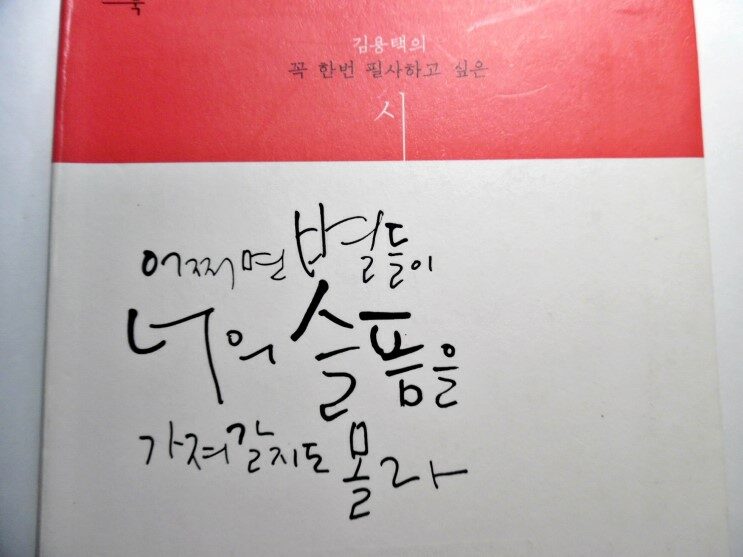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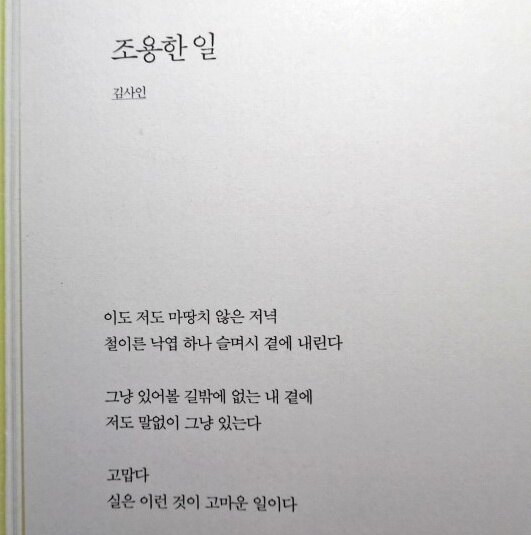
조용한 일 -김사인
이 도 저 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
가을이 아니어도, 밤의 어느 시간에든 잘 어울리며 위로가 되는 시.
가끔은 밤과 새벽 사이를 즐길 때가 있다.
그 순간의 고요하고도 차분함이 좋다.
그러나 가끔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술렁거리며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리고 저 시처럼,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다는 거다.
조용함을 함께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기대어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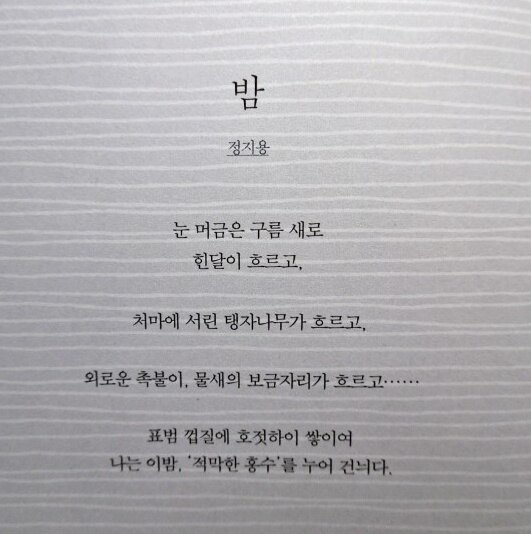
밤 - 정지용
눈 머금은 구름 새로
힌달이 흐르고,
처마에 서린 탱자나무가 흐르고,
외로운 촉불이, 물새의 보금자리가 흐르고......
표범 껍질에 호젓하이 쌓이여
나는 이밤, '적막한 홍수'를 누어 건늬다.
-----
마지막 문장,
밤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 더욱 빠져든다.
왠지 모르게 자꾸 읊조리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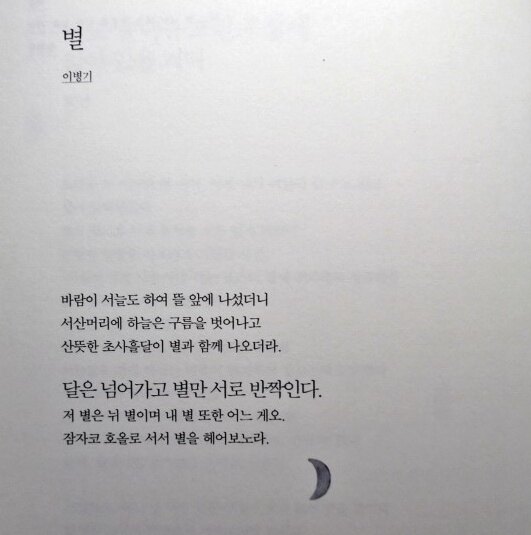
별 - 이병기
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 앞에 나섰더니
서산머리에 하늘은 구름을 벗어나고
산뜻한 초사흘달이 별과 함께 나오더라.
달은 넘어가고 별만 서로 반짝인다.
저 별은 뉘 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오.
잠자코 호올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
읽고 있으면 그냥 달도 보고 싶고 별도 보고 싶어지는 시.
밤하늘 별이 총총총... 그런 풍경을 상상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