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표지가 마치 시원한 크림 소다를 연상시킨다.
한반도 면적 35배나 된다는 호주.
글쓴이는 워킹홀리데이로 그곳을 다녀와 경험한 것들을 솔직하게 풀어놓는다.
낯선 곳은 짧은 거리라도 심리적으로 몇 배는 길고 멀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하물며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은 어떻겠는가.
그러나 글쓴이는 무대포 정신으로 호주를 향해 떠난다.
그 도전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바다.
길치에 영어는 갓난아기 수준. 그래서 고생도 많았지만, 그녀는 오기로 버텨낸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정 가득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진짜 호주를 경험하고 싶다며 시드니 대신 브리즈번을 선택한 것만 봐도 그렇다.
비록 계획이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호주라고 하면 깨끗한 자연이라든가 멋진 풍경, 캥거루나 코알라를 먼저 떠올렸지만,
이 책에서 가장 재밌게 읽은 것은 역시 사람 이야기이다.
사람 사는 곳이면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겠지만, 진짜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 중인 사람에겐 지낼 곳을 위해 ‘쉐어’를 잘 알아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임을 알게 되었다.
막연히 ‘그 나라 문화도 경험하고, 돈도 벌고 영어가 언젠가는 늘겠지.’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것이다.
물론 국적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그러나 그 중에도 공동생활에는 관심 없고 민폐만 주는 사람도 많고, 이상한 성격의 집주인도 있었다.
글쓴이가 만났던 한국인 사기꾼은 또 어떠한가.
그야말로 사람 조심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베드버그!!
침대에 있는 빈대라고 보면 된다.
문제는 방역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 아예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정도라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습성이 있다고 하니 지저분한 집, 지저분한 쉐어가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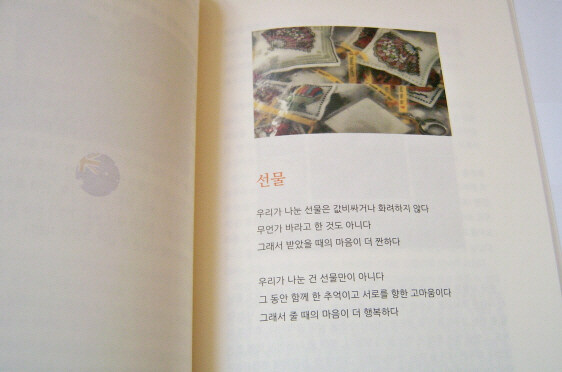
물론 좋은 추억을 남겨준 사람들도 많았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던 할머니라든가 일본에서 온 대학생 Yumi.
글쓴이는 Yumi에게 한국에서 직접 만든 십자수 열쇠고리를 선물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32세 콜롬비아 청년, 첫 알바를 하며 만난 호주직원 이야기도 기억에 남는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왠지 오래도록 마음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해 일명 아무나 붙잡고 말 걸어 보기를 시도한다.
처음 본 외국인과도 열심히 대화하는 모습에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고 느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좋은 에너지를 나누고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한 글쓴이.
그녀의 소망대로 그녀만의 당당함, 활기찬 에너지가 세상 곳곳에 닿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누가 성공했고 실패했는지 그 아무도 판단 내릴 수 없다. 사람은 저마다
지닌 그릇이 다르고, 보고 생각하는 기준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이 아닌 내게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었다면, 그게 뭐가 됐든 그걸로 된 거다.
(p.147, 에필로그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