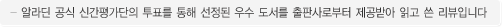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정호승.안도현.장석남.하응백 지음 / 공감의기쁨 / 2012년 8월
평점 :

품절

가을입니다!
나는 골목 어귀의 작은 문방구에서 100원에 몇 장쯤 주던 정갈한 편지지와 편지 봉투를 사겠습니다. 그 편지지의 긴 여백에 그리운 마음을 이만큼 풀어내면 가을 하늘이 한뼘쯤 높아질 듯합니다. '툭'하고 떨어지는 알밤 소리에도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고요 속에서 속절없이 까르르 웃던 유년 시절의 한바탕 웃음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낙엽 타는 내음이 온 몸 구석구석 배일 듯합니다. 서늘한 밤이 오면 싱거운 사랑 얘기에도 찝찌름한 눈물을 한 종지쯤 흘릴 듯하고, 연애편지 한켠에 즐겨 쓰던 사랑시 한 소절을 나즉나즉 읊어봅니다.
매년 가을이면 꼭 그래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곤 한다. 그리운 사람에게 꼭꼭 눌러 쓴 손편지를 서너 통쯤 부쳐야 할 것같고, 갈대밭에 누워 살가운 바람결을 한나절쯤 느껴야 할 것같고, 재래식 화장실의 칸막이벽에 누구와 누가 사귄다더라 하는 유치한 낙서를 한 줄쯤 남겨야 할 것 같고, 계집애들 떼를 지어 다니는 어느 길목의 벤치에 앉아 자못 심각한 표정으로 알 수 없는 시집을 펼쳐 읽어야 할 것같고...
그런 날이면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다.
이제 세월의 무게를 어깨에서 반쯤 덜어낸 나는 여전히 어린애같은 감상과 아날로그식 DNA를 품고 산다. 철부지 어린애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어쩌랴. 천성이 그런 걸. 언제였는지 기억도 없지만 아마 신혼초였지 싶다. 한번은 아내가 창고에 꽁꽁 숨겨두었던 내 노트 상자를 들고 나타나서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필요없는 거라면 버리자는 제안에 나는 펄쩍 뛰었다. 쓸모를 따져 가치를 매기는 요즘에 곰팡내 풀풀 나는 그 상자는 아내의 눈에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아닐 수 없었으리라. 그러나 내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의 상자였으니 그걸 버리라며 선뜻 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시를 좋아한다. 그런 까닭에 누렇게 바랜 시집들도 버려지지 아니한 채 책꽂이 한 칸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다. 시를 읽고 있으면 여백을 스쳐가는 아스라한 세월이 있고, 수런거리는 목소리가 있다. 요즘 시인들은 더이상 시집을 내지 않는다. 써도 읽히지 않기 때문이리라. 누군가에게 읽히지 않는 시는 그대로 박제된 채 세월만 지키게 된다. 그런 모습이 가끔은 서럽다.
정호승, 안도현, 장석남, 하응백 시인의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시집은 아니다. 젊은 시절 시를 사랑하여 결국 시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추억과 그들 자신이 좋아하고 흠모했던 시인과 아끼는 시에 얽힌 이야기들을 실타래처럼 풀어가고 있다. 시인의 마음에 별처럼 박혔던 시의 제목을 좇아 그 시를 읽는 재미도 쏠쏠하다. 어떨 때는 이 책보다 그들이 인용한 시에 더 마음을 뺏기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좋았는지도 모른다.
나의 낙서는 요즘 노트에서 블로그로 그 장소를 옮겼다. 나의 낙서본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언젠가 내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다시 옮긴다.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그런 책이다. 지난 흔적을 되새기게 하는. 이 가을에.
블 로 그
나는 너를 모른다
너도 나를 모른다
모르는 나와
모르는 너는
백지처럼 하얀 인연에
그렇게 편지를 쓴다.
네가 있는 자리에
또는 내가 있는 자리에
낯선 언어가 배달되던 날
평면의 일상에
숨죽인 메아리로 살아있느냐
오늘이 그리운 이에게
어제의 흔적은
습관처럼 메마른 자판을 스치운다.
모르던 사람들은
모르는 우리들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