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세이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에세이 주목 신간 작성 후 본 글에 먼댓글 남겨 주세요.
아침 기온이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9월에 출간된 에세이에는 제목만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뜻한 느낌에는 사랑, 가족, 어머니 등등이 있지만 '슬픔'은 따뜻한가 하고 한참 고민한다. '아무려면 어때.' 나는 너무도 쉽게 고민 같지 않은 고민을 놓아버린다. 가을 하늘이 너무 슬퍼서. 조락의 계절 가을이 가면 곧 겨울이 다가올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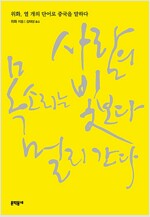
<허삼관 매혈기>,<인생>, <형제> 등으로 유명한 작가 위화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지 싶다. 위화의 작품을 읽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은 그의 글이 참 담백하다는 것과 슬픔을 저 깊은 심연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것은 작가가 나와 같은 범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니었을까? 위화의 새책이 기다려지는 이유이다.

에세이를 읽는 재미는 작가에 따라 크게 변한다. 이런 까닭에 인기 소설가의 산문집을 읽고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시인이 쓴 에세이에 실망한 기억은 떠오르지 않는다. 시인의 산문집에는 낱글자들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고, 때로는 균형을 잃고 위태위태 쓰러지지만 살아서 통통 튀는 낱글자의 몸짓에 그깟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 시인의 산문집은 너무도 쉽게 읽힌다. 아쉬울 정도로.

판화가 이철수의 글을 읽노라면 그가 판화가인지, 작가인지, 아니면 구도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일 수도 있겠지만 판화에 새겨 넣은 짧은 글들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을 더하여 그 끝에 닿을 수 없는 아득함이 느껴지곤 한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완서 작가의 책은 모두 읽었다. 내 독서 취향에 맞았기 때문이겠으나 슬픔의 밑바닥까지 가 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후의 담담함', 나는 작가의 글에서 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것은 일종의 오르가즘과 같았다. 기쁨의 극한을 성적 오르가즘에서 찾는다면 슬픔의 극한은 뭐라 말해야 할까? 방향은 서로 달라도 그 끝은 서로 통하는 것이겠지. 세상의 모든 끝에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