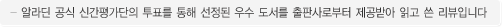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 - 두번째 무라카미 라디오 ㅣ 무라카미 라디오 2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권남희 옮김, 오하시 아유미 그림 / 비채 / 2012년 6월
평점 :



고히야마 하쿠의 수필집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이 있다. 특별히 잘난 체를 하려고 들먹이는 것은 아니고 이 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 <채소의 기분, 바다표범의 키스>를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 책이 떠올랐을 뿐이다. 책의 내용은 서로 다르다. 달라도 아주 많이. 그러나 두 작가가 모두 소설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과 고히야마 하쿠가 <인생이라는 이름의 여행>을 썼을 때의 나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현재 나이와 비슷했다(무라카미 하루키의 현재 나이는 63세이다.)는 점은 두 권의 책을 하나의 오브제로 착각하게 한다. 그래서인지 두 작가의 생각이나 문체, 글을 다루는 솜씨가 마치 한 작가가 두 권의 책을 쓴 것처럼 서로 닮아 있다. 나도 모르게 고히야마 하쿠를 떠올렸던 것은 그런 연유가 아닐까 싶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본작가들이 수필을 대하는 태도는 독특하다. 그것을 연륜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국민성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한 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건조하다. 마치 어릴 적 비 온 날 산에 올라 불쏘시개를 구하기 위해 젖은 낙엽을 들추고 그 밑에 감추어진 마른 낙엽을 긁어 모을 때 맡았던 달콤한 숲의 향기와도 비슷하다. 가령 이런 식이다. "묽은 커피를 마시며 누군가가 내게 무슨 얘긴가 하러 오기를 기다린다. 가끔은 이런 일도 괜찮다."에서처럼 그저 툭 던지고 잡다하게 설명하거나 어때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다. 작가는 그저 글을 쓸 뿐, 판단이나 상황은 오직 독자의 사색과 상상에 맡긴다는 투다. 독자는 침묵과 같은 여백에 일순 당황한다. 그러나 짧은 침묵 이후에 찾아오는 나른한 자유의 품은 얼마나 달콤한가.
우리나라 작가의 글은 사뭇 다르다. 젊은 작가는 대체로 현란한 수사로 정확한 의미를 가리기 일쑤이고 웬만큼 나이가 든 작가는 깊은 사색의 결과물을 표현할 때 그 날카로움이 독자의 눈을 찌른다. 그것을 열정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작가는 한 순간도 독자와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러므로 작가는 벼랑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죽을 힘을 다해 설명하거나 설득하려 한다. 그만큼 치열하다. 때로는 끈적끈적한 감정의 스프가 책을 읽는 나의 손바닥에 묻어날 것만 같다. 여유란 없다. 최소한 내가 책을 손에서 내려 놓기 전까지는. 일상의 가벼운 이야기도 숨가쁘게 읽는다.
이런 비교는 나의 독서량이 많지 않으니 단순히 주관적이고 편협된 것이지만 일본작가의 소설과는 달리 수필에서는 대체로 그런 느낌을 받곤 한다. 결국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두 나라 작가의 글쓰는 태도나 성향에 관한 것이지 작가의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잡문집>을 조금 실망스럽게 읽었던 나는 이 책도 그러면 어쩌나?하고 걱정했었다. 그러나 이 책은 다행히도 위에서 밝힌 일본 수필의 느낌을 고스란히 전달받았다.
"나의 본업은 소설가요, 내가 쓰는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맥주 회사가 만드는 우롱차'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세상에는 "나는 맥주를 못 마셔서 우롱차밖에 안 마셔"하는 사람도 많으니 물론 적당히 쓸 수는 없죠. 일단 우롱차를 만들려면 일본에서 제일 맛있는 우롱차를 목표로 만들겠다는 것은 글쓰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뭐,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어깨 힘 빼고 비교적 편안하게 이 일련의 글을 썼습니다. 어깨 힘 빼고 편안하게 읽어주신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첫머리에>
나는 전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니고, 경망스럽고 변덕스러운 독자 중의 한 명일 뿐이니 언제 아런 생각이 바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 볼 만한 책이다. 작가가 서문에서 밝혔듯 어깨에 힘 빼고 편안하게. 어쩌면 작가의 이러한 태도 - 욕심을 버리고 진솔하게 쓰려는 자세 - 가 수필을 읽는 독자의 마음을 흔드는지도 모른다. 작가에게 주눅들지 않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가뜩이나 쫄 일 많은데.
"그래서 귀찮은 것은 차치하고 어쨌든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고 싶은 대로 쓰기, 그것만 명심하고 있다. 너무 제멋대로인 것 같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입장에서 보면 독자를 설정하는 것을 처음부터 포기한 만큼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글을 쓸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써야 해'하는 테두리가 없으니, 자유롭게 손발을 뻗을 수 있다." (P.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