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 매일 쓰는 사람 정지우의 쓰는 법, 쓰는 생활
정지우 지음 / 문예출판사 / 2021년 12월
평점 :



지금도 그렇지만...
책을 읽는 것은 좋아하지만 막상 책을 읽고 난 뒤의 감상문(?)을 남겨보고자 키보드 앞에 앉아있으면...
비어있는 페이지
커서의 깜빡임
그리고 정적...
한동안 그저 키보드에 손을 올려놓은 채 멍하니 바라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을 존경합니다.
아니, 글을 쓰는 모든 이들을 존경합니다.
어쩜 글을 그리도 술술 쓰시는지 그 비결이 궁금하였습니다.
여기 이번에 읽게 된 이 책의 '정지우' 작가님.
20여 년 동안 작가로 활동하며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오롯이 담아낸 '글쓰기에 관한 증언'들이라고 하니 솔깃하였습니다.
숨 쉬듯 글을 쓰고, 글쓰기가 곧 삶이 된 작가 '정지우'.
그가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글쓰기'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야기
삶은 어떻게 글이 되는가
쓰는 법, 쓰는 이유, 쓰는 생활, 쓰는 고통에 관하여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그는 글쓰기를 '바다를 헤엄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딱! 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백지라는 바다를 헤엄치는 해녀들과 같다. 해녀들도 때로는 저 요동치는 바다가 두렵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해저에 들어가기가 망설여질 것이다. 몸이 바닷물에 닿는 순간부터 짙어지는 차가움, 빛이 옅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바닷속, 언제든 몸에 생채기를 내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지 모르는 바위와 언제 자신을 휩쓸어가버릴지 모를 파도에 막막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닷속으로 뛰어들고, 평생 해온 일을 오늘도 해낸다. 글 쓰는 사람도 때로는 백지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막막함에 몸부림치다가도, 손을 키보드에 올려놓고, 첫 문장을 적어내고 또 다음 문장을 적어내다보면, 어느덧 자신이 그 익숙한 바닷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 page 8 ~ 9
바다에 들어가는 일.
그렇게 바다를 헤엄치는 일.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건져내어 바다 밖으로 나오는 일.
이 일들에 대해 다정스럽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막막함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도 글쓰기란 참 매력적인 일이라는 것을, 어느 순간 나도 한 번 글을 써볼까란 용기도 얻곤 하였습니다.
글쓰기란 무엇일까...?
결국 글쓰기는 우리의 고유한 시선을 찾아나가며, 그 시선 안에 머무르는 일이다. 우리는 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글을 쓴다. 나만의 시선으로 세상 모든 것을 응시하고, 그 응시의 기록을 남기고자 글을 쓴다. 관념으로 도피하지 않기 위해여, 끊임없이 대상 곁에 살아 있기 위하여 글을 쓴다. 글쓰기는 관념의 유희, 당위의 강요, 기준의 폭력을 재생산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기 위해 하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 살아 있다는 것은 나의 시선이 나만의 것으로 생생하게 유지된다는 것으로 증명된다. 그래서 글 쓰는 일은 곧 가장 생생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 page 27
어쩌면 '나'를 표현하는 가장 진실한 방식이기에 우리 모두에게서 '글쓰기'란 작업은 필요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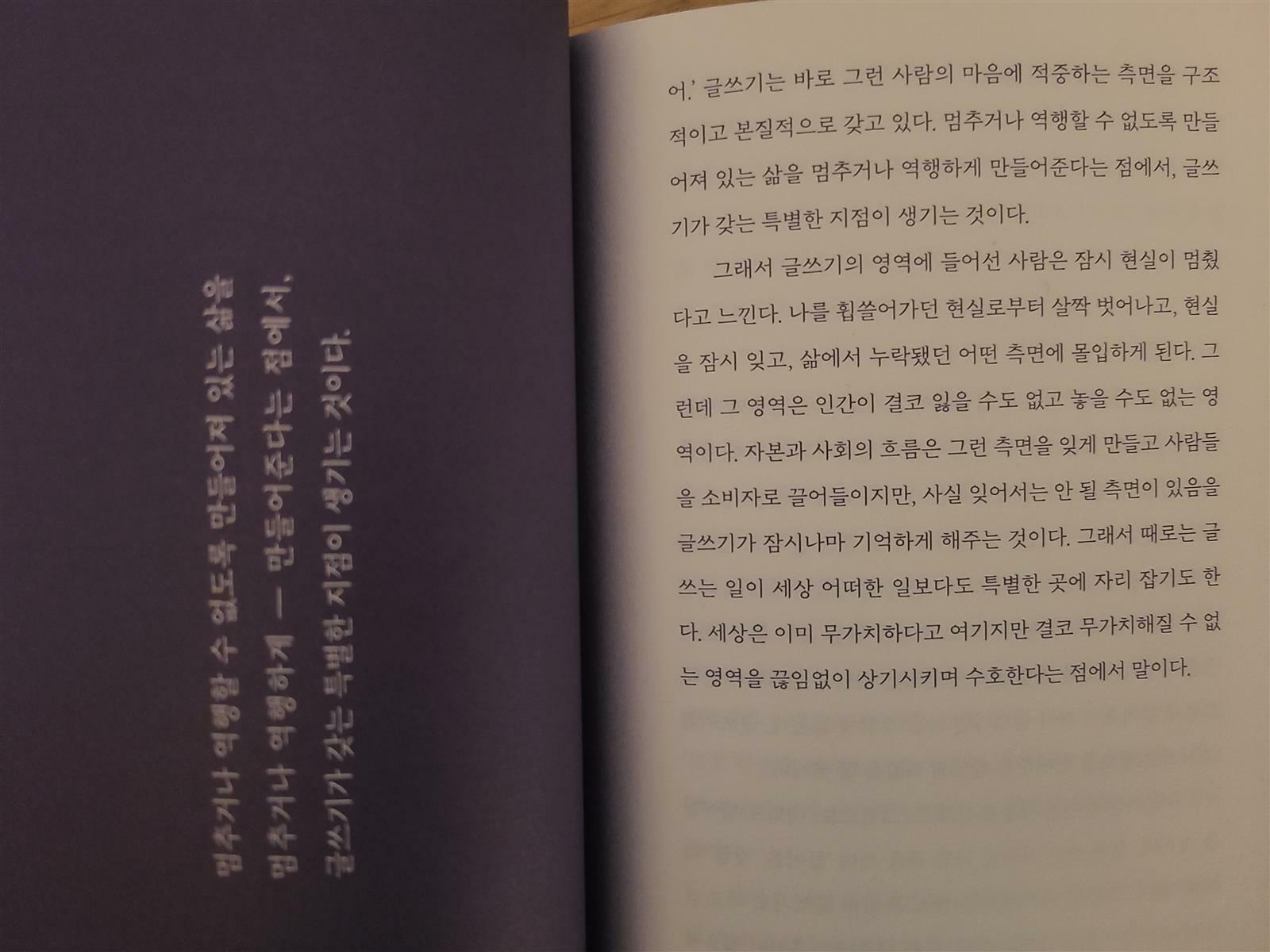
'글'의 매력이 아마 이것은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닿는다. 내가 가장 밀도 있는 순간들로 써 내려간, 나의 모든 것을 담았다고 믿었던 그 시간을, 그와 같은 밀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고요한 밤에 읽어내려가고 있는, 내가 있던 그 쓰기의 시공간에 함께 속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다. - page 153
반드시 누군가에겐 닿는다는 그 믿음.
그래서 '연결되었다'라는 그 느낌에서 오는 안도감.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글 쓰는 삶'에는 '내가 글을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삶이 글을 쓴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나는 삶이라는 거대한 무엇이 써나가는, 그리하여 그것을 그저 받아적은 뿐인 존재일지도 모른다. 존재이지만 존재가 아니기도 한, 삶이 옮겨지는 유령 같은 백지가 '나'라는 사람일는지도 모른다. 어째서인지 이런 생각은 아주 깊고 고요한 위안을 준다. 내가 돌아갈 곳이란 이 새벽과 다르지 않고, 결국 어떤 시간이 흐르든 또 이곳으로 돌아오겠구나. 이곳이 삶이 글을 쓰는 자리구나. 그렇게 언젠가는 내 삶과 함께 이 글쓰기도 끝날 날이 올 텐데, 그날 역시 이곳에 있겠구나, 하는 묘한 생각이 든다. - page 221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이 이야기.
그가 '글쟁이(?)'일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백지를 보면 막막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글쓰기가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의 한 부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토록 쓰기 싫었던 '일기'.
그래서 숙제가 아니게 되었을 때부터 쓰지 않았었는데 이제 와 돌이켜보니 내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느낌이랄까...
거창한 글 대신 나만의 소소한 글을 꾸준히 써보는 것.
이 책을 읽고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