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죄와 벌 ㅣ 가볍게 읽는 도스토옙스키의 5대 걸작선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 지음, 김종민 옮김 / 뿌쉬낀하우스 / 2020년 9월
평점 :



'고전'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작가의 책에도 눈길이 간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하... 지... 만....
그는 명성에 걸맞게도 장편소설들이었고 러시아 사람들의 이름은 왜 이리도 긴지 초반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외우다가 포기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꼭 읽으리란 다짐과 함께 위시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런 저도 이젠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작을 읽게 된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권으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었지만 결코 내용은 묵직하였던 이 책.
19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첫 장편소설.
『죄와 벌』

너무나도 설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그의 명성을 몸소 느낄 수 있기에...
작가 스스로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보고서'라고 칭할 정도인 이 소설의 매력에 살며시 발을 담궈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7월 초 어느 날 오후에 S골목 하숙집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자신의 방에서 나와 K다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 page 9
주인공 로스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는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그래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까지 그리 먼 거리도 아닌데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긴장감 속에 커다란 건물로 다가갑니다.
4층에 도달한 뒤 아파트 문 앞에 매달린 줄을 당깁니다.
초인종 소리는 작게 울렸고 뒤이어 예순 살 정도 된 작고 야윈 노파가 청년을 경계하는 기색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일로 온 거요?" 노파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었다.
"여기 전당품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은시계를 꺼냈다. 쇠줄이 달린 시계 뒷면에는 지구의가 새겨져 있었다.
"지난번 저당 잡힌 물건도 기한이 다 되어 가는데, 벌써 한 달하고 사흘이 더 지난 것은 어떻게 할 텐가?"
"한 달치 이자를 드릴 테니 조금만 연기해주세요."
"기한이 지나면 물건을 팔아버리든 다시 연기를 하든 그건 내 마음이지." - page 13 ~ 14
돈이 없어서 대학도 휴학하고 일자리마저 짤려 하루를 버티는 것마저도 힘든 그는 자신이 가진 물품들을 저당 잡으며 간간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
자신이 사랑하는 동생 두냐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결국 사랑하지도 않는 루쥔이란 작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비난하며 그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뇌리를 스치게 됩니다.
술집에서 만났었던 마르델라도프가 했던 말이...

'선생,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든 갈 곳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그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무서운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이 생각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저 허황된 망상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망상이 아니라 전혀 새롭고 무섭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정신이 멍해졌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던 거지? 편지를 읽고 나서 바로 밖으로 나왔었는데... 아, 그래 바실리옙스키 섬에 있는 라주미힌의 집으로 가려고 했었지...' - page 31
그는 또다시 노파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엔 그의 품에 도끼를 품은 채...
그리고는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그녀의 이복 여동생 리자베타에게 머리에 흉기를 휘두르게 되고 살인을 저지른 그는 그만 정신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죄를 저지르게 된 이유를, 자신의 죄의 정당성을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자꾸만 되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벌레 같은 한 마리의 이를 죽인 거야. 쓸모없고 추하고 해롭기만 한 이말이야."
"하지만 사람은 이가 아니잖아요!"
"그건 나도 알아. 나폴레옹이라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난 나폴레옹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지. 난 내가 한 마리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벌벌 떨고 있는 피조물에 불과한지, 아니면 선을 넘을 수 있는 권리를 지녔는지를 말이야..."
"권리요? 죽이는 권리 말씀이에요?" 소냐는 다급히 물었다.
"아아, 내가 과연 노파를 죽였을까? 난 노파가 아니라 나 자신을 죽였어! 그 노파를 죽인 것은 악마야. 내가 아니라고! 아아! 이제 그만 나를 내버려둬, 소냐!" - page 242 ~ 243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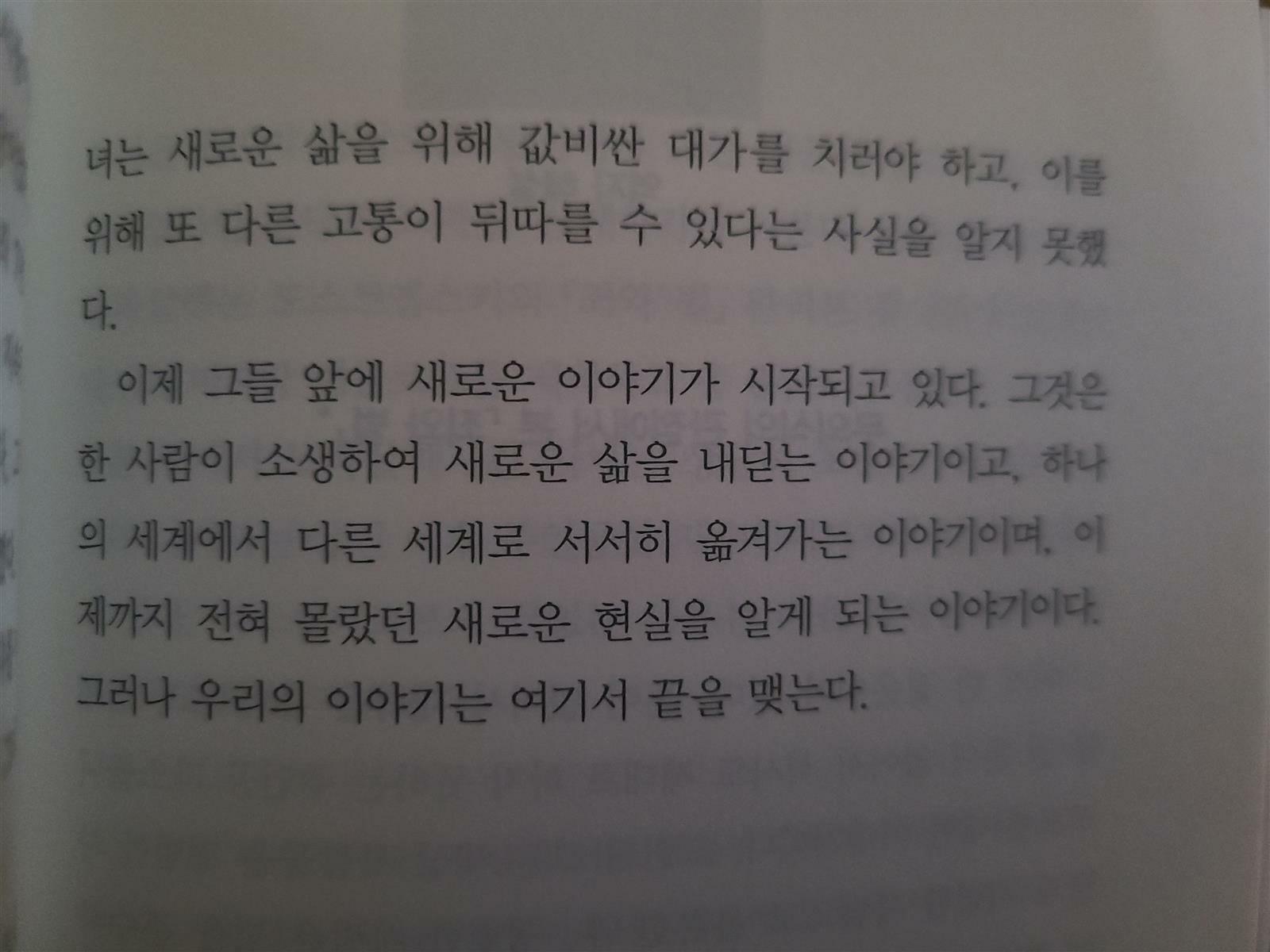
한 사람의 '죄'에 대한 '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자만, 광기, 회개까지...
하지만 이런 의문도 남곤 하였습니다.
회개가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일지...
읽고 나서 좀처럼 묵직한 느낌으로 인해 답답함마저 느낀 게 사실이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의 새로운 시작이란 마지막 말이...
누군가와 겹쳐지기 때문이었을까...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