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묵 박물관
오가와 요코 지음, 이윤정 옮김 / 작가정신 / 2020년 9월
평점 :

절판

색다른 박물관이었습니다.
잊힌 세계의 끝,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릴 생의 보관소
이곳엔 어떤 전시가 우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였습니다.
"사라진 영혼들의 유일한 안식처,
침묵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침묵 박물관』

내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였다. 내용물은 옷 몇 벌, 손에 익은 필기도구, 면도기 세트, 현미경 그리고 『안네의 일기』와 『박물관학』이라는 책 두 권이 전부였다. - page 5
박물관 기사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온 '나'.
의뢰인은 아무리 보아도 백 살에 가까운 노파였고 한동안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시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침묵 속에서 사람됨을 평가하는 그런 종류의 면접 말이다. 아니면 노파의 기분을 거스르는 행동이라도 한 것일까? 가령 빈손으로 와서 불쾌하다거나 넥타이 취향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 page 10
오만가지 생각에 사로잡히다 결국 내가 먼저 입을 열게 됩니다.
"훌륭한 박물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page 11
나는 대충 주변을 둘러보고 수장품들에 대해 잘만 전시하면 괜찮은 박물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한 것뿐인데 노파는 대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려는 건 자네 같은 애송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장대하고,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박물관이야. 한번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둘 수 없어. 박물관은 계속 증식하지. 확대되기만 할 뿐 축소되진 않아. 요컨대 영원이라는 운명을 짊어진 가련한 존재인 셈이지. 한없이 늘어나는 수장품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면 불쌍한 수장품은 두 번 죽게 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남몰래 삭아 없어졌을 텐데, 강제로 사람들 앞에 끌려나와 구경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자포자기했을 때쯤 또다시 버려지는 거지. 참혹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아? 절대로 도중에 그만두면 안 돼. 이것이 세 번째 진리야." - page 13 ~ 14
노파가 세우고자 했던 박물관은 바로 마을에서 사망한 이들과 관련된 물건, 즉 유품들을 전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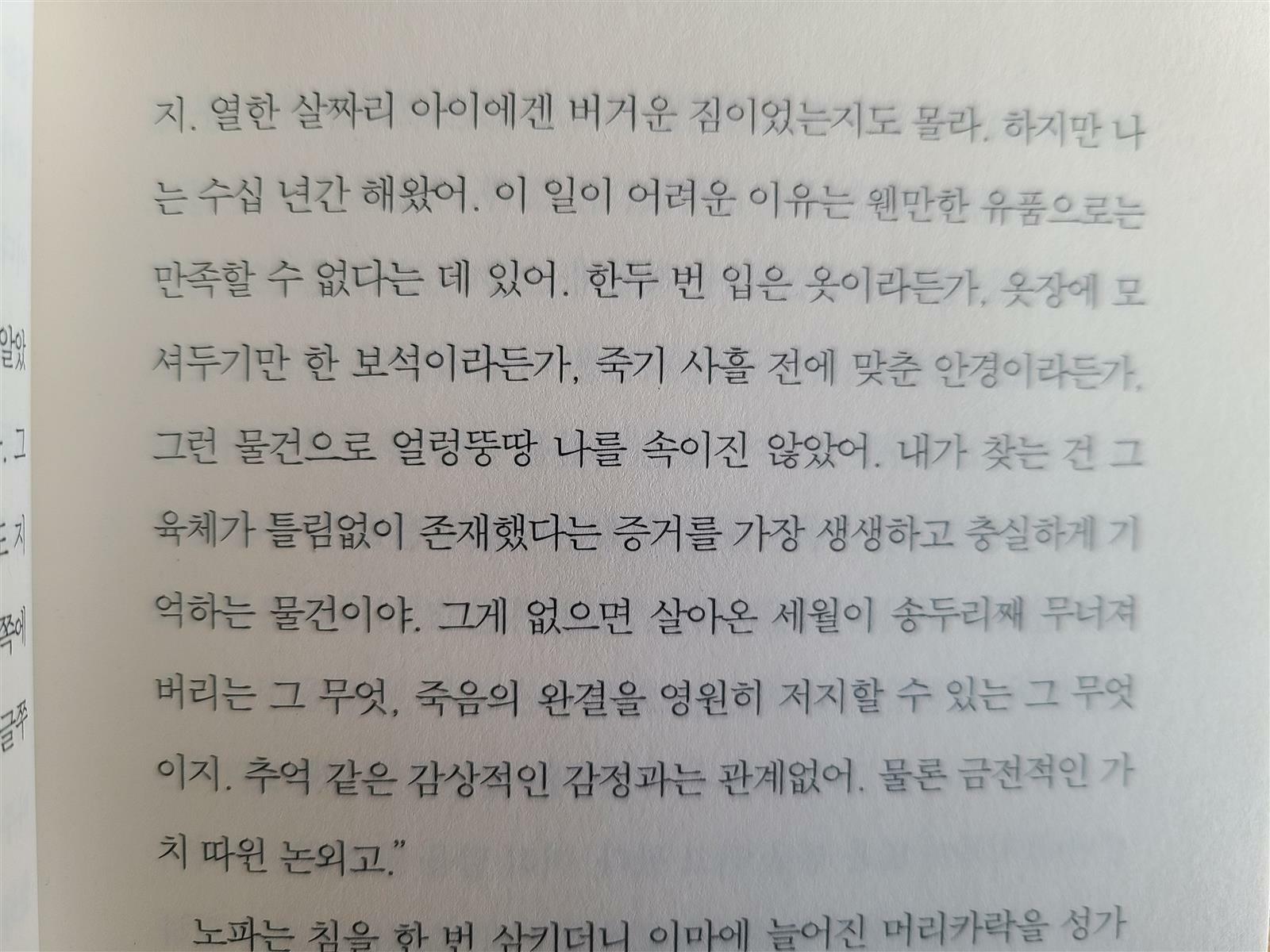
유품들이 전하는 '침묵'.
그래서 이 박물관이 '침묵 박물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나'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전시를 해 보았지만 유품들을 전시하다니...
어쩌다 노파는 이 유품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녀가 열한 살 되던 해 가을.
유능한 베테랑 정원사 -지금 정원사의 증조부-의 갑작스런 죽음을 바로 눈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 죽음을 바라보게 된 그녀.
놀랄 만도 한데 그녀는 정원사의 손에 쥐어진 전지가위에 눈이 가고 순간 그 가위를 자신의 치마 주머니에 넣게 됩니다.
이유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려워. 전지가위를 갖고 싶어서 환장했던 것도 아닌데 말이지. 땅의 정령이 꼬드긴 건지, 내면의 목소리가 시킨 건지...... 아무튼 그때 나는 내가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을 정확하게 해냈어. 그것만은 분명해. - page 51
그렇게 유품을 수집하게 되고 늙은 세상의 안식처가 될 박물관을 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은 점점 자리를 잡아감과 동시에 마을에선 의문의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반전이 등장하게 되는데...
소설 속 유품들이 전하는 '침묵'과 전도사의 '침묵 수행'은 소녀와 '나'는 다르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닮아 있었습니다.
"침묵 수행에 들어가면 편지와 일기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읽는 건 자유예요. 자기 안의 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 없을 뿐이지 밖에서 들어오는 건 거부하지 않아요. 육체를 버리고 마음속으로 망명한다고 보면 돼요." - page 185
결국 물건은 자신의 것을 표현하기보단 그 주인의 삶을 고스란히 표현하기에 응축된 침묵의 표현이 닮은 것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죽음 뒤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유품은 천국에 가지 않아요. 그 반대죠. 이 세계에 영구히 남기 위해 박물관에 보존되는 거죠. - page 150
그렇다면 유품은 죽음과 그 너머의 세상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인 것일까...
어둠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불안에 떨지 않았다. 우리는 유품에 대한 똑같은 정열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흔들림 없이 굳게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품을 수집하고 소중하게 보존하는 한, 혼자 하늘 끝에서 굴러떨어져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칠 일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page 142
이 소설을 읽고 '죽음'이 한 인간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남겨진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그래서 잊힌 세계의 한켠에서 당신에게 침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켠이 묵직하였습니다.
'침묵 박물관'은 결국 지금의 내가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나의 손 때가 묻은 물건들.
내가 살아 숨 쉬며 생활하는 공간들.
그리고 '나'라는 존재...
나는 어떤 물건이 남겨질지 가만히 들여다봅니다.